목차
1. 서 론--------------------------------------------- p.1
2. 본 론
1)들어가는 말--------------------------------------- p.1
2)여자에 관련된 속담------------------------------ p.1~3
3)요약---------------------------------------------- p.3
4)음식에 관한 속담-------------------------------- p.3~6
3. 결 론---------------------------------------------p.6
2. 본 론
1)들어가는 말--------------------------------------- p.1
2)여자에 관련된 속담------------------------------ p.1~3
3)요약---------------------------------------------- p.3
4)음식에 관한 속담-------------------------------- p.3~6
3. 결 론---------------------------------------------p.6
본문내용
운 맛만큼 단맛도 있는 고추로 바꿨다. 그런데 고추가 후추보다 덜 맵게 되는 시점으로 여겨지는 18세기에 고추는 김치 속으로 들어간다
◆먹는개도 아니 때린다
밥 먹을 때 누군가가 시시콜콜 시비를 던지면 이런 말로 상대를 면박주기 일수였다. 곧 사람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는 때리거나 꾸짖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이 속담에 담겨 있다. 이와 비슷한 뜻으로 \"먹는 개도 아니 때린다\"는 것도 쓰인다. 사람이 아닌 개에게도 밥을 먹을 때는 내버려두는 것이 도리라는 뜻이고 보면 사람이 밥을 먹을 때는 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임이 얼마나 일상에서 강조되었으면 개도 밥을 먹을 때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람이 밥을 먹을 때는 마땅히 존중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에게 역사상 대부분의 지난 과거는 기근의 시대였다. 비록 일부 상류계층들은 먹을거리를 걱정하지 않고 나날을 보냈겠지만, 많은 민중들은 하루하루의 끼니를 해결하고자 노심초사했던 시절이 인간의 역사를 장식한다. 며칠을 굶은 사람이 한끼의 밥을 앞에 놓고 보면 여지없이 개처럼 게걸스럽게 먹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힘들었던 시절을 보냈으면 아침 인사말로 \"밥 먹었느냐\"란 말이 쓰였겠는가. 그러한 기근의 시대에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시비를 걸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는 상징을 만들어냈다.
◆군불에 밥짓기
원래 구들장을 데우기 위해 지피는 불을 \'군불\'이라 부른다. 결코 음식 같은 것을 끓이거나 하기 위해서 때는 불을 군불이라 부르지 않는다. 즉 군불을 땐다는 것은 방을 덥게 하려고 불을 때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적어도 조선시대 이전까지 한반도의 북부지역 사람들은 군불을 때면서 동시에 밥을 지었을 가능성이 많다. 부엌이란 곳이 음식을 장만하는 곳이란 뜻을 지니게 된 배경도 이러하다. 그래서 \'군불에 밥 짓기\'란 속담의 원래 뜻은 \'원 일에 곁따라 다른 일이 손쉽게 이루어지거나 또는 다른 할 일을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 뜻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다른 속담으로는 \'떡 삶은 물에 풀한다\'는 것이 있다. 곧 방을 덥게 하면서 동시에 밥까지 지으니 일거양득(一擧兩得)인 셈이다. 이런 면에서\'군불에 밥 짓기\'란 속담은 구들장이 널리 퍼진 조선 중기 이후에 보편적으로 쓰인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여성과 음식에 관한 속담을 보았다. 여자에 관한 속담을 조사하면서 남녀 불평등에 대한 속담이 많아서 당초 계획했던 것 과는 다르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옛 선조들의 생각과 의식을 이러한 속담을 통해 엿 볼 수 있었다는게 나름대로 재미있었다. 어떤민족이건 뿌리없는 민족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우리것이면서 서민적인 속담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즐겨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윤활제 같은 역할에 커다란 영향을 키쳤음 하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들은 조상들과 같이 숨쉬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뿌리와 줄기와 잎이 하나가되어 크게 자라는 거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1. 서 론--------------------------------------------- p.1
2. 본 론
1)들어가는 말--------------------------------------- p.1
2)여자에 관련된 속담------------------------------ p.1∼3
3)요약---------------------------------------------- p.3
4)음식에 관한 속담-------------------------------- p.3∼6
3. 결 론---------------------------------------------p.6
◆먹는개도 아니 때린다
밥 먹을 때 누군가가 시시콜콜 시비를 던지면 이런 말로 상대를 면박주기 일수였다. 곧 사람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는 때리거나 꾸짖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이 속담에 담겨 있다. 이와 비슷한 뜻으로 \"먹는 개도 아니 때린다\"는 것도 쓰인다. 사람이 아닌 개에게도 밥을 먹을 때는 내버려두는 것이 도리라는 뜻이고 보면 사람이 밥을 먹을 때는 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임이 얼마나 일상에서 강조되었으면 개도 밥을 먹을 때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람이 밥을 먹을 때는 마땅히 존중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에게 역사상 대부분의 지난 과거는 기근의 시대였다. 비록 일부 상류계층들은 먹을거리를 걱정하지 않고 나날을 보냈겠지만, 많은 민중들은 하루하루의 끼니를 해결하고자 노심초사했던 시절이 인간의 역사를 장식한다. 며칠을 굶은 사람이 한끼의 밥을 앞에 놓고 보면 여지없이 개처럼 게걸스럽게 먹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힘들었던 시절을 보냈으면 아침 인사말로 \"밥 먹었느냐\"란 말이 쓰였겠는가. 그러한 기근의 시대에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시비를 걸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는 상징을 만들어냈다.
◆군불에 밥짓기
원래 구들장을 데우기 위해 지피는 불을 \'군불\'이라 부른다. 결코 음식 같은 것을 끓이거나 하기 위해서 때는 불을 군불이라 부르지 않는다. 즉 군불을 땐다는 것은 방을 덥게 하려고 불을 때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적어도 조선시대 이전까지 한반도의 북부지역 사람들은 군불을 때면서 동시에 밥을 지었을 가능성이 많다. 부엌이란 곳이 음식을 장만하는 곳이란 뜻을 지니게 된 배경도 이러하다. 그래서 \'군불에 밥 짓기\'란 속담의 원래 뜻은 \'원 일에 곁따라 다른 일이 손쉽게 이루어지거나 또는 다른 할 일을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 뜻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다른 속담으로는 \'떡 삶은 물에 풀한다\'는 것이 있다. 곧 방을 덥게 하면서 동시에 밥까지 지으니 일거양득(一擧兩得)인 셈이다. 이런 면에서\'군불에 밥 짓기\'란 속담은 구들장이 널리 퍼진 조선 중기 이후에 보편적으로 쓰인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여성과 음식에 관한 속담을 보았다. 여자에 관한 속담을 조사하면서 남녀 불평등에 대한 속담이 많아서 당초 계획했던 것 과는 다르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옛 선조들의 생각과 의식을 이러한 속담을 통해 엿 볼 수 있었다는게 나름대로 재미있었다. 어떤민족이건 뿌리없는 민족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우리것이면서 서민적인 속담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즐겨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윤활제 같은 역할에 커다란 영향을 키쳤음 하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들은 조상들과 같이 숨쉬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뿌리와 줄기와 잎이 하나가되어 크게 자라는 거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1. 서 론--------------------------------------------- p.1
2. 본 론
1)들어가는 말--------------------------------------- p.1
2)여자에 관련된 속담------------------------------ p.1∼3
3)요약---------------------------------------------- p.3
4)음식에 관한 속담-------------------------------- p.3∼6
3. 결 론---------------------------------------------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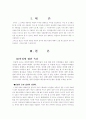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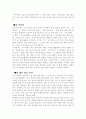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