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음악과(음악수업, 음악교육)의 특징
1. 음악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의 일부분이다
2. 음악은 문화 유산을 전달하는 매체이다
3. 음악은 개인의 감정 상징화의 매체이다
4. 심미적 경험을 준다
Ⅲ. 음악과(음악수업, 음악교육)의 목적
Ⅳ. 음악과(음악수업, 음악교육)의 동향
Ⅴ. 음악과(음악수업, 음악교육)의 교육중점
Ⅵ. 음악과(음악수업, 음악교육)의 내용
1. 내용 체계의 방향
2. 내용 체계
1) 이해
2) 활동
Ⅶ. 음악과(음악수업, 음악교육)의 마인드맵
Ⅷ. 음악과(음악수업, 음악교육)의 지역화교육
1. 지방교육의 창달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 지금까지 선별된 경남의 향토음악 중에 초, 중등학교 학생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용 편곡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지역의 향토음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재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4. 각 지역마다의 음악자료집이 발간되어 교사나 학생들이 그 지역의 향토음악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Ⅸ. 음악과(음악수업, 음악교육)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Ⅱ. 음악과(음악수업, 음악교육)의 특징
1. 음악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의 일부분이다
2. 음악은 문화 유산을 전달하는 매체이다
3. 음악은 개인의 감정 상징화의 매체이다
4. 심미적 경험을 준다
Ⅲ. 음악과(음악수업, 음악교육)의 목적
Ⅳ. 음악과(음악수업, 음악교육)의 동향
Ⅴ. 음악과(음악수업, 음악교육)의 교육중점
Ⅵ. 음악과(음악수업, 음악교육)의 내용
1. 내용 체계의 방향
2. 내용 체계
1) 이해
2) 활동
Ⅶ. 음악과(음악수업, 음악교육)의 마인드맵
Ⅷ. 음악과(음악수업, 음악교육)의 지역화교육
1. 지방교육의 창달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 지금까지 선별된 경남의 향토음악 중에 초, 중등학교 학생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용 편곡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지역의 향토음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재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4. 각 지역마다의 음악자료집이 발간되어 교사나 학생들이 그 지역의 향토음악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Ⅸ. 음악과(음악수업, 음악교육)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그동안 사라져 가는 지방의 음악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작업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주)문화방송에서는 이러한 작업과 관련한 방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의 음악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발굴된 음악자료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귀중한 자료들을 방치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귀중한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우선 경상남도 음악교육의 지역화 성공을 위해서는
1. 지방교육의 창달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지방음악을 발굴하고 개발해도 이것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의 연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지금까지 선별된 경남의 향토음악 중에 초, 중등학교 학생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용 편곡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토민요를 그대로 교육현장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채보된 노래를 그대로 수록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편곡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3. 지역의 향토음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재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민요를 서양악기에 맞추어 노래하는 지금의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향토민요를 국악기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거나, 국악기를 직접 다루면서 노래한다면 더욱더 우리음악의 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4. 각 지역마다의 음악자료집이 발간되어 교사나 학생들이 그 지역의 향토음악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거제지방의 초, 중등학교에서는 거제에서 채보된 음악자료집이 필요하고, 통영지방에는 통영의 음악자료집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여건이 마련된다면 지역화를 향한 경남 음악교육의 성공은 물론이고, 나아가 지역 학생들에게 애향심과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끼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Ⅸ. 음악과(음악수업, 음악교육)의 개선 방안
현재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사실상 흔히 말하는 주요 교과목들의 고득점을 위해 재량활동 시간까지 할애하여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편법적인 운영에 대해 제도적으로 방침을 세워야 한다. 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 학부모들은 체음미 등 예체능 교과목 시간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체능 교과목이 전인교육에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과목 수업 시수의 확보를 위해 좀더 세심한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명문대 진학생 수가 학교의 명예를 가늠하는 의식과 내 자녀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문대로 진학해야 한다는 가족 이기주의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은 헛구호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과목 단위수의 조정이 필요>
음악 교사들은 제대로 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절대적인 수업 시수의 부족을 느끼고 있다. 주당 1시간의 수업으로는 다양한 평가를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1시간을 45분으로 하고 중1은 연68시간, 중2, 중3은 연34시간을 운영한다고 하나 실제 각종 학교 행사나 평가 등으로 인해 실제 수업 시수는 1단위당 연30시간을 채우기 힘든 실정이며 학급당 35~40명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에 수행평가를 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 그리하여 과목 단위수에 대한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학급당 정원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체음미 정책토론회 자료집)에 의하면 평가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교과 재량활동 시간을 수업 시수가 부족한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대안으로 재량활동이 시수가 부족한 교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좋을 것이나 임기응변식으로 운영되어 해마다 바뀐다면 도리어 교사 정원 조정에 대한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1998),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 교육부
김여성(1991), 음악교육의 바른 길, 진주문화사
석문주(1996), 음악적 성장을 위한 음악과 교수·학습 지도, 서울 : 풍남
성경희(1989), 음악과 교육, 서울 : 갑을 출판사
신계휴(1997),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
이용일(1993), 음악교육학개론, 서울 : 현대악보출판사
그동안 사라져 가는 지방의 음악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작업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주)문화방송에서는 이러한 작업과 관련한 방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의 음악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발굴된 음악자료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귀중한 자료들을 방치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귀중한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우선 경상남도 음악교육의 지역화 성공을 위해서는
1. 지방교육의 창달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지방음악을 발굴하고 개발해도 이것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의 연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지금까지 선별된 경남의 향토음악 중에 초, 중등학교 학생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용 편곡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토민요를 그대로 교육현장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채보된 노래를 그대로 수록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편곡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3. 지역의 향토음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재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민요를 서양악기에 맞추어 노래하는 지금의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향토민요를 국악기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거나, 국악기를 직접 다루면서 노래한다면 더욱더 우리음악의 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4. 각 지역마다의 음악자료집이 발간되어 교사나 학생들이 그 지역의 향토음악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거제지방의 초, 중등학교에서는 거제에서 채보된 음악자료집이 필요하고, 통영지방에는 통영의 음악자료집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여건이 마련된다면 지역화를 향한 경남 음악교육의 성공은 물론이고, 나아가 지역 학생들에게 애향심과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끼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Ⅸ. 음악과(음악수업, 음악교육)의 개선 방안
현재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사실상 흔히 말하는 주요 교과목들의 고득점을 위해 재량활동 시간까지 할애하여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편법적인 운영에 대해 제도적으로 방침을 세워야 한다. 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 학부모들은 체음미 등 예체능 교과목 시간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체능 교과목이 전인교육에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과목 수업 시수의 확보를 위해 좀더 세심한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명문대 진학생 수가 학교의 명예를 가늠하는 의식과 내 자녀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문대로 진학해야 한다는 가족 이기주의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은 헛구호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과목 단위수의 조정이 필요>
음악 교사들은 제대로 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절대적인 수업 시수의 부족을 느끼고 있다. 주당 1시간의 수업으로는 다양한 평가를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1시간을 45분으로 하고 중1은 연68시간, 중2, 중3은 연34시간을 운영한다고 하나 실제 각종 학교 행사나 평가 등으로 인해 실제 수업 시수는 1단위당 연30시간을 채우기 힘든 실정이며 학급당 35~40명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에 수행평가를 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 그리하여 과목 단위수에 대한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학급당 정원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체음미 정책토론회 자료집)에 의하면 평가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교과 재량활동 시간을 수업 시수가 부족한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대안으로 재량활동이 시수가 부족한 교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좋을 것이나 임기응변식으로 운영되어 해마다 바뀐다면 도리어 교사 정원 조정에 대한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1998),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 교육부
김여성(1991), 음악교육의 바른 길, 진주문화사
석문주(1996), 음악적 성장을 위한 음악과 교수·학습 지도, 서울 : 풍남
성경희(1989), 음악과 교육, 서울 : 갑을 출판사
신계휴(1997),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
이용일(1993), 음악교육학개론, 서울 : 현대악보출판사
추천자료
 에밀중 사부아 사제의 신앙고백에 대한 감상문
에밀중 사부아 사제의 신앙고백에 대한 감상문 연시계획안
연시계획안 영화감상문 - [홀랜드오퍼스(Mr Holland`s Opus)]를 보고...
영화감상문 - [홀랜드오퍼스(Mr Holland`s Opus)]를 보고... '오페라의 유령'에서의 가면의 의미와 역할
'오페라의 유령'에서의 가면의 의미와 역할 새노래- 음식을 고루 먹으면 (교육계획안)
새노래- 음식을 고루 먹으면 (교육계획안) 음률계획안 - 그러면 안돼
음률계획안 - 그러면 안돼 [아동보육 A]창의적 동작활동을 위한 교육계획안 - 나비의 성장과정 ppt 자료
[아동보육 A]창의적 동작활동을 위한 교육계획안 - 나비의 성장과정 ppt 자료 [분석/조사] 루소, 장 자크 루소, 교육학 발표 자료
[분석/조사] 루소, 장 자크 루소, 교육학 발표 자료 [유아교육] 새노래배우기 - 고기잡이
[유아교육] 새노래배우기 - 고기잡이 백남준 비디오아트 작품 감상, 백남준 비디오예술의 의의
백남준 비디오아트 작품 감상, 백남준 비디오예술의 의의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인 영향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인 영향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영화 가스등
영화 가스등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의 이론적 배경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의 이론적 배경 반두라(Bandura) 사회학습이론의 이해
반두라(Bandura) 사회학습이론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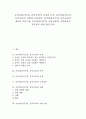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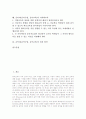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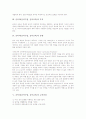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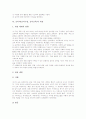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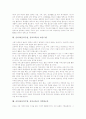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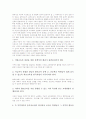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