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회적경제와 자본주의 미래
1. 사회적경제의 대안 모색
2. 자본주의 미래
1. 사회적경제의 대안 모색
2. 자본주의 미래
본문내용
부도 민간부문도 서로
가 협조하고 연대해야 할 상생경제의 시대이다. 정부와 민간영역이 상호 연
대하고 협력하는데 중간 회색지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체 세력이
제3섹터로 혹은 사회적경제이다. 그 주체는 사회적 기업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병페는 공동체의 이익을 전혀 고
려치 않고 극단적으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람욕에 가까움) 모두에게 비극이라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이다. 공유지 비극은 전체를 고려치 않고 개인의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할 때 결국은 다 망하는 길임을 보여준다.
만일 이때 서로가 협력한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소를 5마리 이상 끌고 오지 못하게 하고 하
루 5시간 이상 방목하지 않기 등의 규정을 정하고 개인의 이익을 절제하여
지킨다면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서는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상생협력이 지켜지기 힘들다. 어떤 사
람이 몰래 더 많은 소를 끌고 와서 오랫동안 방목하다면(무임승차) 규칙을 깨지게 되고 공유지의 비극이 재연된다. 누가 규칙을 어기는가에 대한 감독비용이 들고 그만큼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런데 만일 그 동네에 규칙을 어기면 그 동네에서 왕따 당하여 살기 힘
든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쉽게 규칙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감시에 의하여
사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회규범(norm)이 사회자
본이 된다면 상생협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는 부
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시의 사회규범에 의하면 \'상놈\' 취급을 받아
양반동네에 살 수 없는 사회적 규범(일종의 social capital 임)이 있었다. 이런경우 당시엔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복지제도가 필요 없었다. 당시의 사회자
본인 \'효\'라는 규범(norm)에 의하여 모든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므로 노후
문제가 가정 안에서 내생적으로 해결되는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었다. 정부
의 중앙집권적인 복지시스템은 행정비용의 낭비가 따르는데 민간영역의 사
회서비스 제공은 시장기능을 통과하므로 낭비가 적은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사회 소외계층을 돕고 자선활동을 활성화시켜 그 사회의 사회적인 규범으
로 정착되도록 하는 사회자본이 형성될 때 공동체 경제가 잘 활성화된다.
남을 배려하는 자세, 신뢰, 자선행위 등의 사회자본이 필수적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큼에도 불구
하고 빈곤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미국 특유의 기
부문화와 자선활동이라는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있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경
제는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경제생
태계 시스템이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학습, 교육하여 우리나라도 사회자본을 축적시켜야
한다. 사회자본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쯤으로 생각하는데 공짜가
아니다.
긴 시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참여시키는 봉사활동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사회적 투자이다. 이 사회적 투자는 개별경제 주체에겐 그 이익
이 작아 민간기업이나 개인은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부의 공공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다. 정부의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체 자본주의 정신을 교
육시켜 건전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다. 건전한 사회적 규범이라
는 사회자본이 튼튼할 때 자본주의도 자기 혼자만 아는 천민자본주의로 흐
리지 않을 것이다.
가 협조하고 연대해야 할 상생경제의 시대이다. 정부와 민간영역이 상호 연
대하고 협력하는데 중간 회색지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체 세력이
제3섹터로 혹은 사회적경제이다. 그 주체는 사회적 기업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병페는 공동체의 이익을 전혀 고
려치 않고 극단적으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람욕에 가까움) 모두에게 비극이라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이다. 공유지 비극은 전체를 고려치 않고 개인의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할 때 결국은 다 망하는 길임을 보여준다.
만일 이때 서로가 협력한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소를 5마리 이상 끌고 오지 못하게 하고 하
루 5시간 이상 방목하지 않기 등의 규정을 정하고 개인의 이익을 절제하여
지킨다면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서는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상생협력이 지켜지기 힘들다. 어떤 사
람이 몰래 더 많은 소를 끌고 와서 오랫동안 방목하다면(무임승차) 규칙을 깨지게 되고 공유지의 비극이 재연된다. 누가 규칙을 어기는가에 대한 감독비용이 들고 그만큼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런데 만일 그 동네에 규칙을 어기면 그 동네에서 왕따 당하여 살기 힘
든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쉽게 규칙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감시에 의하여
사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회규범(norm)이 사회자
본이 된다면 상생협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는 부
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시의 사회규범에 의하면 \'상놈\' 취급을 받아
양반동네에 살 수 없는 사회적 규범(일종의 social capital 임)이 있었다. 이런경우 당시엔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복지제도가 필요 없었다. 당시의 사회자
본인 \'효\'라는 규범(norm)에 의하여 모든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므로 노후
문제가 가정 안에서 내생적으로 해결되는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었다. 정부
의 중앙집권적인 복지시스템은 행정비용의 낭비가 따르는데 민간영역의 사
회서비스 제공은 시장기능을 통과하므로 낭비가 적은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사회 소외계층을 돕고 자선활동을 활성화시켜 그 사회의 사회적인 규범으
로 정착되도록 하는 사회자본이 형성될 때 공동체 경제가 잘 활성화된다.
남을 배려하는 자세, 신뢰, 자선행위 등의 사회자본이 필수적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큼에도 불구
하고 빈곤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미국 특유의 기
부문화와 자선활동이라는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있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경
제는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경제생
태계 시스템이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학습, 교육하여 우리나라도 사회자본을 축적시켜야
한다. 사회자본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쯤으로 생각하는데 공짜가
아니다.
긴 시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참여시키는 봉사활동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사회적 투자이다. 이 사회적 투자는 개별경제 주체에겐 그 이익
이 작아 민간기업이나 개인은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부의 공공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다. 정부의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체 자본주의 정신을 교
육시켜 건전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다. 건전한 사회적 규범이라
는 사회자본이 튼튼할 때 자본주의도 자기 혼자만 아는 천민자본주의로 흐
리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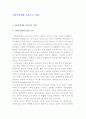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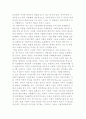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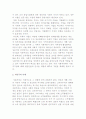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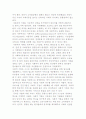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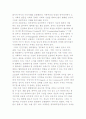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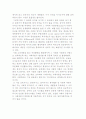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