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본론
2.1. 恨의 美學
2.2. 女性意識
2.3. 민요시적 특질
2.4. 민족의식의 형상화
3.결론
<참고문헌>
2.본론
2.1. 恨의 美學
2.2. 女性意識
2.3. 민요시적 특질
2.4. 민족의식의 형상화
3.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이 것을 토대로 소월시와 고려가요의 기본율격은 3음보가 중심임을 알 수 있다. 김소월의 〈산유화〉와 고려가요 <서경별곡〉을 비교해보자.
산에는/ 잣네/ 치잣네 서경이/ 셔울히/ 마르는
갈봄/ 녀름업시/ 치잣네 닷곤/ 쇼셩경/ 고마른
산에/ 산에/ 잣는 츤 여므른/질삼뵈/ 리시고
저만치/ 혼자서/ 잣여잇네 괴시란/ 우러곰/ 좃니노이다
「산유화」 일부 「서경별곡」 일부
둘째, 고려가요와 소월시의 정한은 애환적애수적인 3음보를 취함으로써 그 시적효과를 거두었는 연관성이 있다.
셋째, 소월시와 고려가요에 공통되는 정은 만남과 이별의 상태에서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만남보다는 이별에서 이미지의 강렬함을 더해 준다.
넷째, 소월시와 고려가요에 있어서 한은 임의 상실에서 기인한다. 이 이별의 감정은 만남을 촉발시키다가, 만나리라는 기대감이 좌절될 때 체념과 패배의식이 남게 되고, 이로써 삶과 죽음을 동질적 감정으로 여긴다. 삶과 죽음의 동질적 감정 이것이 한에 있어 고려가요와 소월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은숙, 「金素月 詩에서 본 高麗歌謠와의 脈絡硏究」, 효성여대석사학위논문, 1981, pp.47~48.
2.4. 민족의식의 형상화
일제 강점하의 식민지 시대를 살다 간 소월 역시, 식민지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다. 소월은 한 개인으로서 사랑에 실패하고 삶에 좌절하여 비극적인 생애를 살다 갔다. 또한 피지배 민족의 일원으로서 수모와 멍에를 안고 살다 간 사람이기도 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학이면서 민중적인 문학, 자기 구원의 문학이면서 민족 구원의 문학으로 변증법적 승화를 이룬 곳에 소월 문학이 위치한다. 역사의 주체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코자 하는 노력만큼 더 긴요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월의 민요시 창작은 일종의 문화적 저항행위로 볼 수 있다. 민요조 가락에 우리의 정서와 혼을 불어넣음으로써 민족공동체 의식을 환기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소월은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민요시 창작에만 만족할 수 없었던 소월은 좀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민족의식의 표출이 필요했다. 이런 요구에서 그의 민족주위 저항시들이 쓰여졌다.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즈런히
다양에 말을로 돌아 오는 것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섭대일 땅이 있었더면
이처럼 떠돌으랴. 아침에 점을 손에
새라새롭은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랴, 서
산에는/ 잣네/ 치잣네 서경이/ 셔울히/ 마르는
갈봄/ 녀름업시/ 치잣네 닷곤/ 쇼셩경/ 고마른
산에/ 산에/ 잣는 츤 여므른/질삼뵈/ 리시고
저만치/ 혼자서/ 잣여잇네 괴시란/ 우러곰/ 좃니노이다
「산유화」 일부 「서경별곡」 일부
둘째, 고려가요와 소월시의 정한은 애환적애수적인 3음보를 취함으로써 그 시적효과를 거두었는 연관성이 있다.
셋째, 소월시와 고려가요에 공통되는 정은 만남과 이별의 상태에서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만남보다는 이별에서 이미지의 강렬함을 더해 준다.
넷째, 소월시와 고려가요에 있어서 한은 임의 상실에서 기인한다. 이 이별의 감정은 만남을 촉발시키다가, 만나리라는 기대감이 좌절될 때 체념과 패배의식이 남게 되고, 이로써 삶과 죽음을 동질적 감정으로 여긴다. 삶과 죽음의 동질적 감정 이것이 한에 있어 고려가요와 소월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은숙, 「金素月 詩에서 본 高麗歌謠와의 脈絡硏究」, 효성여대석사학위논문, 1981, pp.47~48.
2.4. 민족의식의 형상화
일제 강점하의 식민지 시대를 살다 간 소월 역시, 식민지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다. 소월은 한 개인으로서 사랑에 실패하고 삶에 좌절하여 비극적인 생애를 살다 갔다. 또한 피지배 민족의 일원으로서 수모와 멍에를 안고 살다 간 사람이기도 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학이면서 민중적인 문학, 자기 구원의 문학이면서 민족 구원의 문학으로 변증법적 승화를 이룬 곳에 소월 문학이 위치한다. 역사의 주체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코자 하는 노력만큼 더 긴요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월의 민요시 창작은 일종의 문화적 저항행위로 볼 수 있다. 민요조 가락에 우리의 정서와 혼을 불어넣음으로써 민족공동체 의식을 환기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소월은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민요시 창작에만 만족할 수 없었던 소월은 좀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민족의식의 표출이 필요했다. 이런 요구에서 그의 민족주위 저항시들이 쓰여졌다.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즈런히
다양에 말을로 돌아 오는 것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섭대일 땅이 있었더면
이처럼 떠돌으랴. 아침에 점을 손에
새라새롭은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랴,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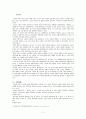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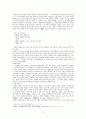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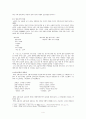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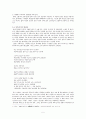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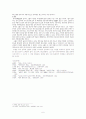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