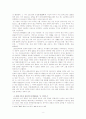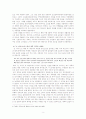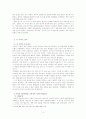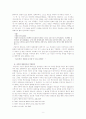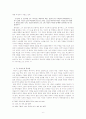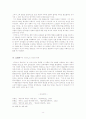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논 이야기」의 풍자성
1. 풍자작가 채만식과 해방기 직후 시대상
2. 「논 이야기」 분석
3. 「논 이야기」의 풍자성
Ⅲ. 나오며-「논 이야기」의 의의와 한계
Ⅱ. 「논 이야기」의 풍자성
1. 풍자작가 채만식과 해방기 직후 시대상
2. 「논 이야기」 분석
3. 「논 이야기」의 풍자성
Ⅲ. 나오며-「논 이야기」의 의의와 한계
본문내용
가 관찰하여 보고하고 있는 인물이 부정적인 인물인 경우이다. 서술자는 부정적인 인물을 매우 긍정적으로 서술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보면 그것이 냉소적이고 풍자적임이 드러나며 여기에서 서술자는 함축적 작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⑵ 논 이야기의 타인에 대한 풍자 양상 송현호, 위의 논문, 210~213쪽
논 이야기의 서술자는 부정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인 한덕문을 표면에 내세워서 당대의 현실을 냉소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는 부친이 동학란의 누명을 쓰는 바람에 고을 원에게 강제로 열 세 마지기의 논을 빼앗겼지만 남은 일곱 마지기를 잘 경작해서 살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술과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그 빛을 갚기 위해서 나머지 논 마저 일본인에게 팔아버리는 얼치기 소작농이다. 그런 그가 일본인들이 물러가자 자기 논을 찾겠다고 나섰다가 그것이 어렵게 되자 차라리 나라 없는 백성이 낫다, 혹은 독립이 됐을 때 만세 안 부르길 잘 했지 등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일제 식민지와 해방된 조국의 현실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의 의식 이면에는 이기적인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으니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표면적으로 보면 개인의 이득에 보탬이 없다면 나라도 필요없다는 것이지만 그 말의 냉소적이고 반어적인 어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독립을 신통찮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탐관오리와 그들의 착취에 기인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나라란 백성에게 고통이지 고마운 존재가 아니었다. 또 꼭 있어야 할 요긴한 것도 아니었다. ‘독립이 천지 개벽이 아닌 이상, 가난한 농투성이가 느닷없이 부자장자 될 이치가 없는 것이요, 원 아전 토반이나 일본놈 대신에 만만하고 가난한 농투성이를 핍박하는 권세 있는 양반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농업 정책과 위정자들의 등장을 갈구하면서 당대의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과 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논 이야기에서는 해방 직후의 농민들의 몰지각한 행동과 불합리한 농정을 냉소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서술자는 자신이 아닌 한덕문을 내세워 당시 세태의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시켜 풍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인물 풍자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 농민들의 토지개혁의 바람을 날카로운 역사의식을 통해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조창환, 위의 논문, 44쪽
해방 이후 리얼리즘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채만식이 여전히 간접적인 풍자의 수법을 즐겨 구사하고 있던 것은 다분히 자기 변명의 성격이 짙기는 하지만, 이는 당대의 현실이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진실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데 기인한다.
Ⅲ. 나오며-논 이야기의 의의와 한계
지금까지 채만식의 논 이야기라는 작품을 이 작품의 주요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기법인 풍자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다. 풍자는 문학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기법중의 하나이지만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방편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반영적 의미를 강하게 띤다. 즉 채만식은 풍자라는 기법을 통해서 당대 해방직후의 농지 개혁을 둘러싼 혼란하고 모순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당시의 과도기적 시대상황에 대한 풍자보다는 한생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풍자의 차원에 치우치는 바람에 작가가 본래 작품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풍자의 효과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간접적인 비판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비록 1930년대의 레디메이드 인생, 치숙과 같은 류의 풍자작품들이 지니고 있던 리얼리즘적인 전형성을 많이 잃기는 했지만, 여전히 작가 채만식이 해방공간의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시선을 던짐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지적하고 풍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데 이 작품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봉진, 채만식의 후반기 작품 연구, 한국학논집, 1986
송현호, 채만식 소설의 풍자유형 연구, 한중인문과학연구, 2002
신호민, 채만식의 삶과 문학 , 목원국어국문학, 2000
이명우, 해방직후의 채만식 소설 연구, 동국어문학, 1994
정홍섭, 채만식 문학의 풍자적 특질,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02
조정래, 해방 직후의 농민 소설과 토지 문제, 서경대학교논문집, 1988
조창환, 해방후 채만식 소설 연구, 우석어문, 1998
20세기 한국소설 05 채만식김유정, 창비, 2005
⑵ 논 이야기의 타인에 대한 풍자 양상 송현호, 위의 논문, 210~213쪽
논 이야기의 서술자는 부정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인 한덕문을 표면에 내세워서 당대의 현실을 냉소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는 부친이 동학란의 누명을 쓰는 바람에 고을 원에게 강제로 열 세 마지기의 논을 빼앗겼지만 남은 일곱 마지기를 잘 경작해서 살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술과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그 빛을 갚기 위해서 나머지 논 마저 일본인에게 팔아버리는 얼치기 소작농이다. 그런 그가 일본인들이 물러가자 자기 논을 찾겠다고 나섰다가 그것이 어렵게 되자 차라리 나라 없는 백성이 낫다, 혹은 독립이 됐을 때 만세 안 부르길 잘 했지 등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일제 식민지와 해방된 조국의 현실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의 의식 이면에는 이기적인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으니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표면적으로 보면 개인의 이득에 보탬이 없다면 나라도 필요없다는 것이지만 그 말의 냉소적이고 반어적인 어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독립을 신통찮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탐관오리와 그들의 착취에 기인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나라란 백성에게 고통이지 고마운 존재가 아니었다. 또 꼭 있어야 할 요긴한 것도 아니었다. ‘독립이 천지 개벽이 아닌 이상, 가난한 농투성이가 느닷없이 부자장자 될 이치가 없는 것이요, 원 아전 토반이나 일본놈 대신에 만만하고 가난한 농투성이를 핍박하는 권세 있는 양반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농업 정책과 위정자들의 등장을 갈구하면서 당대의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과 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논 이야기에서는 해방 직후의 농민들의 몰지각한 행동과 불합리한 농정을 냉소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서술자는 자신이 아닌 한덕문을 내세워 당시 세태의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시켜 풍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인물 풍자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 농민들의 토지개혁의 바람을 날카로운 역사의식을 통해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조창환, 위의 논문, 44쪽
해방 이후 리얼리즘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채만식이 여전히 간접적인 풍자의 수법을 즐겨 구사하고 있던 것은 다분히 자기 변명의 성격이 짙기는 하지만, 이는 당대의 현실이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진실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데 기인한다.
Ⅲ. 나오며-논 이야기의 의의와 한계
지금까지 채만식의 논 이야기라는 작품을 이 작품의 주요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기법인 풍자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다. 풍자는 문학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기법중의 하나이지만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방편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반영적 의미를 강하게 띤다. 즉 채만식은 풍자라는 기법을 통해서 당대 해방직후의 농지 개혁을 둘러싼 혼란하고 모순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당시의 과도기적 시대상황에 대한 풍자보다는 한생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풍자의 차원에 치우치는 바람에 작가가 본래 작품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풍자의 효과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간접적인 비판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비록 1930년대의 레디메이드 인생, 치숙과 같은 류의 풍자작품들이 지니고 있던 리얼리즘적인 전형성을 많이 잃기는 했지만, 여전히 작가 채만식이 해방공간의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시선을 던짐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지적하고 풍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데 이 작품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봉진, 채만식의 후반기 작품 연구, 한국학논집, 1986
송현호, 채만식 소설의 풍자유형 연구, 한중인문과학연구, 2002
신호민, 채만식의 삶과 문학 , 목원국어국문학, 2000
이명우, 해방직후의 채만식 소설 연구, 동국어문학, 1994
정홍섭, 채만식 문학의 풍자적 특질,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02
조정래, 해방 직후의 농민 소설과 토지 문제, 서경대학교논문집, 1988
조창환, 해방후 채만식 소설 연구, 우석어문, 1998
20세기 한국소설 05 채만식김유정, 창비,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