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심리학적 고찰 (심리학책)
(2) 자연재해로 인해 역으로 발생한 자연친화적 정서
-불교를 받아들인 방법과 문학관
-언어에 나타난 문학관
(3)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불안한 정서
-관동대지진참사와 이로 인한 문학사조의 변화
-태풍 등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투영된 문학관
1> 방장기
2> 시집 슬픈 장난감 中
(4) 그림으로 보는 일본의 자연재해
(5) 관동대지진의 영향을 받은 엔카
- 가사(歌詞)
3. 결론
2. 본론
(1) 심리학적 고찰 (심리학책)
(2) 자연재해로 인해 역으로 발생한 자연친화적 정서
-불교를 받아들인 방법과 문학관
-언어에 나타난 문학관
(3)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불안한 정서
-관동대지진참사와 이로 인한 문학사조의 변화
-태풍 등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투영된 문학관
1> 방장기
2> 시집 슬픈 장난감 中
(4) 그림으로 보는 일본의 자연재해
(5) 관동대지진의 영향을 받은 엔카
- 가사(歌詞)
3. 결론
본문내용
사람도 예전과 같이 많이 살고 있지만, 내가 이전에 만나 알고 지낸 사람은 이삼십 명 가운데 겨우 한 두 사람이다. 한쪽에서 아침에 사람이 죽어가는가 하면 다른 꼭에서는 저녁 무렵에 사람이 때어나곤 한다. 이렇듯 인간 세상은 그저 강물 위에 맺혔다가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다. <중략>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이란 도대체 어디서 오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모르는 일이 또 잇다. 무상한 세상에서 임시로 살아가는 것이 집인데,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고심해서 좋은 집을 짓고, 무엇 때문에 그 집을 보고 즐거워하는가? 한 집의 주인과 집이 서로 무상함을 다투듯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비유해서 말하자면. ‘활짝 핀 나팔꽃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나팔꽃이 남아 있다고 해도 아침 햇살에 그 이슬은 곧 사라져 버린다. 혹은 나팔꽃이 시들어도 이슬은 그대로 남아 있으나, 그 이슬 역시 아침 햇살에 쪼이면 곧 시들어 버린다. 설사 아침 이슬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저녁때까지 그 이슬이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는다. ‘방장기’ 가모노 초메이 지음 / 조기호 옮김 p.26~29 中 제 2단, 3단 일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모노는 재해로 인해 허물어져 가는 건물들과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물거품’, ‘이슬’ 등의 문예적 표현을 통해서 가모노 자신이 말하는 허무철학의 근거를 여러가지 재해에서 찾고 세상의 인간과 단절없이 붙어다니는 여러가지 고뇌와 불안과 무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가 -일본인-의 고뇌와 탄식을 현재형의 문체로 풀어가면서 간결하고 평이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말한다. 심지어 가모노는 이런 불안 심리를 조소하기도 했는데, 지진과 각종 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일본이란 나라에서 집을 만드는 데 그렇게 돈과 노력을 많이 드리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라는 것이다.
방장기의 저자인 가모노의 표현과 글들에서 고대 일본인들의 불안의식 깊숙한 곳 부터 자연환경에 대한 공포의식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그들의 문학에는 인간의 허무한 죽음, 짧은 생애에 대한 탄식,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과 같은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시집(詩集) 슬픈 장난감 中
다음으로는 일본에서 1909년 5월에 발표된 단가로, 짧은 문장 속에 재해를 겪고 난 후의 자신들의 처지와 삶에 대한 애상감을 표현해 냈다.
하룻밤 사이 폭풍우가 몰아쳐 만들어 낸
이 모래 언덕
누구의 무덤인가. 시집 ‘슬픈 장난감’ 中 단가 한편. 이시카와 타쿠보쿠 지음.
한 순간 몰아친 폭풍우로 인해 죽어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누구의 무덤인가’라는 구절로써 안타까워한 타쿠보쿠의 시정(詩情)은 고대 일본인들이 느꼈던 감정과 다르지 않다. 시대가 지나가도 감당할 수 없는 재해들로 인한 불안은 인간에 대한 연민과 동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4) 그림으로 보는 일본의 자연재해
(5) 관동대지진의 영향을 받은 엔카 - 가사(歌詞)
己(おれ)は河原(かわら)の 枯(か)れ芒(すすき)
同じお前も 枯れ芒
どうせ二人は この世では
花のかない 枯れ芒
死ぬも生きるも ねえお前
水の流れに 何(なにかわ)ろ
己もお前も 利根川(とねがわ)の
船の船頭(せんどう)で 暮らそうよ
なぜに冷たい 吹く風が
枯れた芒の 二人ゆえ
熱いの 出た時は
汲(く)んでお(く)れよ お月さん
枯れた菰(まこも)に 照らしてる
潮(いたこ)出島(でじま)の お月さん
わたしゃこれから 利根川の
船の船頭で 暮らすのよ
당신(꺾어져)은 강변(강가의 모래밭)의 고(인가) 망(참억새)
같은 너도 원숙해져 망
어차피 두 명은 이 세상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 시들어 망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응 너
물의 흐름에 무슨변(무엇인가원)
당신이나 너도 토네가와(토네가와)의
배의 사공(선 어때)으로 살자
왜 차가운 부는 바람이
시든 망의 두 명 해라
뜨거운 눈물이 나왔을 때는
급(구) 그리고 오(구) 야 월씨
시든 줄풀(거적)에 비추고 있다
이타코(이타코) 데지마(데지마)의 월씨
나는 지금부터 토네가와의
배의 사공으로 살아
결론
지금까지 일본의 자연재해가 일본인의 정신과 문학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았다. 첫째로 우리가 찾은 일본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된 모습이었고 자연친화적 정서까지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불교, 언어에서 드러나는 문학관을 근거로 들었다. 일본문학에서는 자연에 대한 증오는 나타나있지 않다. 그들은 단지 경외할 뿐이다. 위의 문학작품들 속에서 나타나듯이 오랜 세월 대 재해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그들은 인생의 덧없음과 짧은 순간을 탄식하며 불안마저도 문학 작품 속에서 승화시켰다. 때로는 교훈으로써, 고통으로써, 역으로 불안한 현실을 잊고자 함 등 에서 어떤 식으로든 표현되어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일본 문학에 있어서 재해는 단순히 작품에 녹아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작품을 쓰는 문인들에게 자각과 깨달음의 계기로써의 의미도 크다. 깨달음을 통해 문예사조가 변하고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문학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증오는 나타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 너무나 많이 겪어서 무덤덤해졌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얻는 그 무언가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서정적인 문학보다 불안 심리의 문학을 찾고자 한 것은, 서정적인 일본 문학의 배경엔 분명 자연으로부터 오는 경외감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문점에서 시작되었다. 주 교재인, ‘일본 문학의 이해’에서 “일본은 비교적 온난한 섬나라라는 자연환경으로 인해 문학작품에 서정적인 경향이 짙게 배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다른 시각에서 서정적 문학의 발생 원인을 찾아본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불안한 심리가 거친 행동방식으로 문학에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각종 사례를 들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우리의 연구는 책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일본인의 사상과 문학에 접근 했다는 것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자료를 수집하느라 여러 시간을 투자했으며, 주제 자체의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다. 하지만 보람찬 조별 과제가 되었음에 기쁜 마음이다.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이란 도대체 어디서 오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모르는 일이 또 잇다. 무상한 세상에서 임시로 살아가는 것이 집인데,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고심해서 좋은 집을 짓고, 무엇 때문에 그 집을 보고 즐거워하는가? 한 집의 주인과 집이 서로 무상함을 다투듯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비유해서 말하자면. ‘활짝 핀 나팔꽃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나팔꽃이 남아 있다고 해도 아침 햇살에 그 이슬은 곧 사라져 버린다. 혹은 나팔꽃이 시들어도 이슬은 그대로 남아 있으나, 그 이슬 역시 아침 햇살에 쪼이면 곧 시들어 버린다. 설사 아침 이슬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저녁때까지 그 이슬이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는다. ‘방장기’ 가모노 초메이 지음 / 조기호 옮김 p.26~29 中 제 2단, 3단 일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모노는 재해로 인해 허물어져 가는 건물들과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물거품’, ‘이슬’ 등의 문예적 표현을 통해서 가모노 자신이 말하는 허무철학의 근거를 여러가지 재해에서 찾고 세상의 인간과 단절없이 붙어다니는 여러가지 고뇌와 불안과 무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가 -일본인-의 고뇌와 탄식을 현재형의 문체로 풀어가면서 간결하고 평이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말한다. 심지어 가모노는 이런 불안 심리를 조소하기도 했는데, 지진과 각종 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일본이란 나라에서 집을 만드는 데 그렇게 돈과 노력을 많이 드리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라는 것이다.
방장기의 저자인 가모노의 표현과 글들에서 고대 일본인들의 불안의식 깊숙한 곳 부터 자연환경에 대한 공포의식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그들의 문학에는 인간의 허무한 죽음, 짧은 생애에 대한 탄식,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과 같은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시집(詩集) 슬픈 장난감 中
다음으로는 일본에서 1909년 5월에 발표된 단가로, 짧은 문장 속에 재해를 겪고 난 후의 자신들의 처지와 삶에 대한 애상감을 표현해 냈다.
하룻밤 사이 폭풍우가 몰아쳐 만들어 낸
이 모래 언덕
누구의 무덤인가. 시집 ‘슬픈 장난감’ 中 단가 한편. 이시카와 타쿠보쿠 지음.
한 순간 몰아친 폭풍우로 인해 죽어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누구의 무덤인가’라는 구절로써 안타까워한 타쿠보쿠의 시정(詩情)은 고대 일본인들이 느꼈던 감정과 다르지 않다. 시대가 지나가도 감당할 수 없는 재해들로 인한 불안은 인간에 대한 연민과 동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4) 그림으로 보는 일본의 자연재해
(5) 관동대지진의 영향을 받은 엔카 - 가사(歌詞)
己(おれ)は河原(かわら)の 枯(か)れ芒(すすき)
同じお前も 枯れ芒
どうせ二人は この世では
花のかない 枯れ芒
死ぬも生きるも ねえお前
水の流れに 何(なにかわ)ろ
己もお前も 利根川(とねがわ)の
船の船頭(せんどう)で 暮らそうよ
なぜに冷たい 吹く風が
枯れた芒の 二人ゆえ
熱いの 出た時は
汲(く)んでお(く)れよ お月さん
枯れた菰(まこも)に 照らしてる
潮(いたこ)出島(でじま)の お月さん
わたしゃこれから 利根川の
船の船頭で 暮らすのよ
당신(꺾어져)은 강변(강가의 모래밭)의 고(인가) 망(참억새)
같은 너도 원숙해져 망
어차피 두 명은 이 세상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 시들어 망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응 너
물의 흐름에 무슨변(무엇인가원)
당신이나 너도 토네가와(토네가와)의
배의 사공(선 어때)으로 살자
왜 차가운 부는 바람이
시든 망의 두 명 해라
뜨거운 눈물이 나왔을 때는
급(구) 그리고 오(구) 야 월씨
시든 줄풀(거적)에 비추고 있다
이타코(이타코) 데지마(데지마)의 월씨
나는 지금부터 토네가와의
배의 사공으로 살아
결론
지금까지 일본의 자연재해가 일본인의 정신과 문학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았다. 첫째로 우리가 찾은 일본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된 모습이었고 자연친화적 정서까지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불교, 언어에서 드러나는 문학관을 근거로 들었다. 일본문학에서는 자연에 대한 증오는 나타나있지 않다. 그들은 단지 경외할 뿐이다. 위의 문학작품들 속에서 나타나듯이 오랜 세월 대 재해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그들은 인생의 덧없음과 짧은 순간을 탄식하며 불안마저도 문학 작품 속에서 승화시켰다. 때로는 교훈으로써, 고통으로써, 역으로 불안한 현실을 잊고자 함 등 에서 어떤 식으로든 표현되어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일본 문학에 있어서 재해는 단순히 작품에 녹아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작품을 쓰는 문인들에게 자각과 깨달음의 계기로써의 의미도 크다. 깨달음을 통해 문예사조가 변하고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문학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증오는 나타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 너무나 많이 겪어서 무덤덤해졌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얻는 그 무언가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서정적인 문학보다 불안 심리의 문학을 찾고자 한 것은, 서정적인 일본 문학의 배경엔 분명 자연으로부터 오는 경외감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문점에서 시작되었다. 주 교재인, ‘일본 문학의 이해’에서 “일본은 비교적 온난한 섬나라라는 자연환경으로 인해 문학작품에 서정적인 경향이 짙게 배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다른 시각에서 서정적 문학의 발생 원인을 찾아본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불안한 심리가 거친 행동방식으로 문학에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각종 사례를 들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우리의 연구는 책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일본인의 사상과 문학에 접근 했다는 것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자료를 수집하느라 여러 시간을 투자했으며, 주제 자체의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다. 하지만 보람찬 조별 과제가 되었음에 기쁜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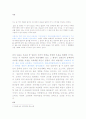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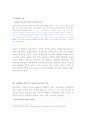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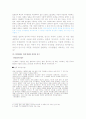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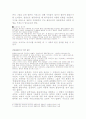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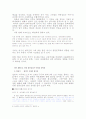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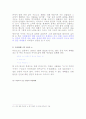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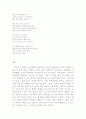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