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식주 문화
1) 의(衣)
2) 식(食)
3) 주(宙)
2. 교육문화
3. 예술문화
4. 언어문화
I. 결론
참고문헌
1) 의(衣)
2) 식(食)
3) 주(宙)
2. 교육문화
3. 예술문화
4. 언어문화
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펴보면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본래 언어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언어는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사고가 그대로 언어로 표현될 수도 있으며 언어를 통해서 사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어와 한국어로 동양과 서양의 언어 사용을 비교 분석해보면 한국인은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회사’와 같이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심지어 ‘우리 남편’ 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를 ‘our husband’라고 영어로 직역한다면 매우 어색한 표현이 된다. 이때는 ‘my husband’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이렇듯 영어에서는 소유를 표현할 때 ‘우리’ 대신 ‘나’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어에서 그 사용자들의 기본 사고를 읽어낼 수 있다고 말했듯이 동양 문화에서는 언어에도 공동체의식이 녹아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이라고 표현하는데서, 개인의 소유를 앞세우기 보다는 대화의 상대자와 거리감을 좁히면서 서로 함께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를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을 확장시켜 ‘우리’라는 개념으로 고정적으로 사용하면서 가족이나 다른 상위 집단을 또 다른 자신으로 여기는 태도를 볼 수 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자신의 것과 타자의 것을 확실히 구별하며 큰 사회가 기준이 아니라 개인을 기준으로 사회를 인식하고, 타인들과 대화를 한다는 점에서 서양문화에서의 자아는 개인에 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지금까지 동·서양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문화의 겉모습의 내면에 있는 각 문화권의 사람들의 의식을 추리하고 분석해보면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술 문화와 의사소통 방식 등 좀 더 다양한 문화를 다루지 못하였으며 의식구조의 더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연구하지 못 한 점이 아쉽다.
동양인들은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서양인들의 사고 방식이 더 좋아 보인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의 사고 방식이 더 좋아 보인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각 문화권 사람들은 각각의 문화가 당면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서로의 문화로서 배워야 한다고 느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완벽할 수 없듯이 문화 또한 그렇다고 본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화를 바라보는 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문화의 우열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차이점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 장·단점에 대해 파악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를 깊이 이해하면서 우리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도 더 풍부해진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의 문화를 지키면서도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를 수 있는 유연한 문화 정체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명진,『동과 서』, 예담, (2008).
오주석,『오주석의 한국의 美 특강』, 솔, (2006).
최영진,『동양과 서양』, 지식산업사, (1993).
왜냐하면 언어는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사고가 그대로 언어로 표현될 수도 있으며 언어를 통해서 사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어와 한국어로 동양과 서양의 언어 사용을 비교 분석해보면 한국인은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회사’와 같이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심지어 ‘우리 남편’ 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를 ‘our husband’라고 영어로 직역한다면 매우 어색한 표현이 된다. 이때는 ‘my husband’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이렇듯 영어에서는 소유를 표현할 때 ‘우리’ 대신 ‘나’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어에서 그 사용자들의 기본 사고를 읽어낼 수 있다고 말했듯이 동양 문화에서는 언어에도 공동체의식이 녹아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이라고 표현하는데서, 개인의 소유를 앞세우기 보다는 대화의 상대자와 거리감을 좁히면서 서로 함께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를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을 확장시켜 ‘우리’라는 개념으로 고정적으로 사용하면서 가족이나 다른 상위 집단을 또 다른 자신으로 여기는 태도를 볼 수 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자신의 것과 타자의 것을 확실히 구별하며 큰 사회가 기준이 아니라 개인을 기준으로 사회를 인식하고, 타인들과 대화를 한다는 점에서 서양문화에서의 자아는 개인에 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지금까지 동·서양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문화의 겉모습의 내면에 있는 각 문화권의 사람들의 의식을 추리하고 분석해보면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술 문화와 의사소통 방식 등 좀 더 다양한 문화를 다루지 못하였으며 의식구조의 더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연구하지 못 한 점이 아쉽다.
동양인들은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서양인들의 사고 방식이 더 좋아 보인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의 사고 방식이 더 좋아 보인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각 문화권 사람들은 각각의 문화가 당면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서로의 문화로서 배워야 한다고 느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완벽할 수 없듯이 문화 또한 그렇다고 본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화를 바라보는 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문화의 우열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차이점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 장·단점에 대해 파악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를 깊이 이해하면서 우리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도 더 풍부해진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의 문화를 지키면서도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를 수 있는 유연한 문화 정체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명진,『동과 서』, 예담, (2008).
오주석,『오주석의 한국의 美 특강』, 솔, (2006).
최영진,『동양과 서양』, 지식산업사,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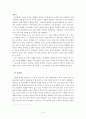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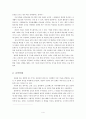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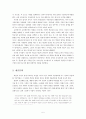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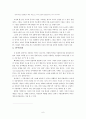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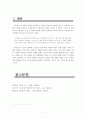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