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을미사변 이전의 조선과 일본의 정세
ⅰ 19세기 조선의 정세
ⅱ 19세기 일본의 정세
Ⅲ 을미사변의 배경과 과정
Ⅳ 을미사변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대응
Ⅴ 결론
Ⅱ 을미사변 이전의 조선과 일본의 정세
ⅰ 19세기 조선의 정세
ⅱ 19세기 일본의 정세
Ⅲ 을미사변의 배경과 과정
Ⅳ 을미사변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대응
Ⅴ 결론
본문내용
치른 보람도, 민 왕후를 시해한 대가도 받을 길이 없어진 셈인 것이다.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에 도착하자마자 친일 내각의 각료들을 역적으로 규정하고 포살령(捕殺令)을 내렸다. 김홍집과 정병하는 체포되는 도중에, 탁지부대신 어윤중은 고향으로 도망가다 군중에게 타살되었다. 그리고 유길준(내부대신), 장박(법부대신), 조희연(군부대신) 등 이진호, 우범선 등 친위대 간부들은 일본으로 망명했다. 이 직후 고종은 새 내각을 조직했는데 박정양, 이재순, 이완용, 이윤용, 윤용구, 안경수 등을 내각의 각료에 임명하였다. 이들 반일 내각은 전 내각의 죄목을 가리고 혼란해진 나라 안을 수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우선 춘생문사건 관련자를 석방하고 가장 불만이 컸던 단발령도 각자의 자유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자기편이라고 믿었던 러시아에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이후에도 러시아와 조선은 삐걱댔고 이에 왕의 환궁을 바라는 국내 여론과 일본의 환궁 공작에 1897年 2月 20日 고종은 경운궁으로 환궁했다. 고종의 환궁 이후 더욱 고조된 국민의 자주의식은 청의 후퇴와 열강의 세력균형이라는 객관적 조건과 더불어 대한제국이 성립하는 배경이 되었다. 대한제국은 1897年 10月 광무(光武)라는 독자적인 연호의 제정과 황제즉위, 국호제정의 과정 을 거쳐 탄생하였다. 이 칭제건원(稱帝建元)의 핵심은 국왕의 칭호를 황제로 높여 자주독립국 가의 면모를 갖춘다는 데 있었다. 칭제는 을미사변 직후 일본측의 제의로 개화파정권에 의하 여 시도된 적이 있었으나 일본의 저의를 간파한 열강의 반대에 부딪친 데다 추진주체도 자주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무산되었다. 따라서 칭제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열강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여야 했다. 환궁 이후 5월경부터 전직관료·유생 등에 의하여 칭제를 건의하는 상소가 폭주하여 여론이 형성되었다. 마침내 대한제국이 탄생한 것이다.
Ⅴ 결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조선에서 일본이 전신선을 확보하기 위한 일본정부와 대본영의 뜻을 받은 전권공사 미우라 고로와 그를 이용한 이노우에가 방해가 되는 한·러의 연결고리(명성황후)를 제거하고 친일 정권의 확립을 목표로 일으킨 흉악무도한 사건이다.’라는 사실은 한국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원래는 을미사변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대응 뿐 아니라 을미사변 직후의 국제 정세를 논하려 했지만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으로 인한 러·일 갈등이 러·일 전쟁으로 까지 이어졌다는 것 또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기에 더 이상의 글은 쓰지 않았다.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재확인을 하게 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는 힘도 없는 약소국에 이리저리 치이기만 하는 굴욕의 나라라는 것과 나라의 주권이 휘둘러지는 와중에도 그것을 바로잡고자 한 여인이 이루어낸 일 또한 대단하다는 것이다. 비록 명성황 후가 구중궁궐 속에만 있어 서구열강의 이해관계를 잘 알지 못해 잘못된 ‘인아거일책’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독립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명성황후의 노력과 능력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내가 이 글을 쓸면서 을미사변에 대한 조선의 대응만큼은 정말 찾기가 힘들었다. 이것이 무슨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면 조선은 일본의 힘에 눌려 나라의 국모가 시해된 참사에도 말 한마디 꺼낼 힘조차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명성황후가 시해될 때 그 일에 대한 진상규명을 밝힌 것은 조선이 아니었다. 위에 말했듯 서구의 외상들이 증거와 증인을 모아 일본을 지탄한 것이다.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보자 우리가 지금은 강대국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서구(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다. 친미파들은 미국에 잘 보이려 되도 않는 FTA를 날치기 통과시키지를 않나, 몇 년 전에는 미국 소고기 수입으로 파문이 일어난 것은 어린 아이조차 다 아는 사실이다. 과거 친일파가 나라를 좌지우지 했듯이 이제는 친미파가 나라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내가 바라는 것은 과거 명성황후와 같은 인물이 현재에도 다시 나타나주는 것이다.
※참고자료
『명성황후 시해와 일본인』-김문자, 『명성황후는 일본정부가 시해했다』-최문형, 「일본은 왜 명성황후를 시해 했나」-성대경, 「조선 개항기의 외교관계와 수교과정 연구」-박상만, 「일본의 아시아 정책 기조와 동북아 국제정세」-염동용, 「을미사변 후 고종의 國母復와 君主專制論」-신명호, 『한일 교류의 역사』-역사교과서연구회, 역사교육연구회
그러나 자기편이라고 믿었던 러시아에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이후에도 러시아와 조선은 삐걱댔고 이에 왕의 환궁을 바라는 국내 여론과 일본의 환궁 공작에 1897年 2月 20日 고종은 경운궁으로 환궁했다. 고종의 환궁 이후 더욱 고조된 국민의 자주의식은 청의 후퇴와 열강의 세력균형이라는 객관적 조건과 더불어 대한제국이 성립하는 배경이 되었다. 대한제국은 1897年 10月 광무(光武)라는 독자적인 연호의 제정과 황제즉위, 국호제정의 과정 을 거쳐 탄생하였다. 이 칭제건원(稱帝建元)의 핵심은 국왕의 칭호를 황제로 높여 자주독립국 가의 면모를 갖춘다는 데 있었다. 칭제는 을미사변 직후 일본측의 제의로 개화파정권에 의하 여 시도된 적이 있었으나 일본의 저의를 간파한 열강의 반대에 부딪친 데다 추진주체도 자주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무산되었다. 따라서 칭제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열강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여야 했다. 환궁 이후 5월경부터 전직관료·유생 등에 의하여 칭제를 건의하는 상소가 폭주하여 여론이 형성되었다. 마침내 대한제국이 탄생한 것이다.
Ⅴ 결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조선에서 일본이 전신선을 확보하기 위한 일본정부와 대본영의 뜻을 받은 전권공사 미우라 고로와 그를 이용한 이노우에가 방해가 되는 한·러의 연결고리(명성황후)를 제거하고 친일 정권의 확립을 목표로 일으킨 흉악무도한 사건이다.’라는 사실은 한국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원래는 을미사변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대응 뿐 아니라 을미사변 직후의 국제 정세를 논하려 했지만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으로 인한 러·일 갈등이 러·일 전쟁으로 까지 이어졌다는 것 또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기에 더 이상의 글은 쓰지 않았다.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재확인을 하게 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는 힘도 없는 약소국에 이리저리 치이기만 하는 굴욕의 나라라는 것과 나라의 주권이 휘둘러지는 와중에도 그것을 바로잡고자 한 여인이 이루어낸 일 또한 대단하다는 것이다. 비록 명성황 후가 구중궁궐 속에만 있어 서구열강의 이해관계를 잘 알지 못해 잘못된 ‘인아거일책’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독립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명성황후의 노력과 능력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내가 이 글을 쓸면서 을미사변에 대한 조선의 대응만큼은 정말 찾기가 힘들었다. 이것이 무슨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면 조선은 일본의 힘에 눌려 나라의 국모가 시해된 참사에도 말 한마디 꺼낼 힘조차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명성황후가 시해될 때 그 일에 대한 진상규명을 밝힌 것은 조선이 아니었다. 위에 말했듯 서구의 외상들이 증거와 증인을 모아 일본을 지탄한 것이다.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보자 우리가 지금은 강대국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서구(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다. 친미파들은 미국에 잘 보이려 되도 않는 FTA를 날치기 통과시키지를 않나, 몇 년 전에는 미국 소고기 수입으로 파문이 일어난 것은 어린 아이조차 다 아는 사실이다. 과거 친일파가 나라를 좌지우지 했듯이 이제는 친미파가 나라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내가 바라는 것은 과거 명성황후와 같은 인물이 현재에도 다시 나타나주는 것이다.
※참고자료
『명성황후 시해와 일본인』-김문자, 『명성황후는 일본정부가 시해했다』-최문형, 「일본은 왜 명성황후를 시해 했나」-성대경, 「조선 개항기의 외교관계와 수교과정 연구」-박상만, 「일본의 아시아 정책 기조와 동북아 국제정세」-염동용, 「을미사변 후 고종의 國母復와 君主專制論」-신명호, 『한일 교류의 역사』-역사교과서연구회, 역사교육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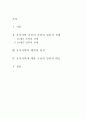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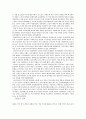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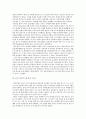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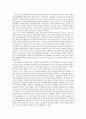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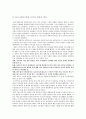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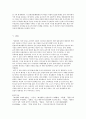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