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한국)의 환율제도와 적정 외환보유액
Ⅰ. 한국의 환율제도 변천
Ⅱ. 복수통화바스켓제도
Ⅲ. 시장평균환율제도
Ⅳ. 자유변동환율제도
Ⅴ. 적정 외환보유액
1. Machlup의 옷장이론
2. UN의 기준
3. 연간 경상지급액 기준
4. IMF권장액
5.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논란
Ⅰ. 한국의 환율제도 변천
Ⅱ. 복수통화바스켓제도
Ⅲ. 시장평균환율제도
Ⅳ. 자유변동환율제도
Ⅴ. 적정 외환보유액
1. Machlup의 옷장이론
2. UN의 기준
3. 연간 경상지급액 기준
4. IMF권장액
5.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논란
본문내용
일국의 외채규모, 수출입 규모, 외화자금의 차입 및 운용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1) Mochlup의 옷장o|론
매클럽(F. Machlup)는 \'My Wife\'s Wardrobe Theory\'(아내의 옷장이론)에서 일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엄격한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아내는 보유하고 있는 옷장속의 옷가지의 양 보다는 새로운 옷에 대한 구매욕망이 강하듯이 중앙은행당국도 외환보유액을 증가시키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야심이 일국 외환보유액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2) UN의 기준
UN은 1951년 발표 자료에서 연간 수입액의 25%가 적정 외환보유액이라고 하였다. 통상 무역의 1회전 기간이 3개월이고 3재월 분의 수입에 충당 가능한 외화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연간 경상지급액 기준
연간 경상지급액(수입액 + 무역외지급)의 20-30% 수준을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보아 무역거래 이외의 자본거래까지 고려하고 있음.
4) IMF권장액
신흥시장국은 만기 1년 이내에 상환할 단기외채에다 위기발생시 거주자들이 인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본유출 규모를 합한 금액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해외 자본유출 예상규모는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총통화(M2)의 10-20%, 자유변동환율제하의 경우 M2의 5-10%로 추정한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직 전 불과 200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 9월 외환보유액이 1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계속 증가하여 2010년 4월말 현재 2천 788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외환보유텍 구성은 미국 국채와 정부기관채 등 유가증권의 비중이 가장 높고 예치금, 국제통화기금 포지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3월말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인도에 이어 세계 6위이다.
2010년 5월말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의 구성은 유가증권(87%), 예치금(11.3%), IMF포지션(0.3%), SDR(1.3%), 금(0.03%)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환보유액은 국가경제적으로 비상식량의 의미가 있다. 비상사태가 발생시 항상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미국국채 등 안정성이 뛰어난 유가증권(약 80% 이상)과 예치금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국채는 연 이자가 매우 낮은 데다 달러 약세로 인한 손해도 만만치 않고 남유럽국가(PIGS) 채무위기로 유로화와 파운드화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적지 않았다.
외환보유액은 안정성과 수익성 기준 중 어느 것을 보다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측은 경제시스템의 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아직은 외환보유액을 더 쌓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선호한다. 반면 수익성을 증시하는 측은 지나친 외환보유액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싱가포르와 같은 반관반민 형태의 전문투자기관이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등을 조성하여 외환보유액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5)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논란
2009년 외환보유액이 2,7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재정부에 제출한 비공개 용역보고서에서 적정 외환보유액을 2, 600억 달러라고 주장하여 외환보유액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KDI보고서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외채 총액의 1.3-1.6배 정도가 적당한 외환보유액 규모라며 이는 2009년 8월 외채를 기준으로 할 때 2, 300억-2, 600억 달러라고 밝혔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만기 1년 미만이거나 상환까지 남은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외채에 대한 상환 압박이 커지는 만큼 이러한 외채 총액에다 여유자금을 합친 금액을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KDI의 이번 추정치는 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 연구소들이 적정 보유수준이라고 본 3,000억-4,000억 달러보다 크게 적은 것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만기 1년 이내 외채뿐 아니라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30%와 최근 3재월 동안의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외환으로 갖고 있어야 안전하다는 시각이다.
일부 외환전문가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외채상환이나 환을 방어용으로 준비하는 자금인 외환보유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행은 외환을 사는 데 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데 이때 한은이 지급하는 이자는 모두 외환보유비용으로 잡힌다. 2001 -2007년 통안증권 이자로만 40조 7,000억 원이 지출되었다.
보유외환 중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에 투자되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미국 국채 이자율이 통안증권 발행금리보다 크게 낮아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만큼 손실(역마진)이 발생한다. 세계경기가 회복되어 미국 국채가격이 급락하면 외환보유액에서 추가손실이 날 수 있다. 또 달러가격이 하락하면서 입는 손실도 적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가진 중국도 달러가치에 민감하며 달러가격의 불안정은 세계 각국이 외환보유액 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투기자본 통제와 관련해 KDI는 외환보유액이 이미 적정수준에 도달한 점을 감안할 때 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대비하는 통제수단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새로 내놓았다. 브라질이 자국증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2%의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자본통제방안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지로 확산되는 분위기이지만 소규모 개방국가인 한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독자적으로 자본의 이동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시아 국가들만의 기금97)을 만드는 통 국제공포를 통해 단기자금의 유출입에 대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기업, 가계 등 한국 경제주체들이 갖고 있는 총 대외채무에서 상환부담이 없는 선박수출선수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람 외채액 이상을 필요한 외환보유액으로 보기도 하였다. 예컨대 2009년 3월 한극의 실질적인 상환부담 외채는 3,269억 달러이고 당시 외환보유액은 2,063억 4천만 달러로 외환보유액은 1, 205억 6천만 달러 부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 Mochlup의 옷장o|론
매클럽(F. Machlup)는 \'My Wife\'s Wardrobe Theory\'(아내의 옷장이론)에서 일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엄격한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아내는 보유하고 있는 옷장속의 옷가지의 양 보다는 새로운 옷에 대한 구매욕망이 강하듯이 중앙은행당국도 외환보유액을 증가시키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야심이 일국 외환보유액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2) UN의 기준
UN은 1951년 발표 자료에서 연간 수입액의 25%가 적정 외환보유액이라고 하였다. 통상 무역의 1회전 기간이 3개월이고 3재월 분의 수입에 충당 가능한 외화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연간 경상지급액 기준
연간 경상지급액(수입액 + 무역외지급)의 20-30% 수준을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보아 무역거래 이외의 자본거래까지 고려하고 있음.
4) IMF권장액
신흥시장국은 만기 1년 이내에 상환할 단기외채에다 위기발생시 거주자들이 인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본유출 규모를 합한 금액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해외 자본유출 예상규모는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총통화(M2)의 10-20%, 자유변동환율제하의 경우 M2의 5-10%로 추정한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직 전 불과 200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 9월 외환보유액이 1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계속 증가하여 2010년 4월말 현재 2천 788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외환보유텍 구성은 미국 국채와 정부기관채 등 유가증권의 비중이 가장 높고 예치금, 국제통화기금 포지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3월말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인도에 이어 세계 6위이다.
2010년 5월말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의 구성은 유가증권(87%), 예치금(11.3%), IMF포지션(0.3%), SDR(1.3%), 금(0.03%)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환보유액은 국가경제적으로 비상식량의 의미가 있다. 비상사태가 발생시 항상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미국국채 등 안정성이 뛰어난 유가증권(약 80% 이상)과 예치금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국채는 연 이자가 매우 낮은 데다 달러 약세로 인한 손해도 만만치 않고 남유럽국가(PIGS) 채무위기로 유로화와 파운드화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적지 않았다.
외환보유액은 안정성과 수익성 기준 중 어느 것을 보다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측은 경제시스템의 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아직은 외환보유액을 더 쌓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선호한다. 반면 수익성을 증시하는 측은 지나친 외환보유액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싱가포르와 같은 반관반민 형태의 전문투자기관이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등을 조성하여 외환보유액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5)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논란
2009년 외환보유액이 2,7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재정부에 제출한 비공개 용역보고서에서 적정 외환보유액을 2, 600억 달러라고 주장하여 외환보유액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KDI보고서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외채 총액의 1.3-1.6배 정도가 적당한 외환보유액 규모라며 이는 2009년 8월 외채를 기준으로 할 때 2, 300억-2, 600억 달러라고 밝혔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만기 1년 미만이거나 상환까지 남은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외채에 대한 상환 압박이 커지는 만큼 이러한 외채 총액에다 여유자금을 합친 금액을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KDI의 이번 추정치는 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 연구소들이 적정 보유수준이라고 본 3,000억-4,000억 달러보다 크게 적은 것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만기 1년 이내 외채뿐 아니라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30%와 최근 3재월 동안의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외환으로 갖고 있어야 안전하다는 시각이다.
일부 외환전문가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외채상환이나 환을 방어용으로 준비하는 자금인 외환보유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행은 외환을 사는 데 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데 이때 한은이 지급하는 이자는 모두 외환보유비용으로 잡힌다. 2001 -2007년 통안증권 이자로만 40조 7,000억 원이 지출되었다.
보유외환 중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에 투자되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미국 국채 이자율이 통안증권 발행금리보다 크게 낮아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만큼 손실(역마진)이 발생한다. 세계경기가 회복되어 미국 국채가격이 급락하면 외환보유액에서 추가손실이 날 수 있다. 또 달러가격이 하락하면서 입는 손실도 적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가진 중국도 달러가치에 민감하며 달러가격의 불안정은 세계 각국이 외환보유액 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투기자본 통제와 관련해 KDI는 외환보유액이 이미 적정수준에 도달한 점을 감안할 때 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대비하는 통제수단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새로 내놓았다. 브라질이 자국증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2%의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자본통제방안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지로 확산되는 분위기이지만 소규모 개방국가인 한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독자적으로 자본의 이동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시아 국가들만의 기금97)을 만드는 통 국제공포를 통해 단기자금의 유출입에 대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기업, 가계 등 한국 경제주체들이 갖고 있는 총 대외채무에서 상환부담이 없는 선박수출선수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람 외채액 이상을 필요한 외환보유액으로 보기도 하였다. 예컨대 2009년 3월 한극의 실질적인 상환부담 외채는 3,269억 달러이고 당시 외환보유액은 2,063억 4천만 달러로 외환보유액은 1, 205억 6천만 달러 부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추천자료
 [사회복지] 시설보호아동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 시설보호아동 현황과 문제점 민주정치체제의 권력구조
민주정치체제의 권력구조 평생교육의 정의 및 특징 및 내용 평생교육의 제도적 측면
평생교육의 정의 및 특징 및 내용 평생교육의 제도적 측면 기업문화(A 맞은 레포트)
기업문화(A 맞은 레포트) [사회과학] 가족형태의 다양성
[사회과학] 가족형태의 다양성 청소년 문제행동
청소년 문제행동 아동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보고서
아동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보고서 청소년 복지론 1~10장 요약 정리
청소년 복지론 1~10장 요약 정리 [금융법, 금융환경, 자산운용규제, 금융법규제, 건전성규제, 금융지주회사, 금융회사, 규제감...
[금융법, 금융환경, 자산운용규제, 금융법규제, 건전성규제, 금융지주회사, 금융회사, 규제감... [인문과학] 정신장애여성 성폭력, 아동 성폭력, 실태 현황 및 대책 대안
[인문과학] 정신장애여성 성폭력, 아동 성폭력, 실태 현황 및 대책 대안 우리나라 역량중심의 인적자원 경영 연구 분석
우리나라 역량중심의 인적자원 경영 연구 분석 [가족구조변화][가족형태][가족기능변화][가족문제점]현대사회 가족변화,당면과제
[가족구조변화][가족형태][가족기능변화][가족문제점]현대사회 가족변화,당면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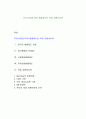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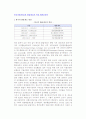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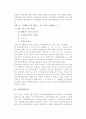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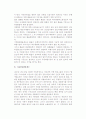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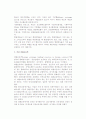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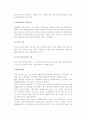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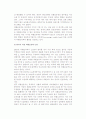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