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 새 천년 이청준을 짚어보기
1, 연구동기 - 왜 이청준과 관록인가
2. 이청준 작가 소개
@본론 - 이청준의 새 천년 작품들
1. 신화의 소설
2. 아날로그와 자연의 동화
3. 뒷모습의 산문
@결론 - 신화가 되고 신화를 남기고 가는 관록의 작가정신
#참고문헌
1, 연구동기 - 왜 이청준과 관록인가
2. 이청준 작가 소개
@본론 - 이청준의 새 천년 작품들
1. 신화의 소설
2. 아날로그와 자연의 동화
3. 뒷모습의 산문
@결론 - 신화가 되고 신화를 남기고 가는 관록의 작가정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문집 <아름다운 흉터> 외에 낸 이 산문집은 작가가 지금까지 보고 생각한 우리 삶과 세상 풍물의 표정들을 모았다고 하는 것이다. ‘지울 수 없는 것들’, 함께 살아가기‘,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등의 소제목으로 이루어져서는 현대의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나 지켜나가야 할 아날로그, 자연적 느낌이 나는 소재들을 이야기한다.
-머물고 간 자리, 우리 뒷모습(2005)
작가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낸 산문집으로 소설을 쓰는 이청준 자신과 살아가면서 얻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준비하고 기다리며, 다른 사람을 알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곳곳에 내포하며 인간과 역사의 ‘삶’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신화’와 ‘자연’으로도 말했던 그 정신을 잘 담고 있다.
@결론
- 신화가 되고 신화를 남기고 가는 관록의 작가정신
많은 사람들과 평론들은 이청준 작가를 ‘장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는 작가의 삶을 폐암 투병을 거치면서도 작품 활동에 매진했고 결국 <신화의 시대>를 마지막으로 신화와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떠나갔다.
이 장중한 서사작품을 비롯한 이청준의 글쓰기는 남은 사람들의 몫으로 전해진 바, 그의 완성되지 않은 관록은 더 크게 느껴진다. 작가는 우리 땅의 많은 인간군상을 그리면서 결국 사람과 사람의 작고 소중한 따뜻함을 원했고 그것이야말로 신화라고 보았고 그것을 장편, 동화 등으로 펴내며 그 커다란 힘을 보인 것이다. 한 시대 한 나라의 작가가 얼마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지, 이청준은 좋은 예시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높고 울창한 나뭇가지 속에 갖가지 새들이 날아들어 그 낭자한 노랫소리로 하여 나무와 새가 하나의 삶으로 어우러져 합창하는 그런 사랑의 나무를 꿈꾼다. 그게 내가 내 소설로 꿈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힘찬 생명과 삶의 나무, 혹은 자유와 사랑의 빛의 나무인 것이다…
-<머물고 간 자리, 우리 뒷모습> 中
앞의 글은 그런 이청준의 바람을 나타낸 예시 중 하나이다. 수십 년 동안 우리 땅과 인간에 대한 소중한 ‘신화’를 잊지 않고 그것을 표현한 거장의 ‘관록’은 거창하지 않으면서도 크게 느껴지는 힘을, 바로 이런 글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 탐구 또한 그런 놀랍고 멋진 힘의 일부를 들여다 본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열림원, 2003
이청준, 『꽃 지고 강물 흘러』, 문이당, 2004
이청준,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 2007
이청준, 『신화의 시대』, 2008
이청준, 『이청준의 흙으로 빚은 동화, 숭어도둑』, 2003
이청준, 『선생님의 밥그릇』, 2007
이청준, 『남도, 모든 길이 노래더라』, 아지북스, 2007
이청준, 『저 손때 묻은 이야기, 아름다운 흉터』, 열림원, 2004
이청준, 『이청준의 인생』, 열림원, 2004
이청준, 『머물고 간 자리, 우리 뒷모습』, 문이당, 2005
표정옥, 이청준 소설의 영상화 과정의 생성원리로 작용하는 원형적 신화 상상력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머물고 간 자리, 우리 뒷모습(2005)
작가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낸 산문집으로 소설을 쓰는 이청준 자신과 살아가면서 얻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준비하고 기다리며, 다른 사람을 알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곳곳에 내포하며 인간과 역사의 ‘삶’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신화’와 ‘자연’으로도 말했던 그 정신을 잘 담고 있다.
@결론
- 신화가 되고 신화를 남기고 가는 관록의 작가정신
많은 사람들과 평론들은 이청준 작가를 ‘장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는 작가의 삶을 폐암 투병을 거치면서도 작품 활동에 매진했고 결국 <신화의 시대>를 마지막으로 신화와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떠나갔다.
이 장중한 서사작품을 비롯한 이청준의 글쓰기는 남은 사람들의 몫으로 전해진 바, 그의 완성되지 않은 관록은 더 크게 느껴진다. 작가는 우리 땅의 많은 인간군상을 그리면서 결국 사람과 사람의 작고 소중한 따뜻함을 원했고 그것이야말로 신화라고 보았고 그것을 장편, 동화 등으로 펴내며 그 커다란 힘을 보인 것이다. 한 시대 한 나라의 작가가 얼마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지, 이청준은 좋은 예시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높고 울창한 나뭇가지 속에 갖가지 새들이 날아들어 그 낭자한 노랫소리로 하여 나무와 새가 하나의 삶으로 어우러져 합창하는 그런 사랑의 나무를 꿈꾼다. 그게 내가 내 소설로 꿈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힘찬 생명과 삶의 나무, 혹은 자유와 사랑의 빛의 나무인 것이다…
-<머물고 간 자리, 우리 뒷모습> 中
앞의 글은 그런 이청준의 바람을 나타낸 예시 중 하나이다. 수십 년 동안 우리 땅과 인간에 대한 소중한 ‘신화’를 잊지 않고 그것을 표현한 거장의 ‘관록’은 거창하지 않으면서도 크게 느껴지는 힘을, 바로 이런 글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 탐구 또한 그런 놀랍고 멋진 힘의 일부를 들여다 본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열림원, 2003
이청준, 『꽃 지고 강물 흘러』, 문이당, 2004
이청준,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 2007
이청준, 『신화의 시대』, 2008
이청준, 『이청준의 흙으로 빚은 동화, 숭어도둑』, 2003
이청준, 『선생님의 밥그릇』, 2007
이청준, 『남도, 모든 길이 노래더라』, 아지북스, 2007
이청준, 『저 손때 묻은 이야기, 아름다운 흉터』, 열림원, 2004
이청준, 『이청준의 인생』, 열림원, 2004
이청준, 『머물고 간 자리, 우리 뒷모습』, 문이당, 2005
표정옥, 이청준 소설의 영상화 과정의 생성원리로 작용하는 원형적 신화 상상력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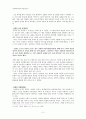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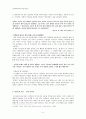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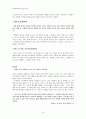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