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정치적 붕괴
3. 사회적 붕괴
4. 교육의 붕괴
5. 개혁으로 갈 발판
6. 결론
2. 정치적 붕괴
3. 사회적 붕괴
4. 교육의 붕괴
5. 개혁으로 갈 발판
6. 결론
본문내용
회는 정말 어느 한 군데 깨끗한 곳이 없는 것이다. 우리 학교를 예를 들더라도 사학비리를 일삼았던 김문기 씨에 대해 투쟁을 결의한 여러 교수님들과 총학생회 등 사학비리의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된다. 더더욱 일선에 계신 교수님들은 더욱더 힘을 내어 우리 교육이 살아있고 우리 사회가 다 썩어있지는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올수 있었으면 감사하겠다. 또한 그러한 것 자체가 교육이 아닐까 싶다.
4. 개혁으로 갈 발판
우리는 개혁(reform) 정치, 사회상의 구체제를 합법적, 점진적 절차를 밝아 고쳐 나가는 과정.
으로 가야 할 발판을 이제 마련해야만 한다. 언제까지 이러한 사회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객체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대중이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김상조 경제학박사께서 말 한 것 중에 두 번째인 기득권세력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처음부터 핵심개혁 과제에 돌입하는 것이다. 부수적인 것들을 개혁하려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추진 중에 실패한다면 핵심과제에 관한 개혁은 시도조차 해보지도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대중의 힘이 실리지 않는 다면 정부 자체적으로의 폐단은 고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은이는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나의 생각은 더 이상의 규제는 우리 경제체제를 더욱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들게 한다. 물론 나보다야 훨씬 더 많이 아시면서도 전문가의 평을 내가 반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의 주장은 주장이니까 괜찮다고 본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규제가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본다면 우리 기업구조에서 더 이상의 규제는 중소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도 있겠고, 또한 기업참여 의지도 꺽어 버릴 수 있는 동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결론
서두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이 책 속에서 읽은 비판들이 사회 대다수의 이야기라고 믿고 싶지 않다. 그 중에는 자기 소신을 갖는 정치인들도 있겠고, 진정으로 사회를 생각하는 정치인도 있겠으며, 교육을 생각하는 교육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비판할 것들이 많다는 것들은 어찌 보면 행복일수도 있겠다. 이러한 비판을 받고서 고쳐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기업의 CEO 들에게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수용하면 될 것이다. 사회적인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부터 고쳐 나가야 할 부분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총학생회는 선거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들에 대하여는 최대의 노력을 발휘하여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그래야 투표했던 유권자들도 그들을 믿고 관심을 보일 것이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실현되는 사회가 되어야 좀더 나은 사회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다. KANT는 자신의 이론을 이야기 하면서 ‘너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일수 있느냐? 는 물음을 자신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호모에티쿠스 윤리적 인간의 탄생 -김상봉-
라는 명언으로 자신에게 있어서 떳떳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것을 목적들의 나라라고 명했다. 나는 칸트의 견해를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떳떳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제제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 자신에게 떳떳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어렵더라도...
◆참고서적◆
우리는 부패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정대화 외-
호모에티쿠스 윤리적 인간의 탄생 -김상봉-
4. 개혁으로 갈 발판
우리는 개혁(reform) 정치, 사회상의 구체제를 합법적, 점진적 절차를 밝아 고쳐 나가는 과정.
으로 가야 할 발판을 이제 마련해야만 한다. 언제까지 이러한 사회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객체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대중이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김상조 경제학박사께서 말 한 것 중에 두 번째인 기득권세력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처음부터 핵심개혁 과제에 돌입하는 것이다. 부수적인 것들을 개혁하려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추진 중에 실패한다면 핵심과제에 관한 개혁은 시도조차 해보지도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대중의 힘이 실리지 않는 다면 정부 자체적으로의 폐단은 고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은이는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나의 생각은 더 이상의 규제는 우리 경제체제를 더욱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들게 한다. 물론 나보다야 훨씬 더 많이 아시면서도 전문가의 평을 내가 반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의 주장은 주장이니까 괜찮다고 본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규제가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본다면 우리 기업구조에서 더 이상의 규제는 중소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도 있겠고, 또한 기업참여 의지도 꺽어 버릴 수 있는 동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결론
서두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이 책 속에서 읽은 비판들이 사회 대다수의 이야기라고 믿고 싶지 않다. 그 중에는 자기 소신을 갖는 정치인들도 있겠고, 진정으로 사회를 생각하는 정치인도 있겠으며, 교육을 생각하는 교육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비판할 것들이 많다는 것들은 어찌 보면 행복일수도 있겠다. 이러한 비판을 받고서 고쳐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기업의 CEO 들에게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수용하면 될 것이다. 사회적인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부터 고쳐 나가야 할 부분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총학생회는 선거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들에 대하여는 최대의 노력을 발휘하여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그래야 투표했던 유권자들도 그들을 믿고 관심을 보일 것이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실현되는 사회가 되어야 좀더 나은 사회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다. KANT는 자신의 이론을 이야기 하면서 ‘너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일수 있느냐? 는 물음을 자신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호모에티쿠스 윤리적 인간의 탄생 -김상봉-
라는 명언으로 자신에게 있어서 떳떳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것을 목적들의 나라라고 명했다. 나는 칸트의 견해를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떳떳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제제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 자신에게 떳떳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어렵더라도...
◆참고서적◆
우리는 부패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정대화 외-
호모에티쿠스 윤리적 인간의 탄생 -김상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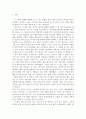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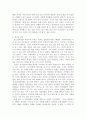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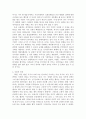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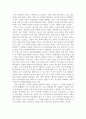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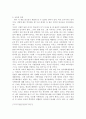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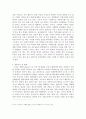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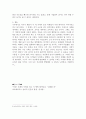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