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절대광도가 거의 같다고 하는 가정하에 잘 관측된 구성성단의 광도 peak점을 이용하고 다른 은하 구상성단의 겉보기 등급의 최대광도점을 같다고 생각해서 은하의 거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의 방법들은 standard candle인 세페이드의 관측에 매우 의존하는 것들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한가지 방법은 중력렌즈의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8) 중력렌즈효과 (Gravitational lensing effect)
한 광원에서 빛이 나와서 우리에게 도달할 때 일반상대론에 의해서(공간의 일그러짐) 큰 질량(은하,은하단)주위에서 빛이 휘는 현상이다. 그 빛이 지나가는 경로에 따라서 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어떤 빛은 더 빨리 도달하고 어떤 빛은 조금 더 늦게 도달할 것이다. 이 시간차이를 그 빛이 지나온 은하의 이론적인 질량분포와 연결시키면 거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지진파 측정으로 진원의 거리를 재듯이)
(9) S-Z effect
또 한가지 방법은 S-Z effect라고 불리는 것이다. 우주배경복사로부터 떠난 광자가 은하단 내의 에너지상태가 매우 높은 전자에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얻거나 산란되면서 변화(콤프턴 효과)하는 양을 은하단 내의 전자의 밀도의 분포와 비교, 측정함으로써 거리를 알수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우주 배경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그 세기가 같다.( 여기서 fluctuation 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해 둡시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 멀리 있는 거대한 은하단을 지나올 경우, 배경복사의 photon 들이 은하성단 안에 있는 높은 에너지의 전자들과 부딪히게 된다.( 이것을 Compton scattering 이라고 합니다.) 은하단 안의 전자들은 대개 배경복사를 이루는 photon 들보다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전자들의 에너지를 넘겨받아 에너지가 커지게 되고, 원래의 우주 배경복사 스펙트럼이, 흑체복사 스펙트럽과 비교하였을 때에 파장이 짧은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짧은 파장(높은 에너지)을 가진 photon 의 개수가 많아지고 긴 파장(낮은 에너지)를 가진 photon 의 갯수는 적어지게 된다. 이것을 SZ Effect 라고 한다.
이 때 스펙트럼이 치우치는 정도는 photon 이 전자와 부딪혀 산란할 확률에 따라서만 달라진다. 이 확률은 photon 이 은하단을 지나오는 경로의 길이, 은하단의 전자구름의 전자밀도, 부딪힐 때의 cross-section ( 이 경우는 Compton scattering cross-sectin 이라고 합니다.) 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결국, 관측되는 스펙트럼의 치우침은 은하단의 거리와는 관계가 없는 값이다. 이 값을 관측한 결과와, X-ray의 세기를 관측하여 얻은 값을 비교하면, 마치 절대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비교하여 거리 지수를 알아내어 거리를 측정하는 것처럼 은하단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 ( 뜨거운 plasma 안에서 전자와 양성자가 서로 충돌할 때, 관측되는 X-ray 의 세기는 전자밀도와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이 방법은 우주내에 있는 전자의 분포, 평균밀도, 온도등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배경복사에 비해 감소되는 양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
이 중력렌즈 효과 방법과 S-Z효과 방법은 아직까지 엄밀하게 테스트 된 적이 없지만 낮은 허블상수 값을 보여준다. 1990년대 초반 Wendy L. Freedma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의 세페이드 데이터를 가지고 Tully-Fisher relation과 표면밝기요동법을 시험해본 결과 세가지가 매우 잘 맞고 약 80km/s/Mpc의 허블상수 값의 결과가 나왔다.
천문학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우주로부터 전해오는 수많은 빛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지구와 태양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우주라는 광대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작게는 우리 태양계의 모형을 그릴 수 있고 은하들의 분포와 은하군, 은하단에 이르기까지 개괄적인 우주의 크기와 속성에 대해 좀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우주 속의 한 미물에 지나지 않은 인간이 지금껏 이뤄온 우주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와 아직 베일에 싸여 있는 문제들을 향해 도전 해보고 싶습니다.
출 처 : [인터넷] http://myhome.hanafos.com/~sinclair/frame1.htm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서론-마이클 자일릭 외
지금까지의 방법들은 standard candle인 세페이드의 관측에 매우 의존하는 것들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한가지 방법은 중력렌즈의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8) 중력렌즈효과 (Gravitational lensing effect)
한 광원에서 빛이 나와서 우리에게 도달할 때 일반상대론에 의해서(공간의 일그러짐) 큰 질량(은하,은하단)주위에서 빛이 휘는 현상이다. 그 빛이 지나가는 경로에 따라서 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어떤 빛은 더 빨리 도달하고 어떤 빛은 조금 더 늦게 도달할 것이다. 이 시간차이를 그 빛이 지나온 은하의 이론적인 질량분포와 연결시키면 거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지진파 측정으로 진원의 거리를 재듯이)
(9) S-Z effect
또 한가지 방법은 S-Z effect라고 불리는 것이다. 우주배경복사로부터 떠난 광자가 은하단 내의 에너지상태가 매우 높은 전자에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얻거나 산란되면서 변화(콤프턴 효과)하는 양을 은하단 내의 전자의 밀도의 분포와 비교, 측정함으로써 거리를 알수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우주 배경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그 세기가 같다.( 여기서 fluctuation 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해 둡시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 멀리 있는 거대한 은하단을 지나올 경우, 배경복사의 photon 들이 은하성단 안에 있는 높은 에너지의 전자들과 부딪히게 된다.( 이것을 Compton scattering 이라고 합니다.) 은하단 안의 전자들은 대개 배경복사를 이루는 photon 들보다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전자들의 에너지를 넘겨받아 에너지가 커지게 되고, 원래의 우주 배경복사 스펙트럼이, 흑체복사 스펙트럽과 비교하였을 때에 파장이 짧은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짧은 파장(높은 에너지)을 가진 photon 의 개수가 많아지고 긴 파장(낮은 에너지)를 가진 photon 의 갯수는 적어지게 된다. 이것을 SZ Effect 라고 한다.
이 때 스펙트럼이 치우치는 정도는 photon 이 전자와 부딪혀 산란할 확률에 따라서만 달라진다. 이 확률은 photon 이 은하단을 지나오는 경로의 길이, 은하단의 전자구름의 전자밀도, 부딪힐 때의 cross-section ( 이 경우는 Compton scattering cross-sectin 이라고 합니다.) 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결국, 관측되는 스펙트럼의 치우침은 은하단의 거리와는 관계가 없는 값이다. 이 값을 관측한 결과와, X-ray의 세기를 관측하여 얻은 값을 비교하면, 마치 절대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비교하여 거리 지수를 알아내어 거리를 측정하는 것처럼 은하단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 ( 뜨거운 plasma 안에서 전자와 양성자가 서로 충돌할 때, 관측되는 X-ray 의 세기는 전자밀도와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이 방법은 우주내에 있는 전자의 분포, 평균밀도, 온도등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배경복사에 비해 감소되는 양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
이 중력렌즈 효과 방법과 S-Z효과 방법은 아직까지 엄밀하게 테스트 된 적이 없지만 낮은 허블상수 값을 보여준다. 1990년대 초반 Wendy L. Freedma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의 세페이드 데이터를 가지고 Tully-Fisher relation과 표면밝기요동법을 시험해본 결과 세가지가 매우 잘 맞고 약 80km/s/Mpc의 허블상수 값의 결과가 나왔다.
천문학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우주로부터 전해오는 수많은 빛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지구와 태양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우주라는 광대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작게는 우리 태양계의 모형을 그릴 수 있고 은하들의 분포와 은하군, 은하단에 이르기까지 개괄적인 우주의 크기와 속성에 대해 좀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우주 속의 한 미물에 지나지 않은 인간이 지금껏 이뤄온 우주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와 아직 베일에 싸여 있는 문제들을 향해 도전 해보고 싶습니다.
출 처 : [인터넷] http://myhome.hanafos.com/~sinclair/frame1.htm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서론-마이클 자일릭 외
추천자료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예비보고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예비보고서 지구과학 수업을 위한 DGS의 이용
지구과학 수업을 위한 DGS의 이용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과 그 실험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과 그 실험 이상심리학의 연구방법
이상심리학의 연구방법 뉴턴의 만유인력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의 특성과 차이점
뉴턴의 만유인력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의 특성과 차이점 낙하운동과 중력가속도 측정[예비+결과]
낙하운동과 중력가속도 측정[예비+결과]  낙하운동과 중력 가속도측정 (예비 결과)
낙하운동과 중력 가속도측정 (예비 결과) [중력][중력측정][중력가속도측정][단진자][케타진자][에어트랙]중력의 가설과 중력측정 주요...
[중력][중력측정][중력가속도측정][단진자][케타진자][에어트랙]중력의 가설과 중력측정 주요... 체동학의 원리와 운동방법
체동학의 원리와 운동방법 [물리] 관성모멘트 측정
[물리] 관성모멘트 측정 일반기상역학(4-3)
일반기상역학(4-3) [상권][상권 개념][상권 종류][상권 특징][상권 획정][상권 점포][상권 조사][상권 측정]상권...
[상권][상권 개념][상권 종류][상권 특징][상권 획정][상권 점포][상권 조사][상권 측정]상권... 영유아 영양평가의 방법
영유아 영양평가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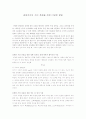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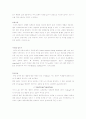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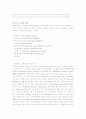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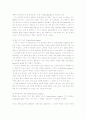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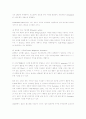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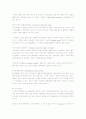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