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새만금 사업의 탄생 배경
2. 정권 교체와 새만금 사업의 앞날
3. 기계적 세계관을 벗어나야한다.
2. 정권 교체와 새만금 사업의 앞날
3. 기계적 세계관을 벗어나야한다.
본문내용
들이 방조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만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릇된 정보로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2003년 3월 20일자 <한겨레>는 1호방조제 밖인 조개미 마을 앞바다의 사진 한 장을 싣고 다음과 같이 사진 설명을 달았다.
새만금 갯벌 살아있을까?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갯벌이 사라질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우려와는 달리 1호방조제 바깥쪽으로는 너른 갯벌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전남대 전승수 교수는 "이는 계절적 요인으로 생긴 죽은 갯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부안/연합>
그러나 이곳은 본래부터 갯벌이었다. 방조제가 뻗어나간 대항리에서 해안선을 따라 변산해수욕장까지의 방조제 바깥쪽은 옛날부터 생산력이 지극히 높은 훌륭한 갯벌이었다. 그 면적은 628ha이다. 이 갯벌이 있는 해안가에서 선사시대의 유적인 패총이 발굴되었다. 조개미 패총(전라북도 기념물 제50호)이 바로 그것이다. '조개미'라는 마을 이름도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계화도 간척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곳은 백합의 서식밀도가 아주 높은 양질의 모래펄 갯벌이었다. 이곳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뻘밭에 나가면 백합이 촘촘히 들어박혀 있어 앉은 자리에서 한 바구니씩 잡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계화도 간척공사 이후 서식 밀도가 점점 줄어들었다.
자생 백합이 점점 줄어들자 이 곳에서 백합 양식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새만금 방조제가 뻗어나가면서 폐사량이 점점 늘기 시작했다. 백합이 좋아하는 모래펄 갯벌이 펄이 쌓여가면서 점차 죽은 갯벌인 죽뻘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조수에 따라 더러 모래도 휩쓸려와 쌓이기 때문에 그 속도는 느리지만 방조제로 인해 물길이 막히자 서서히 죽뻘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는 이 갯벌을 두고 "방조제 밖으로 갯벌이 새로 생긴다"며 홍보를 하고 있다. 이곳 사정을 모르는 외지인들은 농업기반공사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 농발게 게시판 허정균 씨의 글
●황금조개 '백합'이 사라진다
[속보, 사회, 지역] 2003년 04월 01일 (화) 20:26 뉴스 중앙일보
한때 수출 수산물의 대표주자로 황금조개라 불렸던 서해안의 백합(대합)이 사라져가고 있다.
1960년대 초 연간 1천2백t 가량을 채취하다 6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양식으로 70년대 초엔 8천5백t까지 쏟아졌던 백합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90년엔 1천여t으로 줄었다. 2001년 채취량은 고작 55t뿐.
고소득원으로 각광받던 백합이 이처럼 급감한 것은 어민들이 70년대 중반 백합의 씨앗 격인종패를 마구잡이로 뿌려 밀식(密植) 현상이 나타나고 기생충이 발생해 대량 폐사한 탓이다. 또 대규모 매립간척사업과 환경 오염 및 생태계 변화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양식장이 줄어든 것도 한 요인이다.
경기~충남~전북~전남에 이르는 서해안에선 30여년 동안 11만8백여㏊의 간척지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90년대 초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작되면서 전북 연안은 갯벌의 64.7%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74년 6천여㏊로 정점을 기록했던 백합 양식장은 2001년엔 1백50㏊로 크게 줄었다.
갯벌 속에서 자라 연중 채취가 가능한 백합은 5년 정도 자라면 7~10㎝ 정도로 커져 바지락보다 4~5배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 한 때는 5천여t(당시 4백여만달러)을 일본에 수출하는 등 수산물 중에선 최고의 수출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서해수산연구소 김치홍 박사는 백합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대체 어장을 조성하고, 종패의 생존율을 높이는 양식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
2003년 3월 20일자 <한겨레>는 1호방조제 밖인 조개미 마을 앞바다의 사진 한 장을 싣고 다음과 같이 사진 설명을 달았다.
새만금 갯벌 살아있을까?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갯벌이 사라질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우려와는 달리 1호방조제 바깥쪽으로는 너른 갯벌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전남대 전승수 교수는 "이는 계절적 요인으로 생긴 죽은 갯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부안/연합>
그러나 이곳은 본래부터 갯벌이었다. 방조제가 뻗어나간 대항리에서 해안선을 따라 변산해수욕장까지의 방조제 바깥쪽은 옛날부터 생산력이 지극히 높은 훌륭한 갯벌이었다. 그 면적은 628ha이다. 이 갯벌이 있는 해안가에서 선사시대의 유적인 패총이 발굴되었다. 조개미 패총(전라북도 기념물 제50호)이 바로 그것이다. '조개미'라는 마을 이름도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계화도 간척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곳은 백합의 서식밀도가 아주 높은 양질의 모래펄 갯벌이었다. 이곳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뻘밭에 나가면 백합이 촘촘히 들어박혀 있어 앉은 자리에서 한 바구니씩 잡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계화도 간척공사 이후 서식 밀도가 점점 줄어들었다.
자생 백합이 점점 줄어들자 이 곳에서 백합 양식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새만금 방조제가 뻗어나가면서 폐사량이 점점 늘기 시작했다. 백합이 좋아하는 모래펄 갯벌이 펄이 쌓여가면서 점차 죽은 갯벌인 죽뻘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조수에 따라 더러 모래도 휩쓸려와 쌓이기 때문에 그 속도는 느리지만 방조제로 인해 물길이 막히자 서서히 죽뻘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는 이 갯벌을 두고 "방조제 밖으로 갯벌이 새로 생긴다"며 홍보를 하고 있다. 이곳 사정을 모르는 외지인들은 농업기반공사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 농발게 게시판 허정균 씨의 글
●황금조개 '백합'이 사라진다
[속보, 사회, 지역] 2003년 04월 01일 (화) 20:26 뉴스 중앙일보
한때 수출 수산물의 대표주자로 황금조개라 불렸던 서해안의 백합(대합)이 사라져가고 있다.
1960년대 초 연간 1천2백t 가량을 채취하다 6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양식으로 70년대 초엔 8천5백t까지 쏟아졌던 백합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90년엔 1천여t으로 줄었다. 2001년 채취량은 고작 55t뿐.
고소득원으로 각광받던 백합이 이처럼 급감한 것은 어민들이 70년대 중반 백합의 씨앗 격인종패를 마구잡이로 뿌려 밀식(密植) 현상이 나타나고 기생충이 발생해 대량 폐사한 탓이다. 또 대규모 매립간척사업과 환경 오염 및 생태계 변화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양식장이 줄어든 것도 한 요인이다.
경기~충남~전북~전남에 이르는 서해안에선 30여년 동안 11만8백여㏊의 간척지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90년대 초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작되면서 전북 연안은 갯벌의 64.7%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74년 6천여㏊로 정점을 기록했던 백합 양식장은 2001년엔 1백50㏊로 크게 줄었다.
갯벌 속에서 자라 연중 채취가 가능한 백합은 5년 정도 자라면 7~10㎝ 정도로 커져 바지락보다 4~5배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 한 때는 5천여t(당시 4백여만달러)을 일본에 수출하는 등 수산물 중에선 최고의 수출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서해수산연구소 김치홍 박사는 백합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대체 어장을 조성하고, 종패의 생존율을 높이는 양식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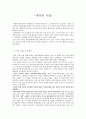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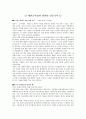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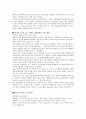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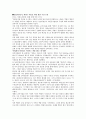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