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술-“인간이 만들어 낸 최고의 생산물”
2. 미술과 권력
2. 1. 분수- 인간과 자연의 운명적인 관계
2. 2. 초상 미술- 권력에 복종하는 미술
2. 3. 민중 미술- 권력에 저항하는 미술
2. 4. 사실과 허상
2. 5. 미술 파괴- 이중적인 권력
2. 6. 현대 소비문화와 미술- 자본과 미술
2. 7. 풍경화-자연과 미술
2. 8. 여성과 미술- 미술에서의 젠더
3. 미술- 인간이 만들어 낸 최고의 생산물
2. 미술과 권력
2. 1. 분수- 인간과 자연의 운명적인 관계
2. 2. 초상 미술- 권력에 복종하는 미술
2. 3. 민중 미술- 권력에 저항하는 미술
2. 4. 사실과 허상
2. 5. 미술 파괴- 이중적인 권력
2. 6. 현대 소비문화와 미술- 자본과 미술
2. 7. 풍경화-자연과 미술
2. 8. 여성과 미술- 미술에서의 젠더
3. 미술- 인간이 만들어 낸 최고의 생산물
본문내용
남성의 욕망에 의해 연출된 것이다. 밀폐된 공간이든지 공공의 장소에서든지 여성은 남성의 시각에 의해 통제되었다.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실존 인물인 프랑스의 유명한 창녀를 대상으로 그렸지만 관찰과 감상의 대상이 아닌 자의식을 가진 여성으로 묘사했다.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의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성의 모습은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악녀’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미술사에서 여성이 미술의 주체로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 17세기에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화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예술성보다는 그녀를 둘러싼 스캔들에 더 큰 흥미를 가졌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과 절친한 관계를 맺고 있는 스승에게 성폭행 당했다. 이 사건 이후 그녀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를 완성했다. 유디트는 성경 속의 인물로 매우 아름다운 과부라고 한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포위한 아시리아 왕 홀로페르네스 죽이고, 이스라엘을 지킨 인물이다. 아르테미시아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인 장면을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그렸다. 이 그림은 남성의 폭력에 힘으로 승리한 여성이라는 이미지의 그녀의 개인적인 사건이 중첩되어 그 의미가 배가되고 있다. 감상자들은 비장한 유디트의 모습과 고통과 놀람으로 일그러진 홀로페르네스의 얼굴을 동시에 본다. 그런데 유디트의 모습은 아르테미시아의 자화상을 너무 닮았다. 그렇다면 홀로페르네스는 그녀를 유린했던 스승일 수도 있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는 남성의 폭력에 굴하지 않으며 오히려 같은 폭력으로 남성을 극복하는 그림이다. 그러나 남성들은 그런 여성을 팜 파탈(femme fatale)로 규정하였다. 팜 파탈은 비사회적이고, 비인습적이며, 비윤리적인 존재이다. 그녀를 보는 남성들의 시각은 이중적이다. 남성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그녀들을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했다.
서구 사회의 또 다른 팜 파탈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살로메이다. 그녀의 어머니 헤로디아스는 헤롯왕과 재혼했다. 세례자 요한은 헤로디아스의 불륜을 바판하고 다녔다. 헤로디아스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헤롯왕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를 살려 둔다. 그러자 헤로디아스는 헤롯왕이 그녀의 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눈치 채고 딸을 이용하여 헤롯왕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살로메가 요한의 목을 원하자 왕은 허락한다. 이후 살로메는 서양 문화에서 악명 높은 여성으로 살아가야 했다. 귀스타브 모로는 <살로메와 세례자 요한의 목>을 그렸고, 로비스 코린트는 <살로메>를 그렸다. 코린트의 작품은 모로의 작품에 비하여 더욱 살냄새를 풍긴다.
팜 파탈은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의사를 주장할 줄 아는 여성이다. 그러나 종교와 도덕 등의 비가지적 형태의 차별은 그녀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남성들은 그녀들을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될 때에만 허용했다. 우리나라에도 팜 파탈과 유사한 ‘경국지색(傾國之色)’이라는 말이 있다. 문제는 그녀들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탐닉하는 남성에게 있지 않을까?
1970년대 여성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이 창작의 주체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여성 미술가’들은 권위적인 남성 위주의 미술사와 미술계를 비판하고, ‘여성 미술가’의 지위와 역할, 여성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했다.
오노 요코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통념과 관습적인 사고에 저항하려 했고, 주디 시카고는 <스웨덴의 크리스티나>라는 작품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여성의 신체성을 표현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만큼 모순적이었던 것은 여성의 신체였다. ‘경국지색’, ‘팜 파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신체는 욕망의 대상인 동시에 금기의 대상이었고, 쾌락과 파멸이었다. 따라서 오노 요코나 주디 시카고의 여성의 신체에 대한 관심은 기존의 사고를 비판하고 여성의 신체에 대한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려 했던 시도로 평가된다. 이처럼 여성 예술가들은 여성의 신체를 주로 다루었지만 타자의 시선이 아닌 주체적인 시선으로 재인식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활동은 개인적인 성향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후 여성 운동은 사회적인 비판성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여성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한다.
3. 미술- 인간이 만들어 낸 최고의 생산물
저자는 미술을 “인간이 만들어 낸 최고의 생산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미술은 때로는 권력에 복종하고 때로는 권력에 저항한다고 규정했다. 이 권력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문화적인 권력을 포함한다. 미술은 목판화의 형식으로 당대 사회를 반영하고, 권력에 저항했다. 미술은 또한 사회적 성(姓)인 젠더의 개념으로 남성 중심의 문화에 저항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권력인 경제적 권력에 저항하는 미술은 찾을 수 없다. 팝아트를 현대 소비 사회의 미술을 보여 주는 사례로 제시하는데, 팝아트를 자본이라는 경제적 권력에 저항했는지는 의문이다.
팝아트는 대중적인 요소를 차용했지만 그 결과는 대중이 보기도 어렵고, 대중이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이다. 팝아트의 선구자인 앤디 워홀을 보자. 그는 복제품들을 만들어 미술관에 전시함으로써 복제된 이미지가 갖고 있던 상업적, 대중적 성격을 없애고, 복제된 이미지를 예술품으로 승격시켰다. 그것은 더 이상 대중의 것이 아니었다. 팝아트는 대중적인 것에서 시작했지만 그 지향은 대중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의 질서 아래에 놓여 있다. 아니 모든 미술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자본에 저항할 수 없다.
전 지구를 할퀴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미술이나 음악의 감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태어나면서 쌓아온 교양만이 미술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 원래 음악은 소유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그것을 음원 형태로 전환해서 상품화시켰다. 그러나 고대부터 미술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며 교환가치를 지니는 상품이었다. 그래서 미술은 “인간이 만들어 낸 최고의 생산물”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낸 최고(最高)의 사치품”이다.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의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성의 모습은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악녀’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미술사에서 여성이 미술의 주체로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 17세기에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화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예술성보다는 그녀를 둘러싼 스캔들에 더 큰 흥미를 가졌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과 절친한 관계를 맺고 있는 스승에게 성폭행 당했다. 이 사건 이후 그녀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를 완성했다. 유디트는 성경 속의 인물로 매우 아름다운 과부라고 한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포위한 아시리아 왕 홀로페르네스 죽이고, 이스라엘을 지킨 인물이다. 아르테미시아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인 장면을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그렸다. 이 그림은 남성의 폭력에 힘으로 승리한 여성이라는 이미지의 그녀의 개인적인 사건이 중첩되어 그 의미가 배가되고 있다. 감상자들은 비장한 유디트의 모습과 고통과 놀람으로 일그러진 홀로페르네스의 얼굴을 동시에 본다. 그런데 유디트의 모습은 아르테미시아의 자화상을 너무 닮았다. 그렇다면 홀로페르네스는 그녀를 유린했던 스승일 수도 있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는 남성의 폭력에 굴하지 않으며 오히려 같은 폭력으로 남성을 극복하는 그림이다. 그러나 남성들은 그런 여성을 팜 파탈(femme fatale)로 규정하였다. 팜 파탈은 비사회적이고, 비인습적이며, 비윤리적인 존재이다. 그녀를 보는 남성들의 시각은 이중적이다. 남성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그녀들을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했다.
서구 사회의 또 다른 팜 파탈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살로메이다. 그녀의 어머니 헤로디아스는 헤롯왕과 재혼했다. 세례자 요한은 헤로디아스의 불륜을 바판하고 다녔다. 헤로디아스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헤롯왕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를 살려 둔다. 그러자 헤로디아스는 헤롯왕이 그녀의 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눈치 채고 딸을 이용하여 헤롯왕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살로메가 요한의 목을 원하자 왕은 허락한다. 이후 살로메는 서양 문화에서 악명 높은 여성으로 살아가야 했다. 귀스타브 모로는 <살로메와 세례자 요한의 목>을 그렸고, 로비스 코린트는 <살로메>를 그렸다. 코린트의 작품은 모로의 작품에 비하여 더욱 살냄새를 풍긴다.
팜 파탈은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의사를 주장할 줄 아는 여성이다. 그러나 종교와 도덕 등의 비가지적 형태의 차별은 그녀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남성들은 그녀들을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될 때에만 허용했다. 우리나라에도 팜 파탈과 유사한 ‘경국지색(傾國之色)’이라는 말이 있다. 문제는 그녀들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탐닉하는 남성에게 있지 않을까?
1970년대 여성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이 창작의 주체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여성 미술가’들은 권위적인 남성 위주의 미술사와 미술계를 비판하고, ‘여성 미술가’의 지위와 역할, 여성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했다.
오노 요코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통념과 관습적인 사고에 저항하려 했고, 주디 시카고는 <스웨덴의 크리스티나>라는 작품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여성의 신체성을 표현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만큼 모순적이었던 것은 여성의 신체였다. ‘경국지색’, ‘팜 파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신체는 욕망의 대상인 동시에 금기의 대상이었고, 쾌락과 파멸이었다. 따라서 오노 요코나 주디 시카고의 여성의 신체에 대한 관심은 기존의 사고를 비판하고 여성의 신체에 대한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려 했던 시도로 평가된다. 이처럼 여성 예술가들은 여성의 신체를 주로 다루었지만 타자의 시선이 아닌 주체적인 시선으로 재인식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활동은 개인적인 성향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후 여성 운동은 사회적인 비판성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여성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한다.
3. 미술- 인간이 만들어 낸 최고의 생산물
저자는 미술을 “인간이 만들어 낸 최고의 생산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미술은 때로는 권력에 복종하고 때로는 권력에 저항한다고 규정했다. 이 권력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문화적인 권력을 포함한다. 미술은 목판화의 형식으로 당대 사회를 반영하고, 권력에 저항했다. 미술은 또한 사회적 성(姓)인 젠더의 개념으로 남성 중심의 문화에 저항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권력인 경제적 권력에 저항하는 미술은 찾을 수 없다. 팝아트를 현대 소비 사회의 미술을 보여 주는 사례로 제시하는데, 팝아트를 자본이라는 경제적 권력에 저항했는지는 의문이다.
팝아트는 대중적인 요소를 차용했지만 그 결과는 대중이 보기도 어렵고, 대중이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이다. 팝아트의 선구자인 앤디 워홀을 보자. 그는 복제품들을 만들어 미술관에 전시함으로써 복제된 이미지가 갖고 있던 상업적, 대중적 성격을 없애고, 복제된 이미지를 예술품으로 승격시켰다. 그것은 더 이상 대중의 것이 아니었다. 팝아트는 대중적인 것에서 시작했지만 그 지향은 대중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의 질서 아래에 놓여 있다. 아니 모든 미술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자본에 저항할 수 없다.
전 지구를 할퀴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미술이나 음악의 감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태어나면서 쌓아온 교양만이 미술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 원래 음악은 소유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그것을 음원 형태로 전환해서 상품화시켰다. 그러나 고대부터 미술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며 교환가치를 지니는 상품이었다. 그래서 미술은 “인간이 만들어 낸 최고의 생산물”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낸 최고(最高)의 사치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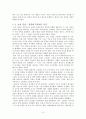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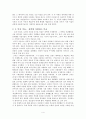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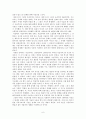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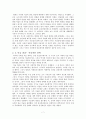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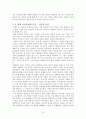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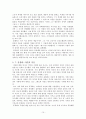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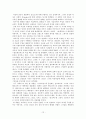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