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때 일어난다. 그래서 현재의 간질병 연구는 시스타틴 B와 세포내의 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의 조절보다는 신경전달물질과 신경세포의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스탠포드 연구팀과 헬싱키 연구팀은 그 기능과는 관계없이 EPM1에서 나타나는 이상이 있는 유전자를 발견하기 위해 고안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발작과 근육경련뿐만아니라 가벼운 치매증상을 가져오는 점진적인 신경퇴화를 유발하는 EPM1을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장 일반적인 간질병의 양상이 유전학자들에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알콜중독에서 머리에 입은 상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이 질병의 발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나이에 관계없이 질병이 나타나고 많은 다른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 양상이 병의 진단을 어렵게 하여 유전적 연관의 분석에 필요한 질병의 가계도를 만들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EPM1의 다른 특징들이 이 질병의 유전을 추적하기 용이하게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그러나, 핀란드 사람들은 200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갈때까지 비교적 작은 개체군으로부터 근친 결혼하였기 때문에 많은 유전병들의 발생이 평균빈도보다도 높게 나타난다. 레헤스조키는 "우리는 이웃과 유전자를 서로 교환한 일이 없다" 라고 말한다. 이 나라에서는 고통받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핀란드의 연구팀은 조직의 표본을 구하여 가계도를 작성할 수 있었으며 매우 정확한 분석을 통해 21번 염색체의 175,000개에 이르는 염기의 부분에 유전자 지도를 작성할 수 있었다.
그 목표가되는 부위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두 연구팀은 그 부분내의 유전자로부터 얻은 작은 절편의 염기 서열을 결정하였으며 염기 서열의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이미 알려진 유전자와 그것들을 서로 비교하였다. 스탠포드 연구팀에서 결정한 염기 서열중의 하나가 시스타틴 B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을때 그들은 다시 가계의 표본을 조사해 보았다. 마이어의 연구팀은 각각의 환자의 배혈구 세포로부터 증식된 세포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표본에 존재하는 DNA로부터 전사된 모든 RNA분자를 분리하였으며 여기에서 시스타틴 B로부터 전사된 RNA만을 다시 분리하였다. "우리는 환자들에게 시스타틴 B의 전령RNA가 결여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이 바로 조절인자라는 것을 알았다" 라고 마이어는 말한다.
이것의 바탕이 되는 유전적인 결함을 발견하기위해 마이어의 대학원 학생인 렌 페나치오는 DNA의 염기 서열을 결정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유전자가 완전히 발현된 RNA의 복사본이 결여된 것과 단백질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도록하는 것을 설명해줄 수 있는 "두 개의 돌연변이를 발견하였다" 라고 그는 말한다.
현재 연구자들은 이 단백질 분해효소 저해제의 결여가 간질병을 유발하는 이유를 밝혀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단백질은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해 본 정상적인 사람의 모든 형태의 세포에 존재하고 있다" 라고 마이어는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뇌에서만 이 단백질의 결여가 영향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준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웰시는 하나의 단서를 발견하였다. 시스타틴 B의 표적이 되는 카탭신은 라이소좀내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경세포사이의 시냅스로 신경전달물질을 방출하는 시냅토좀과 비슷한 세포내 구조물이다. 이러한 유사성에 바탕을 두고 웰시는 시스타틴 B와 간질병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시냅토좀과 라이소좀사이의 기능적인 유사성이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가 단지 "매우 호기심을 자극받았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스탠포드 연구팀과 헬싱키 연구팀은 그 기능과는 관계없이 EPM1에서 나타나는 이상이 있는 유전자를 발견하기 위해 고안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발작과 근육경련뿐만아니라 가벼운 치매증상을 가져오는 점진적인 신경퇴화를 유발하는 EPM1을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장 일반적인 간질병의 양상이 유전학자들에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알콜중독에서 머리에 입은 상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이 질병의 발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나이에 관계없이 질병이 나타나고 많은 다른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 양상이 병의 진단을 어렵게 하여 유전적 연관의 분석에 필요한 질병의 가계도를 만들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EPM1의 다른 특징들이 이 질병의 유전을 추적하기 용이하게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그러나, 핀란드 사람들은 200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갈때까지 비교적 작은 개체군으로부터 근친 결혼하였기 때문에 많은 유전병들의 발생이 평균빈도보다도 높게 나타난다. 레헤스조키는 "우리는 이웃과 유전자를 서로 교환한 일이 없다" 라고 말한다. 이 나라에서는 고통받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핀란드의 연구팀은 조직의 표본을 구하여 가계도를 작성할 수 있었으며 매우 정확한 분석을 통해 21번 염색체의 175,000개에 이르는 염기의 부분에 유전자 지도를 작성할 수 있었다.
그 목표가되는 부위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두 연구팀은 그 부분내의 유전자로부터 얻은 작은 절편의 염기 서열을 결정하였으며 염기 서열의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이미 알려진 유전자와 그것들을 서로 비교하였다. 스탠포드 연구팀에서 결정한 염기 서열중의 하나가 시스타틴 B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을때 그들은 다시 가계의 표본을 조사해 보았다. 마이어의 연구팀은 각각의 환자의 배혈구 세포로부터 증식된 세포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표본에 존재하는 DNA로부터 전사된 모든 RNA분자를 분리하였으며 여기에서 시스타틴 B로부터 전사된 RNA만을 다시 분리하였다. "우리는 환자들에게 시스타틴 B의 전령RNA가 결여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이 바로 조절인자라는 것을 알았다" 라고 마이어는 말한다.
이것의 바탕이 되는 유전적인 결함을 발견하기위해 마이어의 대학원 학생인 렌 페나치오는 DNA의 염기 서열을 결정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유전자가 완전히 발현된 RNA의 복사본이 결여된 것과 단백질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도록하는 것을 설명해줄 수 있는 "두 개의 돌연변이를 발견하였다" 라고 그는 말한다.
현재 연구자들은 이 단백질 분해효소 저해제의 결여가 간질병을 유발하는 이유를 밝혀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단백질은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해 본 정상적인 사람의 모든 형태의 세포에 존재하고 있다" 라고 마이어는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뇌에서만 이 단백질의 결여가 영향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준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웰시는 하나의 단서를 발견하였다. 시스타틴 B의 표적이 되는 카탭신은 라이소좀내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경세포사이의 시냅스로 신경전달물질을 방출하는 시냅토좀과 비슷한 세포내 구조물이다. 이러한 유사성에 바탕을 두고 웰시는 시스타틴 B와 간질병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시냅토좀과 라이소좀사이의 기능적인 유사성이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가 단지 "매우 호기심을 자극받았을 뿐"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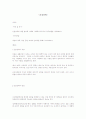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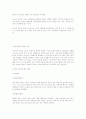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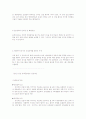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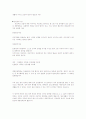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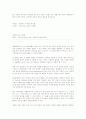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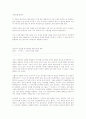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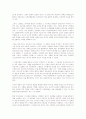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