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본문내용
is study is intended to search for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syllable in Korean. In the previous researches, it has been considered that the structure of the syllable in Korean is similar with that of English. However, there are some evidences that the syllable structure between the two languages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problem is focused on the glides. Where do the glides belong in Korean? It is true that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until now: some researchers support that the glides belong to the onset of the syllable and others to the peak of the syllable. I have found that there are much more evidences to support the former than evidences to support the latter. Therefore, in this study I conclude that the peak is more closely related to the onset than to the coda in the structure of the syllable, and that the glides belong to the peak of the syllable structure in Korean.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의 음절구조가 어떤 모습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곧 한국어의 음절구조를 계층적으로 파악했을 때 그 계층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초기의 연구들에서는 한국어의 음절구조를 영어와 같은 우분지 구조로 정의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한국어의 여러 언어현상들을 살펴볼 때 음절구조가 영어와는 같지 않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음절구조가 핵음과 두음이 먼저 결합하는 좌분지 구조라는 것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전이음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음절 두음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음절 핵음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이다. 전이음이 음절 두음에 속한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전이음이 음절 핵음에 속한다는 근거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한국어 음절구조가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는 이유는 그 음절구조를 통해서 한국어의 음운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적성이론에 의한 한국어의 제약 등급 설정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1) 그리고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도 좋은 방법론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어의 음절구조와 외국인 학습자의 모국어 음절구조를 비교, 대조함으로써 좀더 쉽고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음절구조에 대한 연구는 가치가 있다고 본다.
2장에서는 음절 단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3장에서는 한국어의 음절구조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한국어는 좌분지 구조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또한 전이음이 음절핵음에 속한다는 것을 논의할 것이다.
2. 음절 단위의 필요성
음절이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상위의 범주를 말한다. 음성학적으로 보면 한 언어를 발화할 때 전후의 음의 경계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음절은 보편적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단위에 속한다. 그러나 초기의 연구에서 음절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고, 음운현상의 기술이나 설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구조주의 음운론에서는 음절이 논의되었지만, 음운 단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초기 생성음운론에서도 음절을 음운 단위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분절음이나 경계표시로 음운현상을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다가 음절을 중요한 단위로 인식하게 된 것은 Pulgram(1970), Vennemann(1972), 그리고 Hooper(1972)와 같은 연구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음절이 음운 단위로서의 인식이 새로워짐에 따라 그 영향은 한국어 음운론에 미치게 되었고, 음운현상을 기술하는 데에도 음절이론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영향만으로 음절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아니다. 한국어는 일찍부터 음절 개념이 중시되어 온 언어였다. 한국어에서 음절에 대한 인식은 먼저 훈민정음에서 찾을 수 있다. 훈민정음에서 음운 분석의 기본 단위는 음절이었다. 초성, 중성, 종성이란 용어 자체가 하나의 음절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발화는 음절 단위로 인식되고 표기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훈민정음에 (1)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凡字必合而成音 (예의)
初中終三聲 合而成字 (합자해)
(1)은 초성, 중성, 종성이 모여 하나의 소리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이것의 개념은 음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음동화현상에서 음절이 설명의 단위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ㄱ. /국+물/ → [궁물], /잣+나무/ → [잔나무] (비음화)
ㄴ. /물+놀이/ → [물로리], /천+리/ → [철리] (유음화)
ㄷ. /눈+까지/ → [눙까지], /문+밖/ → [뭄밖] (위치동화)
(2)의 예들은 환경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발생하는 동화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때 음절은 매우 적절한 단위가 된다. 곧, 이 현상들은 음절과 음절이 만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중화현상을 음절말 제약으로 설명하면 더 효과적이다.
(3) 음절말 제약: 한국어는 음절말에 제한된 7자음만 허용한다.
ㄱ. /목/ → [목], /부엌/ → [부억], /밖/ → [박]
ㄴ. /눈/ → [눈]
ㄷ. /곧/ → [곧], /옷/ → [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의 음절구조가 어떤 모습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곧 한국어의 음절구조를 계층적으로 파악했을 때 그 계층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초기의 연구들에서는 한국어의 음절구조를 영어와 같은 우분지 구조로 정의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한국어의 여러 언어현상들을 살펴볼 때 음절구조가 영어와는 같지 않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음절구조가 핵음과 두음이 먼저 결합하는 좌분지 구조라는 것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전이음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음절 두음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음절 핵음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이다. 전이음이 음절 두음에 속한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전이음이 음절 핵음에 속한다는 근거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한국어 음절구조가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는 이유는 그 음절구조를 통해서 한국어의 음운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적성이론에 의한 한국어의 제약 등급 설정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1) 그리고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도 좋은 방법론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어의 음절구조와 외국인 학습자의 모국어 음절구조를 비교, 대조함으로써 좀더 쉽고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음절구조에 대한 연구는 가치가 있다고 본다.
2장에서는 음절 단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3장에서는 한국어의 음절구조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한국어는 좌분지 구조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또한 전이음이 음절핵음에 속한다는 것을 논의할 것이다.
2. 음절 단위의 필요성
음절이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상위의 범주를 말한다. 음성학적으로 보면 한 언어를 발화할 때 전후의 음의 경계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음절은 보편적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단위에 속한다. 그러나 초기의 연구에서 음절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고, 음운현상의 기술이나 설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구조주의 음운론에서는 음절이 논의되었지만, 음운 단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초기 생성음운론에서도 음절을 음운 단위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분절음이나 경계표시로 음운현상을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다가 음절을 중요한 단위로 인식하게 된 것은 Pulgram(1970), Vennemann(1972), 그리고 Hooper(1972)와 같은 연구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음절이 음운 단위로서의 인식이 새로워짐에 따라 그 영향은 한국어 음운론에 미치게 되었고, 음운현상을 기술하는 데에도 음절이론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영향만으로 음절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아니다. 한국어는 일찍부터 음절 개념이 중시되어 온 언어였다. 한국어에서 음절에 대한 인식은 먼저 훈민정음에서 찾을 수 있다. 훈민정음에서 음운 분석의 기본 단위는 음절이었다. 초성, 중성, 종성이란 용어 자체가 하나의 음절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발화는 음절 단위로 인식되고 표기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훈민정음에 (1)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凡字必合而成音 (예의)
初中終三聲 合而成字 (합자해)
(1)은 초성, 중성, 종성이 모여 하나의 소리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이것의 개념은 음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음동화현상에서 음절이 설명의 단위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ㄱ. /국+물/ → [궁물], /잣+나무/ → [잔나무] (비음화)
ㄴ. /물+놀이/ → [물로리], /천+리/ → [철리] (유음화)
ㄷ. /눈+까지/ → [눙까지], /문+밖/ → [뭄밖] (위치동화)
(2)의 예들은 환경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발생하는 동화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때 음절은 매우 적절한 단위가 된다. 곧, 이 현상들은 음절과 음절이 만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중화현상을 음절말 제약으로 설명하면 더 효과적이다.
(3) 음절말 제약: 한국어는 음절말에 제한된 7자음만 허용한다.
ㄱ. /목/ → [목], /부엌/ → [부억], /밖/ → [박]
ㄴ. /눈/ → [눈]
ㄷ. /곧/ → [곧], /옷/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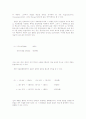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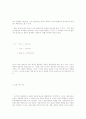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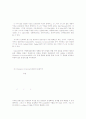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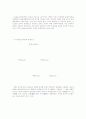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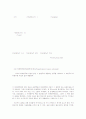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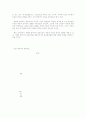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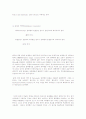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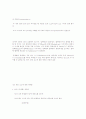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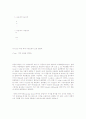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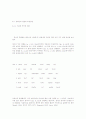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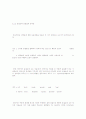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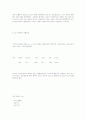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