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교회 안에 갇힌 하나님과 신앙을 향한 개혁의 기치였다면 오늘날에는 오히려 신앙과 신학과 예배가 성경 속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교회의 우위에 선 성경이 모든 성서비평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제로 우리나라 교회 현실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지는 않은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서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예배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왜 우리는 오늘날도 성경을 강조하는지, 우리에게 성서란 무엇인지 다시한번 점검할 필요를 느낀다.
제 8장에서는 각 예배 순서의 의미와 바른 집례를 설명하고 있다. 현재 예배가 습관화되고 형식적 타성에 따라 드려지고 있어서 예배자들이나 집례자나 그 진행 순서 하나 하나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비추어 개인적으로 유익한 내용이었다.
제9장과 10장의 성례전은 저자의 주장과 이해를 같이한다. 현재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세례 및 성찬이 바른 의미를 되찾고 보다 진지하고 엄숙하게 드려졌으면 한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철저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그 질을 높이는 한가지 방법이 세례교육 및 세례요건의 강화이다. 또한 성찬은 주님의 고난과 공동체라는 측면과 더불어 때로는 애찬식이라 불리는 의미에서의 감사와 축제 분위기도 곁들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성찬성례전은 지나치게 십자가 신학과 연결되어있는 듯하다. 성물도 애찬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큰 덩이에, 가득한 잔으로 나누면 좋겠다. 다만 주님의 살과 피를 합당치 못하게 먹고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일련의 준비들이 세례를 비롯한 각 예전과 훈련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11장은 설교학 개론 과정과 동일하게 중복되어 요약을 생략하였다.
제12장의 교회력과 성서일과에 따른 설교나 예전의 집례는 저자의 주장처럼 강조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나친 형식화로 치우칠 염려가 있으므로 늘 그 정신의 강조와 의미의 되새김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본서는 예배의 의미 및 내용과 역사를 균형있게 잘 설명하고 있다. 개론서의 수준으로는 상당히 자세하고도 실제적으로 기술하였다. 예배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최근 예배복고운동의 경향과 더불어 크게 발전하여 온 결과이겠지만 그 연장선에서 말씀과 성례전의 균형있는 발전을 강조하고 예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있음이 눈에 띈다.
위의 소감 및 생각과 더불어 몇가지 아쉬운 점은 개론서의 한계성을 갖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예배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이다. 개신교만으로도 선교 100주년이 훨씬 넘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 소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문제있다’는 지적보다는 구체적으로 오늘의 우리나라 교회 예배현실을 진단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최근(1999년) 개정판인 점을 감안하면 열린예배라든가 새로운 예배의 시도들에 대한 소개 및 평가작업도 있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예배갱신에 대한
제언도 곁들여야 온전한 예배학 개론서가 되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 8장에서는 각 예배 순서의 의미와 바른 집례를 설명하고 있다. 현재 예배가 습관화되고 형식적 타성에 따라 드려지고 있어서 예배자들이나 집례자나 그 진행 순서 하나 하나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비추어 개인적으로 유익한 내용이었다.
제9장과 10장의 성례전은 저자의 주장과 이해를 같이한다. 현재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세례 및 성찬이 바른 의미를 되찾고 보다 진지하고 엄숙하게 드려졌으면 한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철저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그 질을 높이는 한가지 방법이 세례교육 및 세례요건의 강화이다. 또한 성찬은 주님의 고난과 공동체라는 측면과 더불어 때로는 애찬식이라 불리는 의미에서의 감사와 축제 분위기도 곁들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성찬성례전은 지나치게 십자가 신학과 연결되어있는 듯하다. 성물도 애찬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큰 덩이에, 가득한 잔으로 나누면 좋겠다. 다만 주님의 살과 피를 합당치 못하게 먹고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일련의 준비들이 세례를 비롯한 각 예전과 훈련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11장은 설교학 개론 과정과 동일하게 중복되어 요약을 생략하였다.
제12장의 교회력과 성서일과에 따른 설교나 예전의 집례는 저자의 주장처럼 강조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나친 형식화로 치우칠 염려가 있으므로 늘 그 정신의 강조와 의미의 되새김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본서는 예배의 의미 및 내용과 역사를 균형있게 잘 설명하고 있다. 개론서의 수준으로는 상당히 자세하고도 실제적으로 기술하였다. 예배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최근 예배복고운동의 경향과 더불어 크게 발전하여 온 결과이겠지만 그 연장선에서 말씀과 성례전의 균형있는 발전을 강조하고 예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있음이 눈에 띈다.
위의 소감 및 생각과 더불어 몇가지 아쉬운 점은 개론서의 한계성을 갖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예배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이다. 개신교만으로도 선교 100주년이 훨씬 넘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 소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문제있다’는 지적보다는 구체적으로 오늘의 우리나라 교회 예배현실을 진단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최근(1999년) 개정판인 점을 감안하면 열린예배라든가 새로운 예배의 시도들에 대한 소개 및 평가작업도 있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예배갱신에 대한
제언도 곁들여야 온전한 예배학 개론서가 되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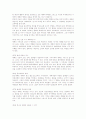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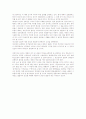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