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모반, 부도, 대불경, 불효, 불목, 불의, 내란)의 범죄에 적용되었다.사형은 삼복제에 의하여 3차례의 재판을 거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형의 확정은 반드시 임금의 재결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금형일(禁刑日)을 법으로 제정하였는데, 이는 천지의 이법을 중시하는 음양의 사상에 의한 것으로 시절과 형옥에 관한 정령을 부합시키려는 것이었다.<참고> 조선시대의 사형제도① 오살과 육시는 죄인의 머리를 벤 다음 팔, 다리, 몸둥이를 자르는 극형으로서 사람들은 형명만 들어도 몸서리를 칠 만큼 끔찍한 형벌이었고, 거열은 죄인의 팔과 다리를 4방향으로 우마에 묶어 동시에 우마를 몰음으로써 죽게 하는 형벌이다. 능지처참의 경우에는 대역사건의 국사범이나, 특히 일반에게 경계할 필요가 있는 반도덕적 범죄인에게 행해졌다.② 사사(賜死), 부관참시(剖棺斬屍): 사사는 왕명으로 독약을 마시게 하여 죽게 하는 것으로 왕족이나 현직자로서 역모에 관련되었을 때 주로 행하여졌다. 부관참시는 이미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꺼내 참형 또는 능지처사를 행하는 것이다. 연산군 시대 무오사화, 갑자사화에 연루된 자 등에 대하여 부관참시형이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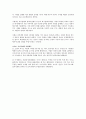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