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저 직면하게 되는 것은 주택문제와 도시빈민문제, 각종 환경문제이다. 18세기 서울도 예외없이 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서울에서는 양반사대부들이 적당한 거처가 없는 경우 에 양반신분을 무기로 평민의 집을 빼앗아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일컬어 ‘여가탈입(閭家奪入)’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금지조처는 17세기 후반 숙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정조 때인 18세기 후반에는 이러한 사태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만약 평민이 자기 집을 빼앗기게 되면 반드시 한성부나 형조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여가탈입\'의 발생은 서울 내에서의 주택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었고, ‘여가탈입\'의 소멸 또한 평민들의 주택에 대한 권리의식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이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주택이 없었으므로 청계천 주변에 움막을 짓고 살아가는 자가 많았다.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청계천 다리 밑에서 밤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처지는 당연히 걸식하거나 또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날품팔이 노동자신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조정에서도 서울 도심에서 거지들이 한겨울에 얼어죽거나 굶어죽는 경우가 빈발하자, 이에 대한 구출대책을 정례화했다. 정조 대에 이르면서 겨울철이 되면 반드시 효경교, 광통교 다리 밑의 거지떼들에게 깔고 덮고 잘 가마니와 옷가지를 지급하는 것을 관례로 삼게 된 것이다.
한편 이처럼 서울에 인구가 증가하면, 이들이 겨울철을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인 땔감 소비가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는 곧 서울 주변의 산을 헐벗게 하였고, 그 결과 산의 토사들이 하천에 계속 퇴적되어 하천바닥이 높아져서 웬만한 비만 내려도 청계천이 범람하게 되는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인구들 상당수가 청계천변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입는 피해는 연례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조는 청계천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작업을 시행했다.
1760년(영조 36)에 시행된 준천사업은 서울이 수도로 자리잡은 이래 최대의 준설공사로서, 실로 서울의 면모를 대대적으로 혁신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청계천의 흐름이 곧아졌고, 청계천변에 무질서하게 지은 집들은 대부분 헐어내져 하천변이 정비되었다. 또한 당시 파낸 흙으로 지금 동대문 안쪽에 가산(假山)을 조성하여 풍수지리상으로 서울의 동쪽이 허한 측면을 보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조 때에는 서울과 수원을 잇는 신작로를 개설하는 등 도시화에 따른 서울의 도시정비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서울의 여러 가지 변모는 근본적으로 서울 인구증가라는 현상이 원인이나 결과가 되면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이다. 그러므로 인구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야말로 장기간에 걸친 사회변동을 이해하는 관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청년사, 1996.)
조선시대 서울에서는 양반사대부들이 적당한 거처가 없는 경우 에 양반신분을 무기로 평민의 집을 빼앗아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일컬어 ‘여가탈입(閭家奪入)’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금지조처는 17세기 후반 숙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정조 때인 18세기 후반에는 이러한 사태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만약 평민이 자기 집을 빼앗기게 되면 반드시 한성부나 형조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여가탈입\'의 발생은 서울 내에서의 주택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었고, ‘여가탈입\'의 소멸 또한 평민들의 주택에 대한 권리의식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이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주택이 없었으므로 청계천 주변에 움막을 짓고 살아가는 자가 많았다.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청계천 다리 밑에서 밤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처지는 당연히 걸식하거나 또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날품팔이 노동자신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조정에서도 서울 도심에서 거지들이 한겨울에 얼어죽거나 굶어죽는 경우가 빈발하자, 이에 대한 구출대책을 정례화했다. 정조 대에 이르면서 겨울철이 되면 반드시 효경교, 광통교 다리 밑의 거지떼들에게 깔고 덮고 잘 가마니와 옷가지를 지급하는 것을 관례로 삼게 된 것이다.
한편 이처럼 서울에 인구가 증가하면, 이들이 겨울철을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인 땔감 소비가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는 곧 서울 주변의 산을 헐벗게 하였고, 그 결과 산의 토사들이 하천에 계속 퇴적되어 하천바닥이 높아져서 웬만한 비만 내려도 청계천이 범람하게 되는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인구들 상당수가 청계천변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입는 피해는 연례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조는 청계천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작업을 시행했다.
1760년(영조 36)에 시행된 준천사업은 서울이 수도로 자리잡은 이래 최대의 준설공사로서, 실로 서울의 면모를 대대적으로 혁신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청계천의 흐름이 곧아졌고, 청계천변에 무질서하게 지은 집들은 대부분 헐어내져 하천변이 정비되었다. 또한 당시 파낸 흙으로 지금 동대문 안쪽에 가산(假山)을 조성하여 풍수지리상으로 서울의 동쪽이 허한 측면을 보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조 때에는 서울과 수원을 잇는 신작로를 개설하는 등 도시화에 따른 서울의 도시정비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서울의 여러 가지 변모는 근본적으로 서울 인구증가라는 현상이 원인이나 결과가 되면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이다. 그러므로 인구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야말로 장기간에 걸친 사회변동을 이해하는 관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청년사,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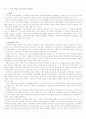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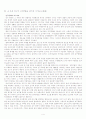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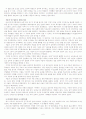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