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병과류의 의미
2. 한과의 역사
3. 한과의 종류
1) 유과류(油菓類) - 산자, 강정류
2) 과편류(菓片類)
3) 다식류(茶食類)
4) 숙실과류 (熟實菓類)
5) 유밀과류 (油密菓類)
6) 엿강정류 (박산)
7) 전과류(煎菓類)
4. 한과의 특징
1) 다양한 쓰임세
2) 뛰어난 저장성
3) 아름다운 모양
4) 의식동의 개념
5) 한과의 보관방법
5. 떡의 역사
6. 떡의 종류
1) 찌는 떡
2) 치는 떡
3) 빗는 떡
4) 지지는 떡
7. 떡의 특징
1) 정을 나누는 떡
2) 합리적인 떡
3) 약이 되는 떡
4) 생활 속의 떡
5) 절기편 떡문화
8. 느낀점
2. 한과의 역사
3. 한과의 종류
1) 유과류(油菓類) - 산자, 강정류
2) 과편류(菓片類)
3) 다식류(茶食類)
4) 숙실과류 (熟實菓類)
5) 유밀과류 (油密菓類)
6) 엿강정류 (박산)
7) 전과류(煎菓類)
4. 한과의 특징
1) 다양한 쓰임세
2) 뛰어난 저장성
3) 아름다운 모양
4) 의식동의 개념
5) 한과의 보관방법
5. 떡의 역사
6. 떡의 종류
1) 찌는 떡
2) 치는 떡
3) 빗는 떡
4) 지지는 떡
7. 떡의 특징
1) 정을 나누는 떡
2) 합리적인 떡
3) 약이 되는 떡
4) 생활 속의 떡
5) 절기편 떡문화
8. 느낀점
본문내용
자, 꿀떡, 돌개미떡, 노랄병(老辣餠), 화병, 황정병, 방험병(防險餠),
부추떡(구채병), 나단탄병
4) 지지는 떡
지지는 떡은 곡물가루를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어 기름에 지진 것인데, 빈대떡과 전병이
대표적이며, 그 종류는 재료와 조리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 지지는 떡의 종류
진달래꽃전, 국화꽃전, 화전, 계강과, 권전병과 송풍병, 석류병, 대추전병, 찰수수부꾸미,
흰색주악, 대추주악, 은행주악, 석이주악, 승검초주악, 빈대떡, 장떡, 토란병, 섭산삼,
노랑장미꽃전, 감국잎화전, 국엽전병, 백합꽃전, 옥잠화전, 돈전병, 찰전병, 일홍, 겸절병,
곤떡, 잡곡지짐, 백숙병, 진감전(眞甘煎), 치자주악, 밤주악, 꽃부꾸미, 두견전병
7. 떡의 특징
1) 정을 나누는 떡
우리 민족은 예부터 자기 집 식구만을 위하여 떡을 만들지 않았다. 천지 신명과 조상께
올리고, 또 이웃 친척 간에 서로 나누어 먹기 위해서 많은 양의 떡을 하는 여유를
보여 왔던 것이다. 우리말에 \"반기를 나누어 도르다.\"는 말이 있고, 혹은 \"반기살이\"란
말이 있는데, 잔칫집에서 손님들이 돌아갈 때 음식을 사서 보내는 이런 풍속에서도
떡이 없는 반기살이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떡은 나누어 먹는 음식에서 가장 주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또\"남의 떡에 설 쇤다.\"든가 \"얻은 떡이 두레 반이다.\"라는 속담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떡 문화의 한 단면을 엿볼 수가 있다.
2) 합리적인 떡
떡은 말하자면 \"별식\"이다. 따라서 명절이나 잔치와 같은 특별한 때에는 떡이 음식의 왕이지만
언제나 밥처럼 일상식으로 떡을 먹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일 년에 여러 차례의
명절과 생일, 그리고 제사나 잔치때 떡을 만들어, 고른 영양소를 보충하고 맛으로 즐기는
합리적인 식품으로 발달시킨 것이다.
3) 약이 되는 떡
우리 음식은 예부터 약식동원(藥食同源)의 조리법으로 발달해 왔다. 떡도 예외는 아니어서
건강 유지에 특히 도움을 주는 떡이 적잖게 개발되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흔히
\"약떡\"이라 부른다. 약떡의 종류는 매우 많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예로 든다.
먼저 \"구선왕도고(九仙王道羔0\"라는 떡은, 멥쌀가루에 연육산약백복령의이인
맥아백변두능인시상등의 한약재를 섞어, 가루가 촉촉하도록 끓인 설탕물과 굴은
내려 찐 떡이다. 몸에 이로운 약재를 이용하여 일찍부터 떡을 만들어 평상시에 먹어
왔다는 것은 선조들의 대단한 지혜인 것이다.
4) 생활 속의 떡
통과의례 통과의례란 사람이 태어나서 생을 마칠때까지 반드시 거치게 되는 몇차례의
중요한 의례를 말한다. 이러한 의례에도 응당 떡이 빠지지 않았다. 이때 해먹는 떡에는
각기 의미를 부여하여 의례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고, 또 통과의례의 풍속이 떡의
풍속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통과의례와 관련된 떡풍속들은 거개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5) 절기편 떡문화
절기 우리 조상들은 계절의 변화에 뒤질세라 사계절 24절기마다 그때그때 걸맞은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그런 풍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떡은 그 중 가장 중요한 음식의
하나여서 일년 열두달 떡을 해먹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였다. 정조다례(正朝茶禮) 흰
떡가래로 떡국을 끓여 먹었다. 설날은 천지 만물이 새로 시작되는 날인 만큼 엄숙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뜻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흰떡외에도 찹쌀, 차조, 기장, 차수수
등 찰곡식으로 만든 인절미와 거피팥, 콩가루, 검은깨, 잣가루 등으로 고물을 입힌
찰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8. 느낀점
지금까지 우리나라 병과류에 속하는 한과와 떡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옛날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지나칠수 있는 역사 우수성, 종류, 영양, 보관방법에 대하여 다시한번 알게 되었고, 한과의 경우는 요즘 우리가 평소 즐겨먹는 과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특히 영양적 면에서는 한과는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약으로 보아도 아무 손색이 없으며 종류 또한 많다. ‘왜 이런 한과가 잊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서양문화면 좋은 것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과 높은 가격면이 문제가 아닐까? 이제는 오히려 한과에 대해서 외국에 저장성이 뛰어나 무방부제이며, 아름다움과 뛰어난 영양성을 아리고, 외국에서 시식회를 열어 한과를 알려 장사를 시작한다면 꽤나 벌어 들일수 있지 않을까 싶고, 떡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사랑 받지만 외국의 주식인 빵 때문에 외국에는 끼어들 틈이 많이 없는거 같다. 하지만 떡도 한과와 마찬가지로 싼 가격에 빵과 같은 주식대용이 아닌 몸에 좋은 간편식, 과자의 개념으로 한식과 곁들여 세련된 포장으로 판매를 한다면 좋은 아이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외국에서도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음식에서 조금씩 영양을 찾아 음식의 식습관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인식의 변화가 일때야 말로 장소와 철저히 계획된 광고성을 발휘해서 때를 잘 마춘다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다. 돈을 버는 쪽이나 우리의 음식을 알리는 기회인 것이다.
꿈이란 것이 무엇인가? 목표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분야에서 명성을 얻어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닐까? 자신의 하고 있는 일이나 수단을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닐까? 그 후에 돈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다. 여러 한식의 레포트를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한식은 매력적인 요리이다. 요리사라면 누구나 꿈꾸는 “한식의 세계회” 조사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다. 괜히 한식의 세계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양과 영양면에서는 세계 어떤 나라의 음식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맛만 외국인의 입맛에 맞추면 되는 것이다. 나중에 2학년이나 한식에 익숙해지면 혹시 나도 한식의 세계화를 외치는게 아닐까 싶다. 한식은 단순한 요리법을 알고 연습해서 익숙해 진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 한식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전통에 대해서도 알고 전통에 맞추어 요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통을 알아야 그 요리에서 추구하는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에 맞추어 요리는 할 수 있는 것이다.
부추떡(구채병), 나단탄병
4) 지지는 떡
지지는 떡은 곡물가루를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어 기름에 지진 것인데, 빈대떡과 전병이
대표적이며, 그 종류는 재료와 조리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 지지는 떡의 종류
진달래꽃전, 국화꽃전, 화전, 계강과, 권전병과 송풍병, 석류병, 대추전병, 찰수수부꾸미,
흰색주악, 대추주악, 은행주악, 석이주악, 승검초주악, 빈대떡, 장떡, 토란병, 섭산삼,
노랑장미꽃전, 감국잎화전, 국엽전병, 백합꽃전, 옥잠화전, 돈전병, 찰전병, 일홍, 겸절병,
곤떡, 잡곡지짐, 백숙병, 진감전(眞甘煎), 치자주악, 밤주악, 꽃부꾸미, 두견전병
7. 떡의 특징
1) 정을 나누는 떡
우리 민족은 예부터 자기 집 식구만을 위하여 떡을 만들지 않았다. 천지 신명과 조상께
올리고, 또 이웃 친척 간에 서로 나누어 먹기 위해서 많은 양의 떡을 하는 여유를
보여 왔던 것이다. 우리말에 \"반기를 나누어 도르다.\"는 말이 있고, 혹은 \"반기살이\"란
말이 있는데, 잔칫집에서 손님들이 돌아갈 때 음식을 사서 보내는 이런 풍속에서도
떡이 없는 반기살이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떡은 나누어 먹는 음식에서 가장 주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또\"남의 떡에 설 쇤다.\"든가 \"얻은 떡이 두레 반이다.\"라는 속담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떡 문화의 한 단면을 엿볼 수가 있다.
2) 합리적인 떡
떡은 말하자면 \"별식\"이다. 따라서 명절이나 잔치와 같은 특별한 때에는 떡이 음식의 왕이지만
언제나 밥처럼 일상식으로 떡을 먹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일 년에 여러 차례의
명절과 생일, 그리고 제사나 잔치때 떡을 만들어, 고른 영양소를 보충하고 맛으로 즐기는
합리적인 식품으로 발달시킨 것이다.
3) 약이 되는 떡
우리 음식은 예부터 약식동원(藥食同源)의 조리법으로 발달해 왔다. 떡도 예외는 아니어서
건강 유지에 특히 도움을 주는 떡이 적잖게 개발되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흔히
\"약떡\"이라 부른다. 약떡의 종류는 매우 많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예로 든다.
먼저 \"구선왕도고(九仙王道羔0\"라는 떡은, 멥쌀가루에 연육산약백복령의이인
맥아백변두능인시상등의 한약재를 섞어, 가루가 촉촉하도록 끓인 설탕물과 굴은
내려 찐 떡이다. 몸에 이로운 약재를 이용하여 일찍부터 떡을 만들어 평상시에 먹어
왔다는 것은 선조들의 대단한 지혜인 것이다.
4) 생활 속의 떡
통과의례 통과의례란 사람이 태어나서 생을 마칠때까지 반드시 거치게 되는 몇차례의
중요한 의례를 말한다. 이러한 의례에도 응당 떡이 빠지지 않았다. 이때 해먹는 떡에는
각기 의미를 부여하여 의례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고, 또 통과의례의 풍속이 떡의
풍속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통과의례와 관련된 떡풍속들은 거개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5) 절기편 떡문화
절기 우리 조상들은 계절의 변화에 뒤질세라 사계절 24절기마다 그때그때 걸맞은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그런 풍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떡은 그 중 가장 중요한 음식의
하나여서 일년 열두달 떡을 해먹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였다. 정조다례(正朝茶禮) 흰
떡가래로 떡국을 끓여 먹었다. 설날은 천지 만물이 새로 시작되는 날인 만큼 엄숙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뜻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흰떡외에도 찹쌀, 차조, 기장, 차수수
등 찰곡식으로 만든 인절미와 거피팥, 콩가루, 검은깨, 잣가루 등으로 고물을 입힌
찰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8. 느낀점
지금까지 우리나라 병과류에 속하는 한과와 떡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옛날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지나칠수 있는 역사 우수성, 종류, 영양, 보관방법에 대하여 다시한번 알게 되었고, 한과의 경우는 요즘 우리가 평소 즐겨먹는 과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특히 영양적 면에서는 한과는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약으로 보아도 아무 손색이 없으며 종류 또한 많다. ‘왜 이런 한과가 잊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서양문화면 좋은 것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과 높은 가격면이 문제가 아닐까? 이제는 오히려 한과에 대해서 외국에 저장성이 뛰어나 무방부제이며, 아름다움과 뛰어난 영양성을 아리고, 외국에서 시식회를 열어 한과를 알려 장사를 시작한다면 꽤나 벌어 들일수 있지 않을까 싶고, 떡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사랑 받지만 외국의 주식인 빵 때문에 외국에는 끼어들 틈이 많이 없는거 같다. 하지만 떡도 한과와 마찬가지로 싼 가격에 빵과 같은 주식대용이 아닌 몸에 좋은 간편식, 과자의 개념으로 한식과 곁들여 세련된 포장으로 판매를 한다면 좋은 아이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외국에서도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음식에서 조금씩 영양을 찾아 음식의 식습관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인식의 변화가 일때야 말로 장소와 철저히 계획된 광고성을 발휘해서 때를 잘 마춘다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다. 돈을 버는 쪽이나 우리의 음식을 알리는 기회인 것이다.
꿈이란 것이 무엇인가? 목표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분야에서 명성을 얻어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닐까? 자신의 하고 있는 일이나 수단을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닐까? 그 후에 돈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다. 여러 한식의 레포트를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한식은 매력적인 요리이다. 요리사라면 누구나 꿈꾸는 “한식의 세계회” 조사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다. 괜히 한식의 세계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양과 영양면에서는 세계 어떤 나라의 음식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맛만 외국인의 입맛에 맞추면 되는 것이다. 나중에 2학년이나 한식에 익숙해지면 혹시 나도 한식의 세계화를 외치는게 아닐까 싶다. 한식은 단순한 요리법을 알고 연습해서 익숙해 진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 한식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전통에 대해서도 알고 전통에 맞추어 요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통을 알아야 그 요리에서 추구하는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에 맞추어 요리는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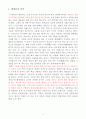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