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베트인들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달라이 라마의 傳統이 어떻게 전개 될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달라이 라마의 政治 宗敎적 指導力이 더 강력해 질 수도 있으며, 달라이 라마가 宗敎적 지도指導者만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中國의 자치구로서 存在하는 티베트가 中國으로부터 獨立하기 위해서는 前者가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漢族의 지속적인 流入으로 自治區의 성격이 옅어지는 현 상황으로써는 後者의 可能性도 무시할 수 없다. 각 文化의 相對性과 獨自性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傳統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歷史의 추세로 보면 精緻와 宗敎는 서로 분리되어 각자의 길로 나아가는 방향을 選擇하는 모습을 보인다. 他者로서 바라보기에는 그러한 歷史의 추세가 바람직한 方法으로 보이기도 하며 많은 危險性을 내포하고 있는 티베트의 傳統이 고루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티베트 인들에게 있어 正敎一致라는 전통의 고수는 나라의 生存과 관련된 문제일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過程도 必要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外勢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佛敎를 이용했던적이 있지 않은가.
과거 大部分의 나라들이 政治와 宗敎의 합일 過程과 함께 그것의 弊端도 겪었으며 분화되는 過程도 經驗하였다. 티베트도 달라이 라마라는 正敎一致의 제도는 계속 存在해 왔지만 실제적 역할 모습은 正敎一致와 분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보여왔다. 티베트도 점차 世俗化 되는 과정에서 달라이 라마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亡命政府를 통해 非暴力 抵抗運動을 벌이는데 正敎一致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듯 하다.
과거 大部分의 나라들이 政治와 宗敎의 합일 過程과 함께 그것의 弊端도 겪었으며 분화되는 過程도 經驗하였다. 티베트도 달라이 라마라는 正敎一致의 제도는 계속 存在해 왔지만 실제적 역할 모습은 正敎一致와 분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보여왔다. 티베트도 점차 世俗化 되는 과정에서 달라이 라마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亡命政府를 통해 非暴力 抵抗運動을 벌이는데 正敎一致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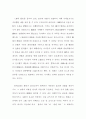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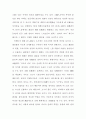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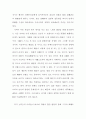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