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하늘은 새하얗고 나무와 나뭇가지와 대지는 온통 거멓다. (…) 다시 다른 대목. 이번에는 소리가 먼저다. 바이올린의 미세한 떨림이 캄캄한 구덩이 속에서 올라왔다. (…) 한 남자가 언덕을 구르듯이 허둥지둥 내려왔다. 화면 앞으로 나오는 걸 보니 그는 형이다. 흰머리에 허리가 앞으로 구부정한 요즈음의 모습이었다. 그는 괭이자루를 한손에 잡고 땅에 질질 끌면서 언덕을 내려왔다. (…) 형은 짐승처럼 껄떡이며 물을 마셨다. 그가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가까운 곳에서 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형은 무릎을 굽힌 채로 상체를 펴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기도를 하려는 걸까. 황석영, 《손님》, 창비. 8~9쪽
두 번째 꿈은 요섭의 경험으로 인한 꿈이며, 세 번째는 요섭의 상상이다. 그리고 이 장면은 후에 요섭과 요한의 회상형식으로 다시 등장한다.(226~243쪽) 요한이 강미애와 홍정숙을 죽인 것은 사실이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십년 뒤 기도를 했냐는 요섭의 질문에 요한은 그랬더라고 답한다. 요섭의 꿈은 사실과 다른, 그의 무의식에 자리한 원초적 죄의식과 형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적 갈등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꿈이란 무의식속에서 억압된 것이 전의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출되는 것이다. 나병철, 《환상과 리얼리티》,문예출판사, 87쪽
그때의 경험은 요섭으로 하여금 형 세대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오연경, 「‘식인(食人)’ 주체와 유령들 -황석영의 『손님』론」,150쪽
요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꿈에서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기도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요한의 상징계에 일어난 균열의 틈새에 꿈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헛것들을 보내고 난 이후로 마지막으로 꾼 꿈에서는 더 이상 괭이를 든 형도 천연두에 걸린 아이도 등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몹시 평화로운 마을의 정경이 드러나는데 이는 요섭이 헛것을 통해 대화를 함으로 인해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결론
<무진기행>은 60년대 작품이지만 30년대 모더니즘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은 현실에서 유리되어 실재계에 존재하려는 욕망을 보인다. 하지만 모더니즘 문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물이 상징계로 회귀할 수 밖에 없음을 말하며 개인의 모나드적 특성을 강조한다. 김승옥 소설에서는 전후세대의 관념적 성향에 대한 부정, 문학의 예술적 자율성획득을 지향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그리고 에피소드의 나열, 응집성이 배제된 문단의 배열 등으로 인해 삶의 파편화와 개인의 단자화가 작품으로 형상화된다. 김승옥의 소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과 함께 1960년대 문학의 세력장을 형성하였고, 1960년대에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에 더불어 4019세대의 소설과 전후세대의 소설이 공존하고 대립하게 되었다. 임경순, 「김승옥 소설의 모더니즘적 특성에 대한 연구」,246쪽
또한 한반도가 반으로 갈라진지 50년이 넘어가는 요즈음, 황석영의 《손님》은 독자로 하여금 화해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무속신앙으로 나타나는 환상의 서사는 리얼리즘의 형식을 통해 더욱 사실성을 지니게 되며 그것으로 인해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로 인해 갈등하던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대화와 화해는 ‘손님’으로 비유되는 서구적 이념을 타파하는 탈식민지적인 특징을 보이고, 시작과 끝을 꿈이라는 환상적 요소로 맺음으로 환상적 리얼리즘의 형식을 잘 드러낸다.
* 참고문헌
나병철, 《환상과 리얼리티》,문예출판사
김승옥 이태동. <작가와 함께 대화로 읽는 무진기행>, 지식더미
황석영, 《손님》,창비
노유경, 「<무진기행>의 시나리오 전환 양상 연구」
김명석,「김승옥문학의 감수성과 일상성」
강운석, 「김승옥 소설에 내재된 현대성의 세 가지 층위」
박정현, 「<무진기행>의 프로이트적 접근-문학교과 내에서의 예비적 고찰」
임경순, 「김승옥 소설의 모더니즘적 특성에 대한 연구」
최병덕, 「황석영, ‘신명(神明)’으로의 소설 쓰기 - 장편소설『손님』을 중심으로」
김정희, 「황석영의 『손님』론 -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연경, 「‘식인(食人)’ 주체와 유령들 -황석영의 『손님』론」
위키백과 - 황석영 (http://ko.wikipedia.org/wiki/%ED%99%A9%EC%84%9D%EC%98%81)
두 번째 꿈은 요섭의 경험으로 인한 꿈이며, 세 번째는 요섭의 상상이다. 그리고 이 장면은 후에 요섭과 요한의 회상형식으로 다시 등장한다.(226~243쪽) 요한이 강미애와 홍정숙을 죽인 것은 사실이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십년 뒤 기도를 했냐는 요섭의 질문에 요한은 그랬더라고 답한다. 요섭의 꿈은 사실과 다른, 그의 무의식에 자리한 원초적 죄의식과 형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적 갈등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꿈이란 무의식속에서 억압된 것이 전의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출되는 것이다. 나병철, 《환상과 리얼리티》,문예출판사, 87쪽
그때의 경험은 요섭으로 하여금 형 세대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오연경, 「‘식인(食人)’ 주체와 유령들 -황석영의 『손님』론」,150쪽
요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꿈에서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기도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요한의 상징계에 일어난 균열의 틈새에 꿈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헛것들을 보내고 난 이후로 마지막으로 꾼 꿈에서는 더 이상 괭이를 든 형도 천연두에 걸린 아이도 등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몹시 평화로운 마을의 정경이 드러나는데 이는 요섭이 헛것을 통해 대화를 함으로 인해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결론
<무진기행>은 60년대 작품이지만 30년대 모더니즘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은 현실에서 유리되어 실재계에 존재하려는 욕망을 보인다. 하지만 모더니즘 문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물이 상징계로 회귀할 수 밖에 없음을 말하며 개인의 모나드적 특성을 강조한다. 김승옥 소설에서는 전후세대의 관념적 성향에 대한 부정, 문학의 예술적 자율성획득을 지향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그리고 에피소드의 나열, 응집성이 배제된 문단의 배열 등으로 인해 삶의 파편화와 개인의 단자화가 작품으로 형상화된다. 김승옥의 소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과 함께 1960년대 문학의 세력장을 형성하였고, 1960년대에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에 더불어 4019세대의 소설과 전후세대의 소설이 공존하고 대립하게 되었다. 임경순, 「김승옥 소설의 모더니즘적 특성에 대한 연구」,246쪽
또한 한반도가 반으로 갈라진지 50년이 넘어가는 요즈음, 황석영의 《손님》은 독자로 하여금 화해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무속신앙으로 나타나는 환상의 서사는 리얼리즘의 형식을 통해 더욱 사실성을 지니게 되며 그것으로 인해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로 인해 갈등하던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대화와 화해는 ‘손님’으로 비유되는 서구적 이념을 타파하는 탈식민지적인 특징을 보이고, 시작과 끝을 꿈이라는 환상적 요소로 맺음으로 환상적 리얼리즘의 형식을 잘 드러낸다.
* 참고문헌
나병철, 《환상과 리얼리티》,문예출판사
김승옥 이태동. <작가와 함께 대화로 읽는 무진기행>, 지식더미
황석영, 《손님》,창비
노유경, 「<무진기행>의 시나리오 전환 양상 연구」
김명석,「김승옥문학의 감수성과 일상성」
강운석, 「김승옥 소설에 내재된 현대성의 세 가지 층위」
박정현, 「<무진기행>의 프로이트적 접근-문학교과 내에서의 예비적 고찰」
임경순, 「김승옥 소설의 모더니즘적 특성에 대한 연구」
최병덕, 「황석영, ‘신명(神明)’으로의 소설 쓰기 - 장편소설『손님』을 중심으로」
김정희, 「황석영의 『손님』론 -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연경, 「‘식인(食人)’ 주체와 유령들 -황석영의 『손님』론」
위키백과 - 황석영 (http://ko.wikipedia.org/wiki/%ED%99%A9%EC%84%9D%EC%9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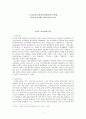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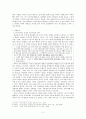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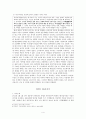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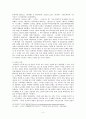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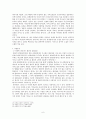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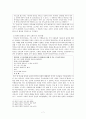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