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본론
가. 둥글둥글한 외할머니
나. 낙원 속의 현실
다. 그리운 강
라. 스스로 걷는 모랫길
3.결론 : 길모퉁이를 돌면, 다시 대각선으로 밀려난 낯선 강변
2.본론
가. 둥글둥글한 외할머니
나. 낙원 속의 현실
다. 그리운 강
라. 스스로 걷는 모랫길
3.결론 : 길모퉁이를 돌면, 다시 대각선으로 밀려난 낯선 강변
본문내용
하지도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타인과 말을 하지도 않고, 마을 아이들처럼 괴성을 지르며 감정을 공유하지도 않는다.) ‘마녀의 솥’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으로 들어간 곳에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와 낙원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강으로 가는 길은 ‘수박이 무서워 보이는’ 길이었다.
커다란 의미를 두지 않고 사유한다면 굉장히 재미있을 이 두 장면은, 작품을 아주 흥미롭게 만든다. 어차피 경험해야 하는 통과점을 향해 걸어가는 길. 통과점도 지나가면 내가 걸어 온 길이 될 터인데, 굳이 그곳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확연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두고 묘사한 작가의 의도가 궁금해지는 장면이다.
사건의 인과를 위해 부득이하게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이렇게 가끔씩 의외의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소설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작가가 삭제하는 장면을 어떤 작가는 공을 들여 묘사하는 것을 보면, 작가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주의적 해석도 어느 정도의 정당성은 담보하는 것처럼 보인다.
3.결론: 길모퉁이를 돌면, 다시 대각선으로 밀려난 낯선 강변
고대 그리스인들이 묘사한 저승에는 다섯 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한다. 죽은 영혼들은 강을 건너며 지난 삶을 회상하고, 후회하고 지난 업보들을 정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이것은 동양신화에서도 마찬가지다. 바리데기는 죽은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저승의 강을 건넜다.
고대로부터 강은 ‘이곳’과 ‘저곳’을 가르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강으로 갈라지는 두 개의 공간은 대개 정반대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승이라는 삶의 공간과 저승이라는 죽음의 공간. 작품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징이 나타난다. 주인공이 있던 집은 지겹고 탈출하고 싶은 공간이고, 강이 있는 외할머니의 집은 자신이 꿈꾸던 공간이다.
두 공간의 대립되는 속성 때문에, 이야기 속에는 강을 건너면 안 된다는 금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주인공들은 이 금기를 반드시 어긴다. 금기를 어긴 주인공들에게 따르는 대가는 ‘변화’다. 강을 건너기 전의 나와, 건넌 후의 나는 변해있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나를 예뻐해준 외할머니, 강을 함께 건넌 삼촌, 천국 같은 강변마을의 기억이 선명히 새겨진다. 그러나 엄마는 외할머니 댁의 기억을 억압하며 금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작가의 수상소감대로, “길모퉁이를 돌면, 다시 대각선으로 밀려난 낯선 강변”처럼 기억은 엄마의 금기 때문에 멀어질 듯하다. 그러나 기억은 대각선으로 밀려났을 뿐, 눈앞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담글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존재들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인공은 강 너머를 동경하고 결국 강을 건넜다. 건너왔을 때의 강물과 돌아갈 때의 강물이 다르듯, 건너왔을 때의 주인공과 돌아갈 때의 주인공은 다르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변화했음을 느끼며 소설은 끝난다. 전경린의 <강변마을>은 강 건너기 모티프를 차용한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커다란 의미를 두지 않고 사유한다면 굉장히 재미있을 이 두 장면은, 작품을 아주 흥미롭게 만든다. 어차피 경험해야 하는 통과점을 향해 걸어가는 길. 통과점도 지나가면 내가 걸어 온 길이 될 터인데, 굳이 그곳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확연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두고 묘사한 작가의 의도가 궁금해지는 장면이다.
사건의 인과를 위해 부득이하게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이렇게 가끔씩 의외의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소설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작가가 삭제하는 장면을 어떤 작가는 공을 들여 묘사하는 것을 보면, 작가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주의적 해석도 어느 정도의 정당성은 담보하는 것처럼 보인다.
3.결론: 길모퉁이를 돌면, 다시 대각선으로 밀려난 낯선 강변
고대 그리스인들이 묘사한 저승에는 다섯 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한다. 죽은 영혼들은 강을 건너며 지난 삶을 회상하고, 후회하고 지난 업보들을 정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이것은 동양신화에서도 마찬가지다. 바리데기는 죽은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저승의 강을 건넜다.
고대로부터 강은 ‘이곳’과 ‘저곳’을 가르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강으로 갈라지는 두 개의 공간은 대개 정반대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승이라는 삶의 공간과 저승이라는 죽음의 공간. 작품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징이 나타난다. 주인공이 있던 집은 지겹고 탈출하고 싶은 공간이고, 강이 있는 외할머니의 집은 자신이 꿈꾸던 공간이다.
두 공간의 대립되는 속성 때문에, 이야기 속에는 강을 건너면 안 된다는 금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주인공들은 이 금기를 반드시 어긴다. 금기를 어긴 주인공들에게 따르는 대가는 ‘변화’다. 강을 건너기 전의 나와, 건넌 후의 나는 변해있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나를 예뻐해준 외할머니, 강을 함께 건넌 삼촌, 천국 같은 강변마을의 기억이 선명히 새겨진다. 그러나 엄마는 외할머니 댁의 기억을 억압하며 금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작가의 수상소감대로, “길모퉁이를 돌면, 다시 대각선으로 밀려난 낯선 강변”처럼 기억은 엄마의 금기 때문에 멀어질 듯하다. 그러나 기억은 대각선으로 밀려났을 뿐, 눈앞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담글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존재들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인공은 강 너머를 동경하고 결국 강을 건넜다. 건너왔을 때의 강물과 돌아갈 때의 강물이 다르듯, 건너왔을 때의 주인공과 돌아갈 때의 주인공은 다르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변화했음을 느끼며 소설은 끝난다. 전경린의 <강변마을>은 강 건너기 모티프를 차용한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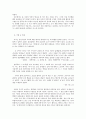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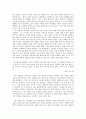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