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스피노자 생애와 저작
2. 데카르트 비판
3. 학문 방법론의 특징과 인식의 종류
4.신에 대하여..
1)신이란 실체 2)신 즉 자연
5.정신과 육체..그들의 평행선
6.행복이란 무엇인가
1)자유와 필연성 2)신에 대한 지적사랑
3)자유인의 삶
7.스피노자의 의의
1)스피노자의 문제점
2)스피노자의 현재적 의의
2. 데카르트 비판
3. 학문 방법론의 특징과 인식의 종류
4.신에 대하여..
1)신이란 실체 2)신 즉 자연
5.정신과 육체..그들의 평행선
6.행복이란 무엇인가
1)자유와 필연성 2)신에 대한 지적사랑
3)자유인의 삶
7.스피노자의 의의
1)스피노자의 문제점
2)스피노자의 현재적 의의
본문내용
여부를 묻고 있다고 믿습니다 ; 이것은 단지 형식적인 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르보 달론느(Mme Revault d\'Allonnes) ― 당신은 스피노자에게서 정치적인 과정이 매개의 과정이라는 관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기에서, 당신이 한편으로 제도화 과정과 헤겔적 용어의 의미에서 매개를 동일시하는 한, 어떤 애매함을 즐기는 것 아닌가요? 달리 말하면, 나는 스피노자 자신의 텍스트 안에서는, 제도를 벗어난 구성적인 동역학을 작동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정확한 예로서 당신이 당신의 책, {야생적 별종}에서 인용한―내가 생각하기엔― 한 텍스트를 취할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이것을 쓴 {정치학 논고}의 9장이 중요합니다 : \"네덜란드인들은 자유로운 민중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기초들 위에 그것을 재건설하기 위해 달리 생각하지 않은채, 백작을 퇴위시키고, 그 정치체를 제거시키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모든 구성원들이 그냥 존속하도록 내버려두었고, 따라서 네덜란드의 백작령은 백작 없이 지속되었다. 마치 머리 없는 신체처럼, 마치 체제의 이름 없는 국가 자체처럼 말이다.\" 특수한 예로서, 이 예를 다시취하면, 이것은 진정으로 다중의 코나투스가 정치적인 코나투스가 되기 위해서는, ―비록 다중의 직접적인(무매개적인) 현존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제도들을 통해 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네그리는 스피노자는 제도주의자도, 반-제도주의자도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정치학 논고}의 모든 이 경로에, 민주주의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훨씬 넓은 정치 체제들의 현상학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극히 중요한 것,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인 한에서 그 문제가 제기하는 지점에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그 문제는 형식적 가능성 그리고 제도들을 경유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배제하지 않는다 ; 문제는 이 제도들이 구성되는 것이어야하며, 그들의 존재 안에서 해방 과정을 되풀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학의 규범적인 테마 그리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분석들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한편으론, 체제들의 구성적 역능과 제도적인 형식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론, 바깥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병렬되고, 부과되는 한계들의 이론을 발견한다. 이것이 정확히 한나 아렌트의 한계들 중 하나이다 : 그녀가 적용하는 전망 안에서(그것은 혁명의 형상과도, 민주주의 형상과도 관련되어 있다), 칸트의 초월적인 셰마는 매번 형성 과정의 급진성을 가로막기 위해 다시 끼워넣어진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네그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나는 하이데거적인 존재론적 결정의 공백 안에서, 나에게는 특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극히 강력하게 보이는 급진적인 힘(force), 스피노자적 역능에 대한 지지를 느낀다.
크리스토폴리니 ― 나는 개인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피노자에게서 말해야하는 것은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윤리적인 주체에 대해서입니다. 명백히, 이 첫 번째 개념[개인]은 우리로 하여금 맥퍼슨의 소유권적 개인주의를, 로크적인 전통 안에 있는 개인의 관념을, 그의 시간들, 그의 죽음과 소유에 대한 강박관념 속에서 고립된 이러한 개인을 참조하게 만듭니다. 스피노자에게서 전복적인 것, 그리고 네그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것은 내가 방금 지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인에 대한 정의, 즉 그의 변용성, 욕망, 기쁨, 자유에 의해 표식되는, 운동과 정지의 관계들의 전체로서의 개인입니다. 나의 질문은 따라서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이라는 스피노자의 정의(그리고 {윤리학} 2부와 3부 안에서 우리가 읽혀졌던 것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당신은 개인과 윤리적 주체 사이의 대립을 바라봅니까 아닙니까?
네그리 ― 나로서는, {윤리학} 3부의 독해 속에는 나를 항상 전복시켰던 순간이 있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욕망, 사랑, 슬픔을 개입시키면서 작업했습니다 ; 그러나 이로부터 우리는 슬픔을 걷어냅니다. 바로 이것이 개인과 윤리적 주체 사이의 관계입니다 : 윤리적 주체는 사랑이 욕망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에 시작된다. 슬픔이 사라지는 순간에, 기쁨과 사랑의 관계는 서로 전도되며, 기쁨 자체가 더 많은 어떤 것이 됩니다. 2부에서 3부로의 이행은 따라서, 내가 보기엔 사랑의 순간의, 윤리적 순간의 이러한 과잉(surabondance) 위에 세워집니다.
발리바르 ― 당신은 오늘 자주 \"존재의 충만함(la pl nitude de l\' tr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존재(l\' tr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반-스피노자주의적인 것이 아닌지 자문해봅니다. 당신은, 사실상, 당신이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헤겔적이고 하이데거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스피노자가 전적으로 \"존재의 충만함\" 이나 \"존재의 변하기 쉬움(la versalit de l\' tre)\" 같은 표현, 즉 결국 존재를 재도입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실체가 어떤(un) 무한한 존재 (우리[프랑스] 번역에서 관사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라고 말한다 ; 그러나 \"존재\"에 대해 말하는 것, 이것은 실체의 (범신론적인) 신학화를 재구축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은 스피노자 자신이 이런 종류의 전개에 보냈던 격렬한 비판의 타격에 쓰러지는 것 아닌가요?
네그리는 그가 존재의 충만함에 대해 말할 때, 우리의 세계가 바로 이러한 충만함, 이러한 지평이라고 대답한다. 이 지평적인 무한이야말로 실재, 다양(multiple), 다변(vari )으로 충만해있으며, (외연적인 그리고 내포적인 의미에서) 정확히 무한하다. 이것이 오히려 다른 것보다 하이데거적이라고? ― 네그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슈레이는 마지막으로 네그리에게, 발리바르가 방금 오히려 \"어떤 존재의 충만함(pl nitude d\' tre)\"이라고 말하면서 정식화한 반대를 피해갈 수 있다고 그가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를 묻는다. 그 질문은 사실상 불가피하게 실체의 실사적인 독해―실사의 문법적인 의미에서―가 재도입된 관사의 채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
르보 달론느(Mme Revault d\'Allonnes) ― 당신은 스피노자에게서 정치적인 과정이 매개의 과정이라는 관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기에서, 당신이 한편으로 제도화 과정과 헤겔적 용어의 의미에서 매개를 동일시하는 한, 어떤 애매함을 즐기는 것 아닌가요? 달리 말하면, 나는 스피노자 자신의 텍스트 안에서는, 제도를 벗어난 구성적인 동역학을 작동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정확한 예로서 당신이 당신의 책, {야생적 별종}에서 인용한―내가 생각하기엔― 한 텍스트를 취할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이것을 쓴 {정치학 논고}의 9장이 중요합니다 : \"네덜란드인들은 자유로운 민중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기초들 위에 그것을 재건설하기 위해 달리 생각하지 않은채, 백작을 퇴위시키고, 그 정치체를 제거시키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모든 구성원들이 그냥 존속하도록 내버려두었고, 따라서 네덜란드의 백작령은 백작 없이 지속되었다. 마치 머리 없는 신체처럼, 마치 체제의 이름 없는 국가 자체처럼 말이다.\" 특수한 예로서, 이 예를 다시취하면, 이것은 진정으로 다중의 코나투스가 정치적인 코나투스가 되기 위해서는, ―비록 다중의 직접적인(무매개적인) 현존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제도들을 통해 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네그리는 스피노자는 제도주의자도, 반-제도주의자도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정치학 논고}의 모든 이 경로에, 민주주의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훨씬 넓은 정치 체제들의 현상학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극히 중요한 것,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인 한에서 그 문제가 제기하는 지점에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그 문제는 형식적 가능성 그리고 제도들을 경유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배제하지 않는다 ; 문제는 이 제도들이 구성되는 것이어야하며, 그들의 존재 안에서 해방 과정을 되풀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학의 규범적인 테마 그리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분석들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한편으론, 체제들의 구성적 역능과 제도적인 형식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론, 바깥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병렬되고, 부과되는 한계들의 이론을 발견한다. 이것이 정확히 한나 아렌트의 한계들 중 하나이다 : 그녀가 적용하는 전망 안에서(그것은 혁명의 형상과도, 민주주의 형상과도 관련되어 있다), 칸트의 초월적인 셰마는 매번 형성 과정의 급진성을 가로막기 위해 다시 끼워넣어진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네그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나는 하이데거적인 존재론적 결정의 공백 안에서, 나에게는 특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극히 강력하게 보이는 급진적인 힘(force), 스피노자적 역능에 대한 지지를 느낀다.
크리스토폴리니 ― 나는 개인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피노자에게서 말해야하는 것은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윤리적인 주체에 대해서입니다. 명백히, 이 첫 번째 개념[개인]은 우리로 하여금 맥퍼슨의 소유권적 개인주의를, 로크적인 전통 안에 있는 개인의 관념을, 그의 시간들, 그의 죽음과 소유에 대한 강박관념 속에서 고립된 이러한 개인을 참조하게 만듭니다. 스피노자에게서 전복적인 것, 그리고 네그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것은 내가 방금 지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인에 대한 정의, 즉 그의 변용성, 욕망, 기쁨, 자유에 의해 표식되는, 운동과 정지의 관계들의 전체로서의 개인입니다. 나의 질문은 따라서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이라는 스피노자의 정의(그리고 {윤리학} 2부와 3부 안에서 우리가 읽혀졌던 것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당신은 개인과 윤리적 주체 사이의 대립을 바라봅니까 아닙니까?
네그리 ― 나로서는, {윤리학} 3부의 독해 속에는 나를 항상 전복시켰던 순간이 있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욕망, 사랑, 슬픔을 개입시키면서 작업했습니다 ; 그러나 이로부터 우리는 슬픔을 걷어냅니다. 바로 이것이 개인과 윤리적 주체 사이의 관계입니다 : 윤리적 주체는 사랑이 욕망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에 시작된다. 슬픔이 사라지는 순간에, 기쁨과 사랑의 관계는 서로 전도되며, 기쁨 자체가 더 많은 어떤 것이 됩니다. 2부에서 3부로의 이행은 따라서, 내가 보기엔 사랑의 순간의, 윤리적 순간의 이러한 과잉(surabondance) 위에 세워집니다.
발리바르 ― 당신은 오늘 자주 \"존재의 충만함(la pl nitude de l\' tr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존재(l\' tr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반-스피노자주의적인 것이 아닌지 자문해봅니다. 당신은, 사실상, 당신이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헤겔적이고 하이데거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스피노자가 전적으로 \"존재의 충만함\" 이나 \"존재의 변하기 쉬움(la versalit de l\' tre)\" 같은 표현, 즉 결국 존재를 재도입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실체가 어떤(un) 무한한 존재 (우리[프랑스] 번역에서 관사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라고 말한다 ; 그러나 \"존재\"에 대해 말하는 것, 이것은 실체의 (범신론적인) 신학화를 재구축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은 스피노자 자신이 이런 종류의 전개에 보냈던 격렬한 비판의 타격에 쓰러지는 것 아닌가요?
네그리는 그가 존재의 충만함에 대해 말할 때, 우리의 세계가 바로 이러한 충만함, 이러한 지평이라고 대답한다. 이 지평적인 무한이야말로 실재, 다양(multiple), 다변(vari )으로 충만해있으며, (외연적인 그리고 내포적인 의미에서) 정확히 무한하다. 이것이 오히려 다른 것보다 하이데거적이라고? ― 네그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슈레이는 마지막으로 네그리에게, 발리바르가 방금 오히려 \"어떤 존재의 충만함(pl nitude d\' tre)\"이라고 말하면서 정식화한 반대를 피해갈 수 있다고 그가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를 묻는다. 그 질문은 사실상 불가피하게 실체의 실사적인 독해―실사의 문법적인 의미에서―가 재도입된 관사의 채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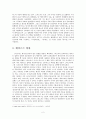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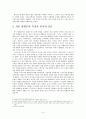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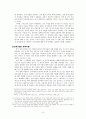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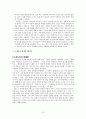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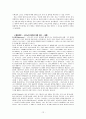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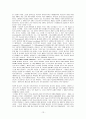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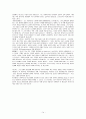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