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불교 동화의 정의
자타카의 정의
동화로서의 효용성
예시
결론
불교동화의 미래
본론
불교 동화의 정의
자타카의 정의
동화로서의 효용성
예시
결론
불교동화의 미래
본문내용
니의 유혹에 지고 말았다. 그래서 이들은 거위를 잡아 무자비하게 털을 뽑아버렸다.
털이 모두 뽑힌 거위는 얼마 후 다시 털이 자라나기 시작했으나 옛날처럼 황금 깃털이 아닌 하얀 깃털이었다. 그리고 깃털이 다 자란 거위는 제 집으로 날아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론
인도의 설화는 5,6세기 무렵부터 페르시아, 아라비아, 시리아 등을 거쳐 유럽에 전해졌다.<아라비안나이트>속에는 수많은 인도의 설화가 들어있다. 유럽에 전해진 인도 설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자타카>일 것이다. 이것은 6세기 이후 번역에 번역을 거듭하여 여러 국가의 민간설화의 모티프가 되었다. 예를 들면 자타카의 <충성을 다한 족제비> 이야기는 개의 이야기로 변하여 유럽 중세에 여러 나라에서 널리 읽혔던 <로마의 7현인 이야기>속에 들어있으며 영국 웨일즈 지방의 북쪽 산간에서는 레웰링 공장의 개 게럴트의 전설로도 전해지고있다. (한국에도 진돗개 이야기라 전해져옴)
<자타카>는 아라비아 어로 번역되어 이슬람 교를 믿는 아시아의 여러 민족에게 전해졌고 원래 산스크리트 어로 된 이것은 남인도의 타미르어, 말레이어, 자바 어 등으로도 번역되어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한국에 이르는 여러 민족의 정서 생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본 바탕이 되었던 불교와 힌두교의 색은 아주 탈색되거나 이슬람, 크리스트교등의 다른 종교로 덧입혀지기도 하고, 때로는 강화되기도 하면서 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불교라는 한 가지 소스가 이토록이나 다양하고 많은 민화로, 설화로, 동화로 전세계적으로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불교문학 속의 소스는 무한하고도 다양해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동화로서의 재탄생은 전통성의 아동교육이라는 점에서 필수 선행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민담을 비롯한 설화의 교육교재로서의 가능성을 논의함과 동시에, 이들을 동화로 만드는 재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타카에 대한 재화 작업이 불전 동화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花亦大學佛典童話新作集 (1984. 京都 :전 3권) 에는 불전 동화가 모두 41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팔리본 자타카가 17편이며 한역 경전 수록 본생 설화 4편까지 포함하면 모두 20편으로 전체 불전동화의 50%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러나 불교 경전의 대화 작업은 그 성격상 당연히 재화 작업을 수행하는 나라와 민족의 문화적 풍토와 융합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도 불교 동화라 하여 일부 출판된 불전 동화가 있지만 아직 불전 설화의 채집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유아 교육에 적용하기는 미흡하고 , 한국 주체적 재화 작업을 통하여 나온 것이 아님으로 인해 현 한국의 유아 교육 현실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동화로서의 특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자타카는 유아 교육 자료의 활용 가능성은 현재로도 충분하지만 그 정서적 기반을 한국화 하고 동시에 동화로 재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보석과 같은 것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이것을 활용할 일만 남은 것이다.
털이 모두 뽑힌 거위는 얼마 후 다시 털이 자라나기 시작했으나 옛날처럼 황금 깃털이 아닌 하얀 깃털이었다. 그리고 깃털이 다 자란 거위는 제 집으로 날아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론
인도의 설화는 5,6세기 무렵부터 페르시아, 아라비아, 시리아 등을 거쳐 유럽에 전해졌다.<아라비안나이트>속에는 수많은 인도의 설화가 들어있다. 유럽에 전해진 인도 설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자타카>일 것이다. 이것은 6세기 이후 번역에 번역을 거듭하여 여러 국가의 민간설화의 모티프가 되었다. 예를 들면 자타카의 <충성을 다한 족제비> 이야기는 개의 이야기로 변하여 유럽 중세에 여러 나라에서 널리 읽혔던 <로마의 7현인 이야기>속에 들어있으며 영국 웨일즈 지방의 북쪽 산간에서는 레웰링 공장의 개 게럴트의 전설로도 전해지고있다. (한국에도 진돗개 이야기라 전해져옴)
<자타카>는 아라비아 어로 번역되어 이슬람 교를 믿는 아시아의 여러 민족에게 전해졌고 원래 산스크리트 어로 된 이것은 남인도의 타미르어, 말레이어, 자바 어 등으로도 번역되어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한국에 이르는 여러 민족의 정서 생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본 바탕이 되었던 불교와 힌두교의 색은 아주 탈색되거나 이슬람, 크리스트교등의 다른 종교로 덧입혀지기도 하고, 때로는 강화되기도 하면서 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불교라는 한 가지 소스가 이토록이나 다양하고 많은 민화로, 설화로, 동화로 전세계적으로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불교문학 속의 소스는 무한하고도 다양해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동화로서의 재탄생은 전통성의 아동교육이라는 점에서 필수 선행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민담을 비롯한 설화의 교육교재로서의 가능성을 논의함과 동시에, 이들을 동화로 만드는 재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타카에 대한 재화 작업이 불전 동화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花亦大學佛典童話新作集 (1984. 京都 :전 3권) 에는 불전 동화가 모두 41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팔리본 자타카가 17편이며 한역 경전 수록 본생 설화 4편까지 포함하면 모두 20편으로 전체 불전동화의 50%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러나 불교 경전의 대화 작업은 그 성격상 당연히 재화 작업을 수행하는 나라와 민족의 문화적 풍토와 융합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도 불교 동화라 하여 일부 출판된 불전 동화가 있지만 아직 불전 설화의 채집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유아 교육에 적용하기는 미흡하고 , 한국 주체적 재화 작업을 통하여 나온 것이 아님으로 인해 현 한국의 유아 교육 현실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동화로서의 특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자타카는 유아 교육 자료의 활용 가능성은 현재로도 충분하지만 그 정서적 기반을 한국화 하고 동시에 동화로 재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보석과 같은 것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이것을 활용할 일만 남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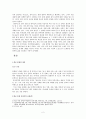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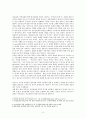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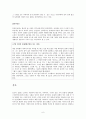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