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사생관이란?
2.본론-①사생관의 변천
②장례식
③자살
3.결론-일본인의 사생관
2.본론-①사생관의 변천
②장례식
③자살
3.결론-일본인의 사생관
본문내용
자가 죽은 자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살아있는 자의 공간이며, 후방의 원분은 죽은 자가 영면하는 죽은 자를 위한 공간 즉 사후의 세계이다.
- 고대 율령국가
농경사회의 보편화, 촌락공동체의 형성 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고대율령국가는 장묘제에 관한 법령을 정해 지배층과는 달리 서민들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회나 마을의 인가 근처에는 무덤을 쓸 수 없도록 법령을 통해 규제함.
일반서민들은 현세와 타계의 경계로서 인식한 마을 외곽의 강가나 산골짜기에 그대로 사체를 유기하고 무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 불교의 유입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완화됨)
승려들이 강가나 산골짜기에 버려진 시체들을 모아서 무덤을 쓰고 장례의식을 거행해줌.
( 불교와 신도의 자연스러운 역할분담)
- 불교식 화장의 보급
시체를 묻는 스데바카(捨"墓)와 죽은 자를 공양하는 마이리바카(參"墓)를 분리하는 兩墓制가 성행함.
- 이처럼, 사자와 생자의 공간을 분리하는 일본인의 양묘제 습관은 사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 일본인의 케가레 의식과 지배층의 전방후원분의 양식이 어울려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충자료 2) 종교
*신도 - 죽음을 어둡고 음습한 것으로 보았음
(→ 피해야 할 대상)
죽은후의 세상을 현세와 분리된 것으로 생각.
이때까지는 일본적 사생관이라기보다 서태평양 공통의 사생관
일본적 의식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신도(神道)에서는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본다. 죽음을 대하는 관점은 종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고대 신도에서는 세상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하늘에 사는 신들의 세상인 高天原[다카마노하라], 인간이 사는 세상인 [나카쓰구니], 마지막으로 지하에 죽은 이가 사는 [요미노구니]가 그것이다. 고대 일본인의 경우는 죽은 후의 세상을 현세와 분리되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가까이 하면 안될 부정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또한 고대 신도에서는 죽은 후의 사람은 지금의 세상과는 다른 상세(常世:도꼬요)에 산다고 보는 생각도 있었다. 이 도꼬요라는 것은 처음에는 지하에 있다고 믿어졌으나 뒷날에는 바다 건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다 건너편에 죽은 자의 세상이 있다’는 관념은 남태평양 여러 섬이나 동남 아시아 각지에서 보이는 타계관(他界觀)으로, 고대 일본 역시 다른 태평양 인접 국가들 - 즉 동쪽으로 가면 바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 - 와 유사한 사생관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교의 영향
불교가 유입됨으로써 일본인의 사생관이 크게 변함
-정토교 → 부처가 살고 있는 땅 = 정토(淨土)
현실 세계 = 예토(穢土)
일본에서는 죽은 후에 극락왕생하는 신앙으로 인식
-말법사상 → 중국에서 시작한 말법사상이 일본에서 유행
기원전 949년을 기준으로 1052년부터 말세(末世)라는 사상
정치적 혼란이 더해져 현세부정이 심해짐
그러나 외래종교인 불교가 유입된 이후부터는 일본인의 사생관도 크게 변한다. 불교가 일본에 처음으로 도래한 것은 6세기 중엽으로, 백제의 성명왕(聖明王)이 일본에 금동제의 석가상, 경론 등을 보낸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 해가 538년(혹은 552년)이라고 전해진다. 그 후 기존의 신도를 믿던 귀족과 외래종교를 옹호하는 귀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으나, 596년 당시의 실력자인 소가(蘇我)씨가 아스카에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사찰인 법흥사(法興寺)[飛鳥寺]를 건립함으로써 아스카 불교가 시작되었다. 이후 대륙으로부터 나라시대에는 화엄종, 헤이안 시대에는 천태종과 진언종 등이 도입되었다.
이 시기까지의 불교는 한국의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호국불교적인 성격이 짙었다.
개인의 안위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불교라는 이데올로기를 사용해 국가통치를 쉽게 하려는 경향을 띤 것이다.
그러나 헤이안 중기부터 후기에 걸쳐 불교의 한 종파인 정토교가 지배적인 불교 종파가 되면서부터 불교는 일본인의 사생관에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 정토교에서 정토(淨土)란 부처가 살고 있는세계라는 뜻으로 더럽혀진 세계인 현세의 예토(穢土)와는 구분된다. 각 정토는 여러 부처가 있는데 아미타불이 사는 서방극락세계, 미륵불이 있는 도솔천 등이 그것이다. 일본에서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신앙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정토교라 하면 죽은 다음 극락왕생하는 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정토교의 기본적인 생각들은 헤이안 후기부터 가마쿠라 시대가 될 때까지의 정치적 혼란과 맞물려 급속도로 일반민중에게 퍼져 나간다. 현실에서 사는 것의 어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낳게 한 것이다. 죽으면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정토에 갈 수 있을 것인데 왜 굳이 생지옥과 다름없는 현세에서 힘들게 살 것인가, 하는 관념이 널리 퍼진 것이다. 기존에 죽음을 어둡고 음습한 것으로 보던 일본인의 사생관이 정토교의 영향으로 크게 바뀐 것이다.
이후 원정기(院政期) 무렵부터는 기존의 정토교에 말법(末法)사상이 덧붙여짐으로써 현세부정의 생각은 더욱 강해진다. 말법 사상은 중국에서 정립된 불교의 역사관으로 일종의 종말 사상이다. 석가불 시대의 정법(正法)과 그 다음 시대인 상법(像法)을 이은 것이 최후로 오는 말법(末法)이라는것이다. 일본 불교에서는 부처 입적이 중국의 설이었던 기원전 949년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정법, 상법을 각각 1000년씩으로 하고 당시의 현세였던 1052년을 말법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말법사상이 한참 유행하던 당시가 때마침 헤이안 시대가 끝나고 전쟁이 계속되던 원정기였으므로 일반 대중은 ‘죽음으로써 극락에 간다’는 이러한 사생관에 더욱 경도되었다. 그리고 그런 사생관은 현재의 일본인의 의식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충자료 3) 집단의식
일본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개인보다도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집단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죽음으로 책임을 지고, 용서를 비는 ‘인책자살’ 생겨났으며,.집단을 위해 죽는 카미카제 특공대나 할복자살, 순사(殉死) 나타났다..집단에 속하지 않고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지메에 의한 자살 나타남. (집단을 위해 죽다 / 집단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다)
- 고대 율령국가
농경사회의 보편화, 촌락공동체의 형성 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고대율령국가는 장묘제에 관한 법령을 정해 지배층과는 달리 서민들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회나 마을의 인가 근처에는 무덤을 쓸 수 없도록 법령을 통해 규제함.
일반서민들은 현세와 타계의 경계로서 인식한 마을 외곽의 강가나 산골짜기에 그대로 사체를 유기하고 무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 불교의 유입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완화됨)
승려들이 강가나 산골짜기에 버려진 시체들을 모아서 무덤을 쓰고 장례의식을 거행해줌.
( 불교와 신도의 자연스러운 역할분담)
- 불교식 화장의 보급
시체를 묻는 스데바카(捨"墓)와 죽은 자를 공양하는 마이리바카(參"墓)를 분리하는 兩墓制가 성행함.
- 이처럼, 사자와 생자의 공간을 분리하는 일본인의 양묘제 습관은 사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 일본인의 케가레 의식과 지배층의 전방후원분의 양식이 어울려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충자료 2) 종교
*신도 - 죽음을 어둡고 음습한 것으로 보았음
(→ 피해야 할 대상)
죽은후의 세상을 현세와 분리된 것으로 생각.
이때까지는 일본적 사생관이라기보다 서태평양 공통의 사생관
일본적 의식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신도(神道)에서는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본다. 죽음을 대하는 관점은 종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고대 신도에서는 세상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하늘에 사는 신들의 세상인 高天原[다카마노하라], 인간이 사는 세상인 [나카쓰구니], 마지막으로 지하에 죽은 이가 사는 [요미노구니]가 그것이다. 고대 일본인의 경우는 죽은 후의 세상을 현세와 분리되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가까이 하면 안될 부정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또한 고대 신도에서는 죽은 후의 사람은 지금의 세상과는 다른 상세(常世:도꼬요)에 산다고 보는 생각도 있었다. 이 도꼬요라는 것은 처음에는 지하에 있다고 믿어졌으나 뒷날에는 바다 건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다 건너편에 죽은 자의 세상이 있다’는 관념은 남태평양 여러 섬이나 동남 아시아 각지에서 보이는 타계관(他界觀)으로, 고대 일본 역시 다른 태평양 인접 국가들 - 즉 동쪽으로 가면 바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 - 와 유사한 사생관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교의 영향
불교가 유입됨으로써 일본인의 사생관이 크게 변함
-정토교 → 부처가 살고 있는 땅 = 정토(淨土)
현실 세계 = 예토(穢土)
일본에서는 죽은 후에 극락왕생하는 신앙으로 인식
-말법사상 → 중국에서 시작한 말법사상이 일본에서 유행
기원전 949년을 기준으로 1052년부터 말세(末世)라는 사상
정치적 혼란이 더해져 현세부정이 심해짐
그러나 외래종교인 불교가 유입된 이후부터는 일본인의 사생관도 크게 변한다. 불교가 일본에 처음으로 도래한 것은 6세기 중엽으로, 백제의 성명왕(聖明王)이 일본에 금동제의 석가상, 경론 등을 보낸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 해가 538년(혹은 552년)이라고 전해진다. 그 후 기존의 신도를 믿던 귀족과 외래종교를 옹호하는 귀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으나, 596년 당시의 실력자인 소가(蘇我)씨가 아스카에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사찰인 법흥사(法興寺)[飛鳥寺]를 건립함으로써 아스카 불교가 시작되었다. 이후 대륙으로부터 나라시대에는 화엄종, 헤이안 시대에는 천태종과 진언종 등이 도입되었다.
이 시기까지의 불교는 한국의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호국불교적인 성격이 짙었다.
개인의 안위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불교라는 이데올로기를 사용해 국가통치를 쉽게 하려는 경향을 띤 것이다.
그러나 헤이안 중기부터 후기에 걸쳐 불교의 한 종파인 정토교가 지배적인 불교 종파가 되면서부터 불교는 일본인의 사생관에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 정토교에서 정토(淨土)란 부처가 살고 있는세계라는 뜻으로 더럽혀진 세계인 현세의 예토(穢土)와는 구분된다. 각 정토는 여러 부처가 있는데 아미타불이 사는 서방극락세계, 미륵불이 있는 도솔천 등이 그것이다. 일본에서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신앙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정토교라 하면 죽은 다음 극락왕생하는 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정토교의 기본적인 생각들은 헤이안 후기부터 가마쿠라 시대가 될 때까지의 정치적 혼란과 맞물려 급속도로 일반민중에게 퍼져 나간다. 현실에서 사는 것의 어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낳게 한 것이다. 죽으면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정토에 갈 수 있을 것인데 왜 굳이 생지옥과 다름없는 현세에서 힘들게 살 것인가, 하는 관념이 널리 퍼진 것이다. 기존에 죽음을 어둡고 음습한 것으로 보던 일본인의 사생관이 정토교의 영향으로 크게 바뀐 것이다.
이후 원정기(院政期) 무렵부터는 기존의 정토교에 말법(末法)사상이 덧붙여짐으로써 현세부정의 생각은 더욱 강해진다. 말법 사상은 중국에서 정립된 불교의 역사관으로 일종의 종말 사상이다. 석가불 시대의 정법(正法)과 그 다음 시대인 상법(像法)을 이은 것이 최후로 오는 말법(末法)이라는것이다. 일본 불교에서는 부처 입적이 중국의 설이었던 기원전 949년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정법, 상법을 각각 1000년씩으로 하고 당시의 현세였던 1052년을 말법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말법사상이 한참 유행하던 당시가 때마침 헤이안 시대가 끝나고 전쟁이 계속되던 원정기였으므로 일반 대중은 ‘죽음으로써 극락에 간다’는 이러한 사생관에 더욱 경도되었다. 그리고 그런 사생관은 현재의 일본인의 의식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충자료 3) 집단의식
일본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개인보다도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집단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죽음으로 책임을 지고, 용서를 비는 ‘인책자살’ 생겨났으며,.집단을 위해 죽는 카미카제 특공대나 할복자살, 순사(殉死) 나타났다..집단에 속하지 않고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지메에 의한 자살 나타남. (집단을 위해 죽다 / 집단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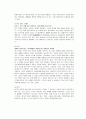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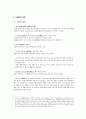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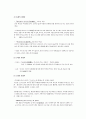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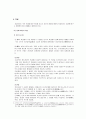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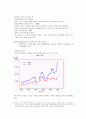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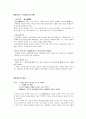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