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삼국시대의 혼인 풍습
1) 신라
2) 고구려
3) 백제
2. 고려시대의 혼인 풍습
3. 조선시대의 혼인 풍습
1) 신라
2) 고구려
3) 백제
2. 고려시대의 혼인 풍습
3. 조선시대의 혼인 풍습
본문내용
때문에 왕실에서 실행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여전히 남귀여가혼의 습속은 지속되어 남자가 여자에 장가들고 처가살이 하는 풍속이 있었다. 이렇게 남성이 장가드는 풍습은 17∼18세기까지 지속되었고, 18세기 들어 가부장제가 확고해지면서 비로소 중국식에서 유래한 시집가기가 일반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뒷간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는 속담이 있다. 조선 초기나 고려, 삼국시대에는 처가살이가 당연한 것이었으나, 조선 후기에 친영례 풍습이 보편화되면서 이와 같은 속담마저 나온 것이다. 가부장 질서가 확고해지면서 여성의 시집살이가 시작된 것이지만, 시집살이는 우리 역사에서 사실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 재산 상속 관련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던 다처제는 1413년 조선의 3대 왕 태종(太宗, 재위: 1400∼1418)이 두 번 혼인(重婚)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리면서 차츰 사라지게 된다.
- 이혼 및 재혼과 관련한 풍습도 변했다. 조선 초기까지는 여성의 재혼이 금지되지 않았지만, 1477년(성종 8) 과부재가금지법(寡婦再嫁禁止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양반층은 물론 차츰 일반 서민들까지도 여성의 재혼을 금기시하게 되었다.
- 근친혼인, 동성동본(同姓同本) 혼인도 금지
- 부계혈통을 계승하고 부계조상을 숭상하는 가족제도로서 여성의 지위가 출가외인으로 되었다. 시집의 혈통계승자인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하며 제사를 받들고 종족의 친화를 도모하기 위한 손님접대 등 봉제사접빈객을 위한 모든 집안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현모양처의 역할이 강요되었다. 이로써 조선조 여성의 부덕은 시집의 가계계승과 번성을 위한 희생적 삶으로 나타났다.
“뒷간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는 속담이 있다. 조선 초기나 고려, 삼국시대에는 처가살이가 당연한 것이었으나, 조선 후기에 친영례 풍습이 보편화되면서 이와 같은 속담마저 나온 것이다. 가부장 질서가 확고해지면서 여성의 시집살이가 시작된 것이지만, 시집살이는 우리 역사에서 사실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 재산 상속 관련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던 다처제는 1413년 조선의 3대 왕 태종(太宗, 재위: 1400∼1418)이 두 번 혼인(重婚)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리면서 차츰 사라지게 된다.
- 이혼 및 재혼과 관련한 풍습도 변했다. 조선 초기까지는 여성의 재혼이 금지되지 않았지만, 1477년(성종 8) 과부재가금지법(寡婦再嫁禁止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양반층은 물론 차츰 일반 서민들까지도 여성의 재혼을 금기시하게 되었다.
- 근친혼인, 동성동본(同姓同本) 혼인도 금지
- 부계혈통을 계승하고 부계조상을 숭상하는 가족제도로서 여성의 지위가 출가외인으로 되었다. 시집의 혈통계승자인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하며 제사를 받들고 종족의 친화를 도모하기 위한 손님접대 등 봉제사접빈객을 위한 모든 집안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현모양처의 역할이 강요되었다. 이로써 조선조 여성의 부덕은 시집의 가계계승과 번성을 위한 희생적 삶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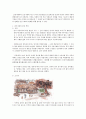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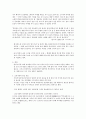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