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데모크리투스의 유물론적 원자론
2. 수학에의 공헌
3. 기계론적 유물론
2. 수학에의 공헌
3. 기계론적 유물론
본문내용
... , n배 하면 어떤 수 보다도 크게 할 수 있다. 즉, 주어진 임의의 양수 b에 대하여, 반드시 na>b인 자연수 n이 존재한다’ 이 공리는 실수의 무한성과 연속성을 주장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비교-아르키메데스의 원리(Principle of Arichimedes)=정역학의 원리)
’에 따르지 않는 실무한소로서 그 전형이다. ‘실무한소’라는 양을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유한량보다도 적고 거기에다 더 분할할 수 없는 정해진 양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실무한소에 관한 개념은 그의 원자론적인 관점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뿔 모양의 각’을 둘러싼 논쟁은 13세기부터 16세기에 이르기까지 다시 불붙었고, 17세기에 이르러 케플러와 카발리에리의 불가분량의 방법에 원형을 제공하였다.
데모크리투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그의 수학 저작에서 차례가 유클리드의『원본』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즉, 평면기하학(제1권에서 제6권), 수(제7권에서 제9권), 통약될 수 없는 양(제10권) 등이 일치하고 있다. 이는 그의 저작이 다른 것들과 함께 『원본』집필의 초석이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3. 기계론적 유물론(mechanical materialism, 機械論的唯物論)
일체의 현상이 기계적 운동에 의해 생긴다고 보는 세계관. 기원은 모든 것을 운동의 본성(本性)으로 하는 원자(atom)의 집합과 이산(離散)으로 설명한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나 에피쿠로스의 원자론에 있으며, 근대에 와서는 T.홉스, P.가생디에 의해 계승되었다.
18세기의 프랑스에서는 자연과학의 발전에 따라 모든 현상을 역학적인 개념이나 법칙에 따라 설명하고, 질적으로 다양한 현상을 물질의 역학적 운동으로 환원하는 프랑스 유물론이 성립되었다. 좁은 뜻으로는 이것을 가리킨다. 프랑스 유물론은 계몽사상에 독특한 색채를 가미하였고, 대표적 학자로는 D.디드로, J.O.라메트리, P.H.올바크, C.A.엘베시위스 등이 있다. 이들은 감각론(感覺論) 무신론(無神論) 쾌락설(快樂說) 공리설(功利說) 등으로써 구제도(舊制度)나 사변적(思辨的) 형이상학 신학을 이성과 과학의 입장에서 신랄하게 공격하여 대혁명의 사상적 선구가 되었다.
19세기의 독일에서는 의식이나 사고(思考)를 자연법칙으로 환원시키는 W.포크트, J.모레스코트 등의 속류 유물론(俗流唯物論)이 되었다가 이윽고 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하여 극복되었다.
’에 따르지 않는 실무한소로서 그 전형이다. ‘실무한소’라는 양을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유한량보다도 적고 거기에다 더 분할할 수 없는 정해진 양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실무한소에 관한 개념은 그의 원자론적인 관점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뿔 모양의 각’을 둘러싼 논쟁은 13세기부터 16세기에 이르기까지 다시 불붙었고, 17세기에 이르러 케플러와 카발리에리의 불가분량의 방법에 원형을 제공하였다.
데모크리투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그의 수학 저작에서 차례가 유클리드의『원본』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즉, 평면기하학(제1권에서 제6권), 수(제7권에서 제9권), 통약될 수 없는 양(제10권) 등이 일치하고 있다. 이는 그의 저작이 다른 것들과 함께 『원본』집필의 초석이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3. 기계론적 유물론(mechanical materialism, 機械論的唯物論)
일체의 현상이 기계적 운동에 의해 생긴다고 보는 세계관. 기원은 모든 것을 운동의 본성(本性)으로 하는 원자(atom)의 집합과 이산(離散)으로 설명한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나 에피쿠로스의 원자론에 있으며, 근대에 와서는 T.홉스, P.가생디에 의해 계승되었다.
18세기의 프랑스에서는 자연과학의 발전에 따라 모든 현상을 역학적인 개념이나 법칙에 따라 설명하고, 질적으로 다양한 현상을 물질의 역학적 운동으로 환원하는 프랑스 유물론이 성립되었다. 좁은 뜻으로는 이것을 가리킨다. 프랑스 유물론은 계몽사상에 독특한 색채를 가미하였고, 대표적 학자로는 D.디드로, J.O.라메트리, P.H.올바크, C.A.엘베시위스 등이 있다. 이들은 감각론(感覺論) 무신론(無神論) 쾌락설(快樂說) 공리설(功利說) 등으로써 구제도(舊制度)나 사변적(思辨的) 형이상학 신학을 이성과 과학의 입장에서 신랄하게 공격하여 대혁명의 사상적 선구가 되었다.
19세기의 독일에서는 의식이나 사고(思考)를 자연법칙으로 환원시키는 W.포크트, J.모레스코트 등의 속류 유물론(俗流唯物論)이 되었다가 이윽고 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하여 극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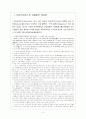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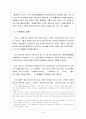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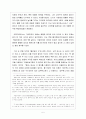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