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용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고 한다.]
[기와]는 토기 굽는 기술의 뒷받침을 받아 만들어진 혁신적 발명품이었다. 빗물이 샐 틈은 없으며, 한 번 시공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와]에도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무게다. 지붕 위에 기와를 한 장 얹어놓고 “자, 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연히 지붕 전체를 기와로 덮어야만 하는데 이 수천의 기와는 무게가 상당하다. 그렇기에 튼튼한 기둥과, 서까래가 필요했다. 필요로 하면 만들어지는 법. 그런 기와의 사용에 따라 고구려는 건축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지만, 아직 현실적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다. 언제나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돈. 돈이 문제이다. 왜 돈이 문제이냐고? 기와는 비싸다. 한 두 장만 있으면 되는 물건이 아닌지라, 당연히 상당히 돈이 들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기와는 일반적인 집이 아닌 궁궐, 절, 관청, 그리고 귀족의 집에 사용되었다.
그럼 이제 기와집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구려의 기와집은 조선 한옥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무엇인지 살펴보자면, 우선적으로 마루가 없다. 집안에 고깃간, 부엌, 마굿간, 다락 창고, 방앗간, 차고 등이 있었건만 마루가 없다. 뜰도 있어서, 큰 집에서는 정원에서 활쏘기도 가능했건만 마루가 없었다.
2) 백제의 집.
백제가 성장한 한강 유역에서는 부뚜막이 발달되었다. 종전의 움을 파고 만든 화덕을 넘어서서 난방과 조리에 훨씬 효율적이었다. 처음에는 화덕과 부뚜막이 공존하는 형태였지만 점차적으로 부뚜막만 남게 되었다. 부뚜막은 수혈 주거만이 아닌 벽주 건물에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부뚜막이 사용됨에 따라 연통도 생겨났다.
백제의 집의 특징은 평면 육각형 수혈 주거지의 발달이다. 凸자나 呂자의 발전형이라고 여겨지는 이 주거지는, 70~80m^2이상의 대형이며, 주거지 안쪽에는 벽선을 따라 직경 15~20cm이상의 주공이 면밀하게 열을 이루고 있고, 온돌 시설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또한 백제 역시 기와를 사용했는데, 고구려와는 확연한 차이점을 드러낸다.
[백제의 기와]
고구려의 기와가 힘이 넘치고 거친 느낌을 준다면, 백제의 기와는 넘칠듯 넘치지 않는 긴장감과 풍만함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대부분이 여덟 잎의 연꽃이며 한 가운데에 씨가 도드라진 모양이다.
3) 신라의 집
천년의 수도, 경주를 중심으로 삼국 중 가장 오랜 시간동안 나라를 유지했던, 골품제라는 특이한 신분제를 실시했던 나라, 신라. 당시 신라 사람들은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
누가 특이한 신분제 실시를 하지 않았다고 할까봐, 신라인들은 주거지에도 신분에 따른 제약이 매우 심했다고 한다. 형태는 남북을 장축으로 하고, 평면은 凸자 형과 방형, 장방형으로 구분된다. 이들의 중에는 특히, 아궁이와 연도부로 구성된 부뚜막 형태의 노지가 확인되었다.
또한 신라 역시 기와를 사용하였는데, 그 형태는 어땠을까.
[통일신라의 기와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아주 익숙한 문양이다. 2002년이 생각나게 해준다.]
위는 통일신라의 기와이다. 통일신라시대의 기와는 7세기 후반기에 고신라의 전통을 바탕으로, 고구려 및 백제의 영향과 고구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손잡은 아주 질이 나쁜 당나라의 자극에 힘입어 폭넓은 복합과정을 거쳤고, 그리하여 다양한 양식변화를 낳게 되었다.
보통은 연꽃무늬가 중심적이고 양식변화도 가장 풍부한데, 종래의 단순소박한 단판양식에서 연판의 내부에 자엽이 새겨지고 주연부에 구슬무늬나 꽃무늬 등이 장식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전한되면서 복판, 중판, 세판, 혼판 등의 양식적 발전을 보게 된다. 이 가운데 가장 유행한 것은 막새면을 안팎으로 구획하여 꽃잎을 이중으로 배치하고 있는 중판 양식이다.
연꽃 이외의 주요 무늬로는 보상화, 인동, 초화 등 식물을 소재로 한 서화무늬와 봉황, 기린, 사자, 가름빈가(불경에 나와있는 상상의 새) 등 벽사와 길상을 의미하는 새나 짐승의 무늬를 들 수 있겠다.
암막새는 통일신라시대 직후부터 당초무늬가 새겨져 제작되게 되었다. 초기의 양식은 고식의 당초무늬가 대칭형으로 유려하게 새겨진 턱이 없는 무악식이지만, 점차 드림새의 너비가 넓어지면서 막새의 턱과 암키와의 접합부가 직각을 이루게 되는 유악식으로 발전한다. 이에 따라 초기의 당초무늬도 여러 문양들과 조합되어 보상화당초, 인동당초, 포도당초, 화엽당초 등의 여러 무늬로 변화되어 장식적인 특색을 바루히하게 된다.
한편, 수막새에 새겨진 새나 동물무늬, 용, 비천, 구름 등이 암막새의 무늬로 채용되어 화려한 의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 녹유기와를 비롯하여 특수기와와 장식기와들이 다양하게 제작되어 동양의 기와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기와가 최고봉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가야의 집.
가야의 집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하나는 수혈가옥이고, 다른 하나는 지상가옥이다.
그 중에서 수혈가옥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바닥을 평평하고 단단하게 만든 다음 둘레에 기둥을 세워 지붕을 덮은 움집이다.
[가야의 수혈저택. 여기 복원된 것은 유적 46호 수혈주거지를 참고하여 복원된 가옥이라고 한다.]
신석기부터 가야까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거형태가 바로 이 수혈가옥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하나인 지상가옥은 무엇일까. 이 지상가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오늘날 같은 지상가옥이고, 다른 하나는 고상가옥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고상가옥은 완전과 반고상가옥으로 다시 나뉘는데, 집의 형태란 참으로 다양했구나, 라고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다.
[고상가옥의 모습]
지상가옥은 대부분 맞배지붕 초가집이 많았다. 집모양 토기의 모습으로 추정컨대, 내부환기가 가능하게 해주는 환기구멍이 지붕을 받치는 들보 사이로 나 있어서, 빛과 공기를 투과시키는 창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6. 고려의 집
고려, 라는 말을 듣고 떠오르는 단어는 단연 ‘청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자란, 철분이 조금 들어 있는 흙으로 빚고, 유약을 발라 섭씨 1200도 이상의 온도로 구운 도자기이다. 어쨌거나, 이 청자가 생각나는 나라, 고려의 집은 어땠을까.
나라가 바뀌었다고 해서, “으
[기와]는 토기 굽는 기술의 뒷받침을 받아 만들어진 혁신적 발명품이었다. 빗물이 샐 틈은 없으며, 한 번 시공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와]에도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무게다. 지붕 위에 기와를 한 장 얹어놓고 “자, 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연히 지붕 전체를 기와로 덮어야만 하는데 이 수천의 기와는 무게가 상당하다. 그렇기에 튼튼한 기둥과, 서까래가 필요했다. 필요로 하면 만들어지는 법. 그런 기와의 사용에 따라 고구려는 건축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지만, 아직 현실적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다. 언제나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돈. 돈이 문제이다. 왜 돈이 문제이냐고? 기와는 비싸다. 한 두 장만 있으면 되는 물건이 아닌지라, 당연히 상당히 돈이 들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기와는 일반적인 집이 아닌 궁궐, 절, 관청, 그리고 귀족의 집에 사용되었다.
그럼 이제 기와집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구려의 기와집은 조선 한옥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무엇인지 살펴보자면, 우선적으로 마루가 없다. 집안에 고깃간, 부엌, 마굿간, 다락 창고, 방앗간, 차고 등이 있었건만 마루가 없다. 뜰도 있어서, 큰 집에서는 정원에서 활쏘기도 가능했건만 마루가 없었다.
2) 백제의 집.
백제가 성장한 한강 유역에서는 부뚜막이 발달되었다. 종전의 움을 파고 만든 화덕을 넘어서서 난방과 조리에 훨씬 효율적이었다. 처음에는 화덕과 부뚜막이 공존하는 형태였지만 점차적으로 부뚜막만 남게 되었다. 부뚜막은 수혈 주거만이 아닌 벽주 건물에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부뚜막이 사용됨에 따라 연통도 생겨났다.
백제의 집의 특징은 평면 육각형 수혈 주거지의 발달이다. 凸자나 呂자의 발전형이라고 여겨지는 이 주거지는, 70~80m^2이상의 대형이며, 주거지 안쪽에는 벽선을 따라 직경 15~20cm이상의 주공이 면밀하게 열을 이루고 있고, 온돌 시설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또한 백제 역시 기와를 사용했는데, 고구려와는 확연한 차이점을 드러낸다.
[백제의 기와]
고구려의 기와가 힘이 넘치고 거친 느낌을 준다면, 백제의 기와는 넘칠듯 넘치지 않는 긴장감과 풍만함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대부분이 여덟 잎의 연꽃이며 한 가운데에 씨가 도드라진 모양이다.
3) 신라의 집
천년의 수도, 경주를 중심으로 삼국 중 가장 오랜 시간동안 나라를 유지했던, 골품제라는 특이한 신분제를 실시했던 나라, 신라. 당시 신라 사람들은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
누가 특이한 신분제 실시를 하지 않았다고 할까봐, 신라인들은 주거지에도 신분에 따른 제약이 매우 심했다고 한다. 형태는 남북을 장축으로 하고, 평면은 凸자 형과 방형, 장방형으로 구분된다. 이들의 중에는 특히, 아궁이와 연도부로 구성된 부뚜막 형태의 노지가 확인되었다.
또한 신라 역시 기와를 사용하였는데, 그 형태는 어땠을까.
[통일신라의 기와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아주 익숙한 문양이다. 2002년이 생각나게 해준다.]
위는 통일신라의 기와이다. 통일신라시대의 기와는 7세기 후반기에 고신라의 전통을 바탕으로, 고구려 및 백제의 영향과 고구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손잡은 아주 질이 나쁜 당나라의 자극에 힘입어 폭넓은 복합과정을 거쳤고, 그리하여 다양한 양식변화를 낳게 되었다.
보통은 연꽃무늬가 중심적이고 양식변화도 가장 풍부한데, 종래의 단순소박한 단판양식에서 연판의 내부에 자엽이 새겨지고 주연부에 구슬무늬나 꽃무늬 등이 장식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전한되면서 복판, 중판, 세판, 혼판 등의 양식적 발전을 보게 된다. 이 가운데 가장 유행한 것은 막새면을 안팎으로 구획하여 꽃잎을 이중으로 배치하고 있는 중판 양식이다.
연꽃 이외의 주요 무늬로는 보상화, 인동, 초화 등 식물을 소재로 한 서화무늬와 봉황, 기린, 사자, 가름빈가(불경에 나와있는 상상의 새) 등 벽사와 길상을 의미하는 새나 짐승의 무늬를 들 수 있겠다.
암막새는 통일신라시대 직후부터 당초무늬가 새겨져 제작되게 되었다. 초기의 양식은 고식의 당초무늬가 대칭형으로 유려하게 새겨진 턱이 없는 무악식이지만, 점차 드림새의 너비가 넓어지면서 막새의 턱과 암키와의 접합부가 직각을 이루게 되는 유악식으로 발전한다. 이에 따라 초기의 당초무늬도 여러 문양들과 조합되어 보상화당초, 인동당초, 포도당초, 화엽당초 등의 여러 무늬로 변화되어 장식적인 특색을 바루히하게 된다.
한편, 수막새에 새겨진 새나 동물무늬, 용, 비천, 구름 등이 암막새의 무늬로 채용되어 화려한 의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 녹유기와를 비롯하여 특수기와와 장식기와들이 다양하게 제작되어 동양의 기와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기와가 최고봉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가야의 집.
가야의 집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하나는 수혈가옥이고, 다른 하나는 지상가옥이다.
그 중에서 수혈가옥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바닥을 평평하고 단단하게 만든 다음 둘레에 기둥을 세워 지붕을 덮은 움집이다.
[가야의 수혈저택. 여기 복원된 것은 유적 46호 수혈주거지를 참고하여 복원된 가옥이라고 한다.]
신석기부터 가야까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거형태가 바로 이 수혈가옥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하나인 지상가옥은 무엇일까. 이 지상가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오늘날 같은 지상가옥이고, 다른 하나는 고상가옥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고상가옥은 완전과 반고상가옥으로 다시 나뉘는데, 집의 형태란 참으로 다양했구나, 라고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다.
[고상가옥의 모습]
지상가옥은 대부분 맞배지붕 초가집이 많았다. 집모양 토기의 모습으로 추정컨대, 내부환기가 가능하게 해주는 환기구멍이 지붕을 받치는 들보 사이로 나 있어서, 빛과 공기를 투과시키는 창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6. 고려의 집
고려, 라는 말을 듣고 떠오르는 단어는 단연 ‘청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자란, 철분이 조금 들어 있는 흙으로 빚고, 유약을 발라 섭씨 1200도 이상의 온도로 구운 도자기이다. 어쨌거나, 이 청자가 생각나는 나라, 고려의 집은 어땠을까.
나라가 바뀌었다고 해서, “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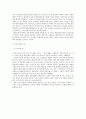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