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첫 번째 예 : 형법 제250조 살인죄와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죄
(2) 두 번째 예 : 특가법 제5조의8과 형법 제114조
(3) 세 번째 예 : 특가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12조
(4) 네 번째 예 : 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 제324조의3, 제324조의4, 제337조, 제338조
(2) 두 번째 예 : 특가법 제5조의8과 형법 제114조
(3) 세 번째 예 : 특가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12조
(4) 네 번째 예 : 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 제324조의3, 제324조의4, 제337조, 제338조
본문내용
까지 계획한 것과 강도 행위를 하는 도중 범죄자의 과실로 피해자를 밀쳤는데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한 것을 비교해볼 때 전자의 경우의 범죄자가 더욱더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은 엄연히 불법성이 상이한 고의범과 과실범이 같은 법정형을 받도록 규정되어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책임주의와 관련하여 부당하다.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범죄를 억제하는 장애물인 형벌은 그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범죄로 이끄는 충동이나 유혹의 강도에서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요구되어 지는 것이다.” 체자레 베카리아(이수성, 한인섭 공역), 범죄와 형벌, 길인사, 1995, 113면.
라고 하여 범죄와 형벌간의 균형을 강조하고 형벌을 적용하는 데 엄격성을 강조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의 요구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비례성이 지켜지지 않고 적법절차를 무시한 가혹한 형벌은 형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 처벌이 가해진다면 일반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언정 존중받는 법은 될 수 없으며, 범죄자들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걷잡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합리적인 법정형은 법관의 합리적인 양형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어요인이 된다.
하지만 여태까지 형법 및 특가법에서 문제시되는 조항들을 보았듯이 범죄자에게 과도하게 가혹하도록 법정형이 설정되어있는 경우도 있었고 법체계와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위의 예를 든 것 외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여러 특별형법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결단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식의 인간존엄성보다 그들의 의견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태도는 버릴 필요가 있다. 또한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그 법조항들이 평등의 원리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적합한 것인지 검증해보는 태도가 절실하다. 비합리적인 법정형을 규정해 놓고 적극적으로 합리적임을 논증하지 아니한 채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의 기능을 포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의견으로, 김재윤,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p409
헌법재판소가 소극적 태도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범죄와 형벌간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구분해내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법조항들을 개정하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인도적 형벌을 내리도록 유도할 때 비로소 법은 국민들에게 존중할 만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범죄를 억제하는 장애물인 형벌은 그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범죄로 이끄는 충동이나 유혹의 강도에서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요구되어 지는 것이다.” 체자레 베카리아(이수성, 한인섭 공역), 범죄와 형벌, 길인사, 1995, 113면.
라고 하여 범죄와 형벌간의 균형을 강조하고 형벌을 적용하는 데 엄격성을 강조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의 요구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비례성이 지켜지지 않고 적법절차를 무시한 가혹한 형벌은 형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 처벌이 가해진다면 일반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언정 존중받는 법은 될 수 없으며, 범죄자들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걷잡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합리적인 법정형은 법관의 합리적인 양형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어요인이 된다.
하지만 여태까지 형법 및 특가법에서 문제시되는 조항들을 보았듯이 범죄자에게 과도하게 가혹하도록 법정형이 설정되어있는 경우도 있었고 법체계와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위의 예를 든 것 외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여러 특별형법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결단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식의 인간존엄성보다 그들의 의견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태도는 버릴 필요가 있다. 또한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그 법조항들이 평등의 원리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적합한 것인지 검증해보는 태도가 절실하다. 비합리적인 법정형을 규정해 놓고 적극적으로 합리적임을 논증하지 아니한 채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의 기능을 포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의견으로, 김재윤,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p409
헌법재판소가 소극적 태도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범죄와 형벌간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구분해내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법조항들을 개정하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인도적 형벌을 내리도록 유도할 때 비로소 법은 국민들에게 존중할 만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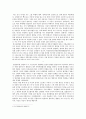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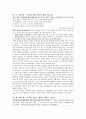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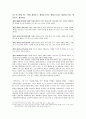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