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종교 적응론자의 견해
* 종교 부산물론자의 견해
기독교가 종교와 과학 문제에 유독 유난을 떠는 이유
* 종교 부산물론자의 견해
기독교가 종교와 과학 문제에 유독 유난을 떠는 이유
본문내용
ogos이라고, 즉 신학theologia이라고 규정한다.
초기 기독교는 당시 경쟁하던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그 출발부터 신화mythos를 부정하고 이성logos을 택하면서 스스로를 합리적 정신에 자리매김한 것이다.
신화해 근거한 이방 종교 대 이성에 근거한 기독교, 이런 도식이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교회가 로마 제국의 사제가 되면서, 기독교의 체계화와 통일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런 궤적의 정점에 스콜라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Thomas Aquinas(1225~1274)에게서 완성되는 중세 스콜라주의는 신학적 담론을 \'자연의 영역\'과 \'은총의 영역\' 모두를 포괄하는 장대한 체계로 구상했다. 이렇게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지식 체계는 종교적 진리에 기반을 둔 통일 체계에 포괄되어 있었다. 따라서 종교와 과학은 신의 진리와 영광을 드러내는 데 상보적 관계라고 할 수 있었다.
물론 이때 과학은 종교를 보완하는 부차적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비대칭적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은 과학 혁명과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였다.
과학 혁명이후 현대까지도 기독교는 항상 과학을 다시 자신의 통일된 체계 또는 적어도 상보적 체계로 편입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창조 과학이나 지적 설계 운동이 주류 과학에 대해 과학적 정의 문제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이런 흐름으로 읽을 수 있다.
이는 신학적 통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근본주의 기독교의 줄기찬 시도로 읽힐 수 있다.그러나 이것은 서구 기독교가 로고스 중심주의의 오랜 관성 탓에, 여전히 진리 체계의 통일성과 완전성을 추구하면서 담론의 균열을 감당하지도, 다름을 용납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종교와 과학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과학이 기독교 전통 안에서 발생했다는 역사적 맥락 외에도, 이렇게 관련된 모든 영역을 인식론적으로 통일하고 체계화하려는 정신이 기독교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종교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킨스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과학적 무신론이나 과학 중심주의 역시 그런 로고스 중심주의의 영향 아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도 과학으로의 천하통일을 꿈꾸고 있다.
과학적 토대주의, 인식론적 획일성, 체계적 통일성을 지향하는 윌슨의 통섭이나 도킨스의 과학주의 역시, 기독교 신학만큼이나 로고스 중심주의의 우산 아래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재식 <종교전쟁> 중에서
초기 기독교는 당시 경쟁하던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그 출발부터 신화mythos를 부정하고 이성logos을 택하면서 스스로를 합리적 정신에 자리매김한 것이다.
신화해 근거한 이방 종교 대 이성에 근거한 기독교, 이런 도식이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교회가 로마 제국의 사제가 되면서, 기독교의 체계화와 통일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런 궤적의 정점에 스콜라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Thomas Aquinas(1225~1274)에게서 완성되는 중세 스콜라주의는 신학적 담론을 \'자연의 영역\'과 \'은총의 영역\' 모두를 포괄하는 장대한 체계로 구상했다. 이렇게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지식 체계는 종교적 진리에 기반을 둔 통일 체계에 포괄되어 있었다. 따라서 종교와 과학은 신의 진리와 영광을 드러내는 데 상보적 관계라고 할 수 있었다.
물론 이때 과학은 종교를 보완하는 부차적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비대칭적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은 과학 혁명과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였다.
과학 혁명이후 현대까지도 기독교는 항상 과학을 다시 자신의 통일된 체계 또는 적어도 상보적 체계로 편입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창조 과학이나 지적 설계 운동이 주류 과학에 대해 과학적 정의 문제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이런 흐름으로 읽을 수 있다.
이는 신학적 통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근본주의 기독교의 줄기찬 시도로 읽힐 수 있다.그러나 이것은 서구 기독교가 로고스 중심주의의 오랜 관성 탓에, 여전히 진리 체계의 통일성과 완전성을 추구하면서 담론의 균열을 감당하지도, 다름을 용납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종교와 과학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과학이 기독교 전통 안에서 발생했다는 역사적 맥락 외에도, 이렇게 관련된 모든 영역을 인식론적으로 통일하고 체계화하려는 정신이 기독교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종교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킨스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과학적 무신론이나 과학 중심주의 역시 그런 로고스 중심주의의 영향 아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도 과학으로의 천하통일을 꿈꾸고 있다.
과학적 토대주의, 인식론적 획일성, 체계적 통일성을 지향하는 윌슨의 통섭이나 도킨스의 과학주의 역시, 기독교 신학만큼이나 로고스 중심주의의 우산 아래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재식 <종교전쟁>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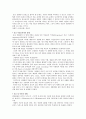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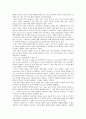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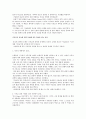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