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目 次
1. 고려가요 개관
2. 주요 작품 소개
2.1. 동동
2.2. 가시리
2.3. 서경별곡
2.4. 사모곡
2.5. 상저가
2.6. 정읍사
2.7. 쌍화점
2.8. 만전춘별사
2.9. 정석가
2.10. 처용가
2.11. 청산별곡
3. 고려 가요에 대한 논의
3.1. 명칭 및 장르론
3.2. 작자 및 수용자론
3.3. 형식 및 발생론
3.4. 형태 및 율격론
3.5. 미의식
4. 참고문헌
1. 고려가요 개관
2. 주요 작품 소개
2.1. 동동
2.2. 가시리
2.3. 서경별곡
2.4. 사모곡
2.5. 상저가
2.6. 정읍사
2.7. 쌍화점
2.8. 만전춘별사
2.9. 정석가
2.10. 처용가
2.11. 청산별곡
3. 고려 가요에 대한 논의
3.1. 명칭 및 장르론
3.2. 작자 및 수용자론
3.3. 형식 및 발생론
3.4. 형태 및 율격론
3.5. 미의식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편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높은 산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며 남편이 혹시 밤길에 위해(危害)를 입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달\'에게 빌어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있는 노래이다. 여기서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라는 후렴구를 빼고 작품을 읽으면 오늘날 시조와 어느 정도 유사한 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시조의 원형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2.6.2. 배경설화
정읍은 전주 속현으로 이 고을 사람이 행상(行商)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 아내가 산 위 바위에 올라가 남편이 있을 곳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밤길에 오다가 해(害)나 입지 않을까 염려되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한편 남편을 기다리던 언덕에는 망부석(望夫石)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망부석 설화로 박제상 설화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라 눌지왕 때 일본으로 왕의 동생 미사흔을 데리러 간 박제상이 왕자를 구출했지만 자신은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의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가 일본을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 뒤에 사람들이 그 여인을 치술령 신모(神母)로 모시고, 이를 소재로 지은 노래가 \'치술령곡\'이다.
2.6.3. ‘즌 데’의 의미
행상(行商) 나간 남편의 야행침해(夜行侵害 : 밤길에 해를 입음)에 대한 염려를 ‘즌 데를 드디욜세라.’하여 ‘이수지오(泥水之汚 : 진흙물에 더러워짐)’에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즌 데’란 질은 곳, 즉 축축하게 젖은 장소 또는 물웅덩이를 가리킨다. 이곳에 발을 디디면 진흙물에 옷을 더럽히게 될 거라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밤이 되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심리에서 살펴보면 다른 숨겨진 다른 의미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즌 데\'를 축축하고 더러운 곳, 즉 남편이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사창가나 혹은 사랑에 빠진 다른 여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게 다른 여자에게 빠져 있어서인지 염려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절묘하게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즌 데\'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2.6.4. ‘달’의 역할과 이미지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순박하고 지순한 사랑의 마음이 달에 의탁되어 나타난 이 노래에서 \'달\'은 절대자 혹은 천지신명에 가까운 존재로 나타나 있다. 그 점은 바로 민속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민속 신앙에서 ‘달’은 우리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던 전통적인 수호신적 성격을 갖고 있는 달로, 이 노래에서는 아내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도와주는 절대자의 의미가 함축되어있는 달이다. 이러한 달이기에 남편의 귀갓길과 아내의 마중길, 나아가 그들의 인생행로의 어둠을 물리치는 광명의 상징일 수도 있다.
또한 이 노래에 나오는 달은 원형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달은 찼다가는 기울고 다시 차는 속성으로, 분리와 합일, 충만함과 이지러짐의 이미지를 갖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속성으로 소망과 기원의 이미지도 내포한다. 그것은 월하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던 전통적인 달이기도 한다. 더구나, 이 노래에서는 달은 단순한 달이 아니라 남편의 안전을 빌고 있는 아내의 따뜻한 애정이 서려 있는 달이다. ‘달과 즌데’는 대칭 구조를 이루며, 끝 구절의 ‘내 가논데 졈그랄셰라 ’와 연결된다. 달이 지면 어둠이 차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와 남편사이에는 사랑의 절망이 오게 된다.
2.7. 쌍화점
2.7.1. 작품 개관
「雙花店」은 현재 『樂章歌詞』에 그 원문이 전해지고 그 첫머리의 가사를 따서 「쌍화점」이라 부른다. 또 『時用鄕樂譜』에는「雙花店」이라는 이름으로 순 한문으로 된 전혀 다른 내용의 가사와 악보가 실려 있다. 「쌍화점」의 제작 연대는 『高麗史』악지에 나오는 「三藏」과 「쌍화점」의 2연이 동일하여 연대를 충렬왕 때로 잡는다. 기록에 의하면 충렬왕이 宴樂을 즐겨 신하들이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남장별대(男粧別隊)에게 이 노래를 지어 가르쳤는데 이때의 분위기는 너무 난잡하여 임금과 신하의 구별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김선기(1996), 「고려가요」『한국문학개론』, 경인문화사, p.107
. 그러나 이 작품이 창작곡인지 민요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吳潛, 金元詳 등의 공동작 또는 이 중 어느 한 사람의 작품이라는 주장 정병욱(1977),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p.119
이 있고, 諸道 파견의 행신들이 민간의 속요를 채집하고 편사, 편곡한 노래로 규정 박노정(1990), 「쌍화점의 재조명」『고려가요의 연구』, 새문사, p.166
하는 경우가 있다. 속요의 많은 노래들처럼 쌍화점 또한 민간의 민요가 궁중으로 이입되어 현재의 형태로 다듬어졌다는 의견이 보편적이다.
2.7.2. 작품의 의미 분석
당시 고려 사회는 가부장적 부계친족 윤리를 강조한 조선의 유교 사회와는 달리,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 강화된 수평적 사회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았고, 여자의 재혼이나 재가가 사회적으로 비판받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남녀에게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허용되고 애정의 개방성이 극대화되어 서로의 감정을 주저 없이 토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었다.
「쌍화점」을 보면, 시적 화자(제1여인)는 쌍화점, 삼장사, 드레우물, 술집에 다녀온 일을 고백한다. 그 말을 들은 제2여인은 ‘긔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라고 하며 부러워하고, 이 부분은 제 2여인의 욕망을 드러내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거츠니 업다’ 는 말이 자랑스럽다는 의미에서의 ‘음란하다’라고 해석 될 경우 「쌍화점」의 음란성은 더 짙어진다. 이처럼 이 작품을 표층적 의미에서 보면, 고려 사회가 아무리 개방적인 사회라 하더라도 명백히 남녀 간의 음란한 애정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노래가 충렬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남장별대에 의해 연행되었다는 데서 음란성은 더 짙어진다.
A
B
C
D
1 연
쌍 화 점
쌍화매매
회회아비
삿기광대
2 연
삼 장 사
불 켜 기
사 주
삿기상좌
3 연
드레우물
물 깃 기
우 믓 용
드 레 박
4 연
술 집
술 매 매
짓 아 비
2.6.2. 배경설화
정읍은 전주 속현으로 이 고을 사람이 행상(行商)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 아내가 산 위 바위에 올라가 남편이 있을 곳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밤길에 오다가 해(害)나 입지 않을까 염려되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한편 남편을 기다리던 언덕에는 망부석(望夫石)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망부석 설화로 박제상 설화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라 눌지왕 때 일본으로 왕의 동생 미사흔을 데리러 간 박제상이 왕자를 구출했지만 자신은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의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가 일본을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 뒤에 사람들이 그 여인을 치술령 신모(神母)로 모시고, 이를 소재로 지은 노래가 \'치술령곡\'이다.
2.6.3. ‘즌 데’의 의미
행상(行商) 나간 남편의 야행침해(夜行侵害 : 밤길에 해를 입음)에 대한 염려를 ‘즌 데를 드디욜세라.’하여 ‘이수지오(泥水之汚 : 진흙물에 더러워짐)’에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즌 데’란 질은 곳, 즉 축축하게 젖은 장소 또는 물웅덩이를 가리킨다. 이곳에 발을 디디면 진흙물에 옷을 더럽히게 될 거라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밤이 되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심리에서 살펴보면 다른 숨겨진 다른 의미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즌 데\'를 축축하고 더러운 곳, 즉 남편이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사창가나 혹은 사랑에 빠진 다른 여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게 다른 여자에게 빠져 있어서인지 염려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절묘하게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즌 데\'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2.6.4. ‘달’의 역할과 이미지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순박하고 지순한 사랑의 마음이 달에 의탁되어 나타난 이 노래에서 \'달\'은 절대자 혹은 천지신명에 가까운 존재로 나타나 있다. 그 점은 바로 민속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민속 신앙에서 ‘달’은 우리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던 전통적인 수호신적 성격을 갖고 있는 달로, 이 노래에서는 아내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도와주는 절대자의 의미가 함축되어있는 달이다. 이러한 달이기에 남편의 귀갓길과 아내의 마중길, 나아가 그들의 인생행로의 어둠을 물리치는 광명의 상징일 수도 있다.
또한 이 노래에 나오는 달은 원형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달은 찼다가는 기울고 다시 차는 속성으로, 분리와 합일, 충만함과 이지러짐의 이미지를 갖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속성으로 소망과 기원의 이미지도 내포한다. 그것은 월하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던 전통적인 달이기도 한다. 더구나, 이 노래에서는 달은 단순한 달이 아니라 남편의 안전을 빌고 있는 아내의 따뜻한 애정이 서려 있는 달이다. ‘달과 즌데’는 대칭 구조를 이루며, 끝 구절의 ‘내 가논데 졈그랄셰라 ’와 연결된다. 달이 지면 어둠이 차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와 남편사이에는 사랑의 절망이 오게 된다.
2.7. 쌍화점
2.7.1. 작품 개관
「雙花店」은 현재 『樂章歌詞』에 그 원문이 전해지고 그 첫머리의 가사를 따서 「쌍화점」이라 부른다. 또 『時用鄕樂譜』에는「雙花店」이라는 이름으로 순 한문으로 된 전혀 다른 내용의 가사와 악보가 실려 있다. 「쌍화점」의 제작 연대는 『高麗史』악지에 나오는 「三藏」과 「쌍화점」의 2연이 동일하여 연대를 충렬왕 때로 잡는다. 기록에 의하면 충렬왕이 宴樂을 즐겨 신하들이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남장별대(男粧別隊)에게 이 노래를 지어 가르쳤는데 이때의 분위기는 너무 난잡하여 임금과 신하의 구별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김선기(1996), 「고려가요」『한국문학개론』, 경인문화사, p.107
. 그러나 이 작품이 창작곡인지 민요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吳潛, 金元詳 등의 공동작 또는 이 중 어느 한 사람의 작품이라는 주장 정병욱(1977),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p.119
이 있고, 諸道 파견의 행신들이 민간의 속요를 채집하고 편사, 편곡한 노래로 규정 박노정(1990), 「쌍화점의 재조명」『고려가요의 연구』, 새문사, p.166
하는 경우가 있다. 속요의 많은 노래들처럼 쌍화점 또한 민간의 민요가 궁중으로 이입되어 현재의 형태로 다듬어졌다는 의견이 보편적이다.
2.7.2. 작품의 의미 분석
당시 고려 사회는 가부장적 부계친족 윤리를 강조한 조선의 유교 사회와는 달리,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 강화된 수평적 사회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았고, 여자의 재혼이나 재가가 사회적으로 비판받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남녀에게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허용되고 애정의 개방성이 극대화되어 서로의 감정을 주저 없이 토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었다.
「쌍화점」을 보면, 시적 화자(제1여인)는 쌍화점, 삼장사, 드레우물, 술집에 다녀온 일을 고백한다. 그 말을 들은 제2여인은 ‘긔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라고 하며 부러워하고, 이 부분은 제 2여인의 욕망을 드러내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거츠니 업다’ 는 말이 자랑스럽다는 의미에서의 ‘음란하다’라고 해석 될 경우 「쌍화점」의 음란성은 더 짙어진다. 이처럼 이 작품을 표층적 의미에서 보면, 고려 사회가 아무리 개방적인 사회라 하더라도 명백히 남녀 간의 음란한 애정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노래가 충렬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남장별대에 의해 연행되었다는 데서 음란성은 더 짙어진다.
A
B
C
D
1 연
쌍 화 점
쌍화매매
회회아비
삿기광대
2 연
삼 장 사
불 켜 기
사 주
삿기상좌
3 연
드레우물
물 깃 기
우 믓 용
드 레 박
4 연
술 집
술 매 매
짓 아 비
키워드
추천자료
 보현십원가에 관한 고찰
보현십원가에 관한 고찰 고전문학총정리 완결판
고전문학총정리 완결판 [분석/조사] 청록파와 조지훈
[분석/조사] 청록파와 조지훈  삼국유사수록 향가14수 고찰
삼국유사수록 향가14수 고찰 방송통신대학 1학기 국어 과목 출석수업대체시험 Text강좌
방송통신대학 1학기 국어 과목 출석수업대체시험 Text강좌 서경별곡 분석 및 고찰
서경별곡 분석 및 고찰 [고전문학][설화][고전][문학][소설][고전소설]고전문학과 설화, 고전문학과 장르, 고전문학...
[고전문학][설화][고전][문학][소설][고전소설]고전문학과 설화, 고전문학과 장르, 고전문학... 한림별곡 연구수업 교수-학습 지도안
한림별곡 연구수업 교수-학습 지도안 한국문학사정리
한국문학사정리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각 연령별로 동화책을 1권씩 선정하여 주요 줄거리와 이 책을...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각 연령별로 동화책을 1권씩 선정하여 주요 줄거리와 이 책을... [국문학개론]- 한국 시가 문학의 계보
[국문학개론]- 한국 시가 문학의 계보 대학면접(대학교면접시험질문답변)대학교면접예상질문 대학교면접 1분자기소개-서울대학교면...
대학면접(대학교면접시험질문답변)대학교면접예상질문 대학교면접 1분자기소개-서울대학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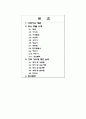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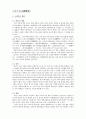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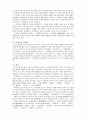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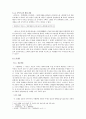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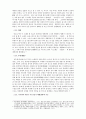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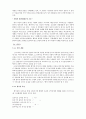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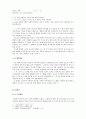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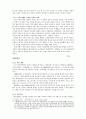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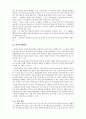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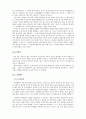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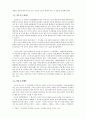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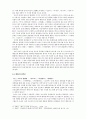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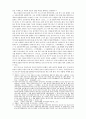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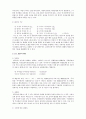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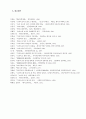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