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가지길 원하지만, 모두가 그 욕망을 드러내기를 거리끼는 이상한 존재다. 돈은 사람의 노동을 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복종하는 인간으로부터 영혼과 마음까지 빌릴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돈은 자본주의의 꽃이요. 자본주의 혈관을 흐르는 피다. 하지만 이 중요한 돈이라는 물건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된 철학적 사유를 시도하지 않았다. 막스 베버가 논증한 것은 자본이지 돈이 아니었고, 토마스 모어가 그린 역설적인 디스토피아의 세계관도 돈을 만들어 낸 체제를 사유했을 뿐, '돈' 그 자체를 다루지는 못했다. 드물게 '바타이유' 같은이가 섹스를 대상으로 삼고, 샤르트르와 보바르가 온몸으로 실존을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들이 탐구하는 것은 ‘인간’이었을 뿐, 변기나, 세면대. 장식장, 술, 담배와 같은 도구들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 도구들과 함께한다. 인간은 도구의 바탕위에 서 있고. 그것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결정적 요소다. 그 점에서 ‘게오르그 짐멜’의 철학은 돋보이다 못해 마치 거지예수처럼 자못 성스럽기까지하다. 짐멜의 철학은 늘 일상에 주제를 둔다. 그가 사유하는 대상은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는 일상들이고, 그것을 구성하는 도구들이다. 그래서 ‘돈’ 역시 그의 사유를 피해가지 못한다. 그는 돈을 두고 ‘돈은 인간의 탈인격화를 초래하지만, 대신 돈은 인간을 개체화 시키고 인격화 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용감한 말을 내 뱉고야 말았다. 돈이란 타인의 노동력을 사고, 내가 들여야 할 노동을 대신하게 함으로서 인간의 탈 개체화와 탈인격화를 초래하지만 돈이 있음으로 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의 결과를 섭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신탁’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돈을 가진 자는 노동에 종사할 시간에 음악을 즐기고 노래를 부르고, 여유를 가지며 지극히 인간적인 유토피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슬프지만 사실이다. 돈이란 인간이 노동력과 결합된 일종의 당위이자 신탁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돈을 얻기 위해 (과거에는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 노동을 한다. 이때 노동하는 인간은 탈 인격적이다. 인간의 고고한 이성적 유희를 수행할 시간과 여력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나의 노동을 누군가를 위해 제공한다는 것은 탈 개체적이다. 하지만 그것을 가진 자는 그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고, 이상적 인격체로 완성을 추구할 시간적 권리를 확보한다. 돈을 가진 그는 신탁으로 부여받은 ‘ 삶은 노동의 반대급부’라는 명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이런 철학적 사유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변방에 머무른다. 그는 독일철학에서도 비주류에 머물고 오늘날까지 철학사에 이름 한자리 올리지 못했다. 이유는 그가 금기시되는 돈을 철학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철학적 고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입지를 구축했지만, 그는 어디에서도 명함을 내밀 수 없었다. 물론 그 역시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키워드
추천자료
 인터넷쇼핑에서의 의복구매행동과 라이프스타일과의 관계 연구
인터넷쇼핑에서의 의복구매행동과 라이프스타일과의 관계 연구 독일의 선거제도와 한국의 선거제도를 통해본 지역주의와의 상관성
독일의 선거제도와 한국의 선거제도를 통해본 지역주의와의 상관성 신소설 명칭, 발생, 내용, 가치, 작품
신소설 명칭, 발생, 내용, 가치, 작품 미혼모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미혼모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0대 미혼모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을 위한 제언
10대 미혼모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을 위한 제언 (외국인노동자, 노동복지)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외국인노동자, 노동복지)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청소년 자살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살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 미래의 성에 관하여
미래의 성에 관하여 상식밖의 경제학을 읽고 - 변화하는 경제학의 패러다임
상식밖의 경제학을 읽고 - 변화하는 경제학의 패러다임 미혼모 복지
미혼모 복지 [세계의풍속과문화]한국남성과 동남아 여성의 국제결혼가족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적응과 갈등...
[세계의풍속과문화]한국남성과 동남아 여성의 국제결혼가족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적응과 갈등... 경제학 3.0을 읽고 - 변화하는 경제학 패러다임
경제학 3.0을 읽고 - 변화하는 경제학 패러다임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와 사회복지사의 기본자세에 대하여 서술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와 사회복지사의 기본자세에 대하여 서술 사회복지실천론 (40~67쪽읽고 느낀점)
사회복지실천론 (40~67쪽읽고 느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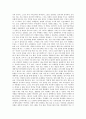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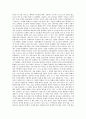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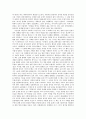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