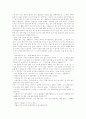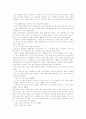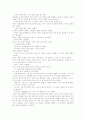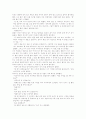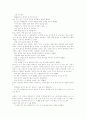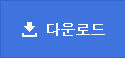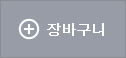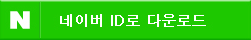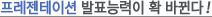목차
없음
본문내용
예, 여기가 남양동이라면."
"아마 틀림없는 남영동인 것 같군요." 내가 말했다.
사내가 앞장을 서고 안과 내가 그 뒤를 쫓아서 우리는 화재로부터 멀어져 갔다.
"빚 받으러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안이 사내에게 말했다.
"그렇지만 저는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느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다. 골목의 모퉁이를 몇 개인가 돌고 난 뒤에 사내는 대문 앞에 전등이 켜져 있는 집 앞에서 멈췄다. 나와 안은 사내로부터 열 발짝쯤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사내가 벨을 눌렀다. 잠시 후에 대문이 열리고, 사내가 대문 앞에 선 사람과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 아저씨를 뵙고 싶은데요."
"주무시는데요."
"그럼 아주머니는?"
"주무시는데요."
"꼭 뵈어야겠는데요.
"기다려 보세요."
대문이 다시 닫혔다. 안이 달려가서 사내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냥 가시죠?"
"괜찮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니까요."
안이 다시 먼저 서 있던 곳으로 걸어왔다. 대문이 열렸다.
"밤 늦게 죄송합니다." 사내가 대문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누구시죠?" 대문은 잠에 취한 여자의 음성을 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늦게 찾아와서 실은……."
"누구시죠? 술 취하신 것 같은데……."
"월부 책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하고, 사내는 비명 같은 높은 소리로 외쳤다.
"월부 책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이번엔 사내는 문기둥에 두 손을 짚고 앞으로 뻗은 자기 팔 위에 얼굴을 파묻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월부 책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월부 책값……."사내는 계속해서 흐느꼈다.
"내일 낮에 오세요."대문이 탕 닫혔다.
사내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사내는 가끔 '여보'라고 중얼거리며 오랫동안 울고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열 발짝쯤 떨어진 곳에서 그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 후에 그가 우리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왔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몹시 춥군요."라고 사내는 우리를 염려한다는 음성으로 말했다.
"추운데요. 빨리 여관으로 갑시다." 안이 말했다.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여관에 들어갔을 때 안이 우리에게 말했다.
"그게 좋겠지요?"
"모두 한방에 드는 게 좋겠어요."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서 말했다.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 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 더 좋았던 셈이었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모두 같은 방에 들기고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아주 피곤합니다.." 안이 말했다.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놉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하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안이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안이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사였다.
"예?"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 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역시 ……"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 습니다."
"사실이지요?"
"물론 그렇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밖의 이른 아침에는 싸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멀어져 갔다.
"난 그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이 말했다.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라고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의 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 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씨팔것,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 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는 짐작도 못 했으니까요. 씨팔것,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안은 눈을 맞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나도 그를 따라가서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김 형, 우리는 분명히 스물다섯 살짜리죠?"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도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기웃했다.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뭔가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겨우 스물다섯 살입니다." 나는 말했다.
"하여튼……"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으로 내어다 보니 안은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
"아마 틀림없는 남영동인 것 같군요." 내가 말했다.
사내가 앞장을 서고 안과 내가 그 뒤를 쫓아서 우리는 화재로부터 멀어져 갔다.
"빚 받으러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안이 사내에게 말했다.
"그렇지만 저는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느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다. 골목의 모퉁이를 몇 개인가 돌고 난 뒤에 사내는 대문 앞에 전등이 켜져 있는 집 앞에서 멈췄다. 나와 안은 사내로부터 열 발짝쯤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사내가 벨을 눌렀다. 잠시 후에 대문이 열리고, 사내가 대문 앞에 선 사람과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 아저씨를 뵙고 싶은데요."
"주무시는데요."
"그럼 아주머니는?"
"주무시는데요."
"꼭 뵈어야겠는데요.
"기다려 보세요."
대문이 다시 닫혔다. 안이 달려가서 사내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냥 가시죠?"
"괜찮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니까요."
안이 다시 먼저 서 있던 곳으로 걸어왔다. 대문이 열렸다.
"밤 늦게 죄송합니다." 사내가 대문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누구시죠?" 대문은 잠에 취한 여자의 음성을 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늦게 찾아와서 실은……."
"누구시죠? 술 취하신 것 같은데……."
"월부 책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하고, 사내는 비명 같은 높은 소리로 외쳤다.
"월부 책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이번엔 사내는 문기둥에 두 손을 짚고 앞으로 뻗은 자기 팔 위에 얼굴을 파묻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월부 책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월부 책값……."사내는 계속해서 흐느꼈다.
"내일 낮에 오세요."대문이 탕 닫혔다.
사내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사내는 가끔 '여보'라고 중얼거리며 오랫동안 울고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열 발짝쯤 떨어진 곳에서 그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 후에 그가 우리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왔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몹시 춥군요."라고 사내는 우리를 염려한다는 음성으로 말했다.
"추운데요. 빨리 여관으로 갑시다." 안이 말했다.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여관에 들어갔을 때 안이 우리에게 말했다.
"그게 좋겠지요?"
"모두 한방에 드는 게 좋겠어요."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서 말했다.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 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 더 좋았던 셈이었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모두 같은 방에 들기고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아주 피곤합니다.." 안이 말했다.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놉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하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안이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안이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사였다.
"예?"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 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역시 ……"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 습니다."
"사실이지요?"
"물론 그렇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밖의 이른 아침에는 싸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멀어져 갔다.
"난 그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이 말했다.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라고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의 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 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씨팔것,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 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는 짐작도 못 했으니까요. 씨팔것,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안은 눈을 맞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나도 그를 따라가서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김 형, 우리는 분명히 스물다섯 살짜리죠?"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도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기웃했다.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뭔가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겨우 스물다섯 살입니다." 나는 말했다.
"하여튼……"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으로 내어다 보니 안은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