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2.
사귐과 마장
II.
본론
II-3.
틈과 마장
II-1.
믿음과 마장
III.
결론
서론
II-2.
사귐과 마장
II.
본론
II-3.
틈과 마장
II-1.
믿음과 마장
III.
결론
본문내용
군자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거짓된 ‘믿음’으로 벗을 사귀거나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III. 결론
지금까지 연암 박지원의 「마장전(馬傳)」에서 제목인 ‘마장(馬)’이 지니는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두부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마장(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한다. 전개부로 나아가서는 세 광인(狂人)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 군자의 ‘사귐’에 대비되는 선비들의 ‘사귐’을 ‘마장(馬)’의 행태에 보이지 않게 비유함으로써 허위에 찬 ‘사귐’을 비판한다. 그리고 결말부에서는 골계선생(滑稽先生)의 우정론(友情論)을 통해 ‘틈’과 그 ‘틈’을 채울 수 있는 ‘믿음’과 ‘아첨’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아첨’으로 ‘사귐’에 임하는 것이 ‘마장(馬)’의 야비한 수법과 같다며 그것을 경계할 것을 경고한다. 이로써 「마장전(馬傳)」에서 제목인 ‘마장(馬)’은 단순하게 소설 첫 부분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 사이의 ‘틈’을 채우는 군자다운 ‘사귐’에 반대되는 선비들의 모습을 고도로 비유함으로써 그들을 비판하기 위한 작자의 의도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 ‘마장(馬)’은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야 하고(‘사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해야 하며(‘틈’), 신용으로써 그 고객들을 상대해야 한다(‘믿음’)는 직업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작자가 각 부분에서 이야기 하고자 했던 ‘믿음’, ‘사귐’, ‘틈’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소설의 구성이 치밀하게 연계되는데도 한 몫하고 있다.
이렇게 「마장전(馬傳)」에서 작품과 작품의 제목이 어떤 관계로 엮어져 있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작품의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너무 간과한 점과 본문을 자세히 다루지 못해 논의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또한 「마장전(馬傳)」이 쓰였을 당시의 모습이나 연암 박지원의 견해를 살피지 못하고 텍스트 자체만으로 미흡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도 안타깝게 생각된다.
그러나 「마장전(馬傳)」에서 제목인 ‘마장(馬)’이 작품의 첫 부분을 차용했을 뿐이고 작품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종전의 통념을 뒤집어 생각해 보았을 때, 작품과 제목 간의 관련성을 조금이나마 찾아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여기며 아쉬운대로 연구를 마친다.
III. 결론
지금까지 연암 박지원의 「마장전(馬傳)」에서 제목인 ‘마장(馬)’이 지니는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두부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마장(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한다. 전개부로 나아가서는 세 광인(狂人)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 군자의 ‘사귐’에 대비되는 선비들의 ‘사귐’을 ‘마장(馬)’의 행태에 보이지 않게 비유함으로써 허위에 찬 ‘사귐’을 비판한다. 그리고 결말부에서는 골계선생(滑稽先生)의 우정론(友情論)을 통해 ‘틈’과 그 ‘틈’을 채울 수 있는 ‘믿음’과 ‘아첨’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아첨’으로 ‘사귐’에 임하는 것이 ‘마장(馬)’의 야비한 수법과 같다며 그것을 경계할 것을 경고한다. 이로써 「마장전(馬傳)」에서 제목인 ‘마장(馬)’은 단순하게 소설 첫 부분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 사이의 ‘틈’을 채우는 군자다운 ‘사귐’에 반대되는 선비들의 모습을 고도로 비유함으로써 그들을 비판하기 위한 작자의 의도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 ‘마장(馬)’은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야 하고(‘사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해야 하며(‘틈’), 신용으로써 그 고객들을 상대해야 한다(‘믿음’)는 직업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작자가 각 부분에서 이야기 하고자 했던 ‘믿음’, ‘사귐’, ‘틈’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소설의 구성이 치밀하게 연계되는데도 한 몫하고 있다.
이렇게 「마장전(馬傳)」에서 작품과 작품의 제목이 어떤 관계로 엮어져 있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작품의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너무 간과한 점과 본문을 자세히 다루지 못해 논의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또한 「마장전(馬傳)」이 쓰였을 당시의 모습이나 연암 박지원의 견해를 살피지 못하고 텍스트 자체만으로 미흡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도 안타깝게 생각된다.
그러나 「마장전(馬傳)」에서 제목인 ‘마장(馬)’이 작품의 첫 부분을 차용했을 뿐이고 작품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종전의 통념을 뒤집어 생각해 보았을 때, 작품과 제목 간의 관련성을 조금이나마 찾아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여기며 아쉬운대로 연구를 마친다.
추천자료
 루터와 쯔빙글리의 성만찬 논쟁이 지니는 교회 정치적 의미
루터와 쯔빙글리의 성만찬 논쟁이 지니는 교회 정치적 의미 아동기탄생 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지니는 교육사상적 의미
아동기탄생 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지니는 교육사상적 의미 광종 9년 과거제 시행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
광종 9년 과거제 시행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 1910년대 연극환경 및 신파극과 전통연희의 상호연관성의 연극사적 의미
1910년대 연극환경 및 신파극과 전통연희의 상호연관성의 연극사적 의미 대립어의 의미특성
대립어의 의미특성 [건축/예술] 이 시대의 건축의 의미와 한계
[건축/예술] 이 시대의 건축의 의미와 한계 오수벨의 유의미학습론
오수벨의 유의미학습론 통사론(문장론, 구문론)의 구조, 부사절의 통사구조, -이-의 통사구조와 의미기능, -시-의 통...
통사론(문장론, 구문론)의 구조, 부사절의 통사구조, -이-의 통사구조와 의미기능, -시-의 통...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례 의미 한계 보고서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실제, 제3섹터, 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례 의미 한계 보고서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실제, 제3섹터, 사회서비스...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봉사자와 수혜자의 두 차원에서 설명하시오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봉사자와 수혜자의 두 차원에서 설명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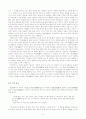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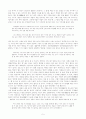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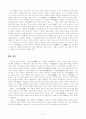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