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농암의 시가와 생애
3. 농암의 작품세계
4. 농암 시가의 문학사적 위상
5. 맺음말
2. 농암의 시가와 생애
3. 농암의 작품세계
4. 농암 시가의 문학사적 위상
5. 맺음말
본문내용
림파를 둘로 나눌 수 있다. 급진적 성격의 조광조 계열은 제도개혁을 통한 因習과 舊制의 革去를 추진했고, 온건한 성격의 金安國 계열은 실용주의적 성향을 띠고 성리학적 윤리질서 정착을 위한 교육과 통치 여건 개선을 추진했던 것이다.
사림파의 개혁 추진이 체제 개혁과 사회적 분위기 쇄신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훈구파의 지배기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 끝에, 양자 간의 갈등은 士禍로 이어져 대부분의 사림파가 失勢하고 개혁정치도 원점으로 회귀하였다. 己卯士禍로 인해 사림파의 핵심 인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련 인물까지 중앙 정계에서 내몰리고 말았다. 이후의 정국은 사화의 장본인인 南袞, 沈貞, 洪景舟를 중심으로 훈구파에 의해 주도되었고, 사림파의 일부가 잔존해 있기는 했으나 일각에 고립-분산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권신들이 차례로 죽고 金安老마저 실각한 뒤 1544년(중종 32)에 이르러 김안국, 金正國, 曺繼商 등이 재서용되고 權撥, 李彦迪 등과 더불어 구심점을 형성하면서 사림파는 다시금 신장세를 보이게 되었다. 이들에 의해 기묘사화 당시 희생되었던 이들의 伸寃이 이루어졌고, 小學 교육이 장려되는 동시에 鄕約이 시행되는 등 과거의 개혁론이 다시 제기되었다. 중종말의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후대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중앙정부 내에서 사림파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었다.
明宗代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정치적 변란이 일어나 乙巳士禍 이후 대부분의 사림파가 정계에서 도태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림파는 향촌에서 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면서 차세대를 준비했고, 재지사림 세력 결집의 구심점으로 서원을 건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2.2. 농암의 생애
號를 농암, 字를 仲이라 하는 이현보는 1467년(세조 13) 7월 29일에 禮安 汾川里에서 태어났다. 家系를 살펴보면 본관은 永川이고 高祖부터 예안에 卜居하였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고조 軒은 奉善大夫로 軍器寺少尹, 曾祖 坡는 朝散大夫 義興縣監을 지냈고 祖父 孝孫은 宣敎郞으로 通禮門奉禮였다. 父 欽은 中訓大夫로 麟蹄縣監을 지냈다. (정재호, 李賢輔論,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편, 聾巖 李賢輔의 文學과 思想, 형설출판사, 1992, 38쪽)
전형적인 士大夫家로 농암 역시 마찬가지였다. 농암의 생을 세 단계로 구분하면 1467년(세조 13)부터 1497(연산군 3)까지의 成長修學期, 1498년(연산군 4)부터 1542(중종 37)까지의 出仕官僚期, 1543(중종 38년)부터 1555(명종 10년)까지의 致仕退休期로 나눌 수 있다. 정영문, 농암의 문학에 나타난 자연관, 온지논총2집, 온지학회, 1996, 85~86쪽.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농암은 태어나서부터 才智가 뛰어났다. 9세에 入學하였으나 초년에는 志氣가 호탕하여 학문에 전념하지 않다가 19세에 鄕校에 들어 비로소 정진하였고, 20세에는 洪貴達의 문하에서 수학하게 되었다.
29세에 生員試에서 二等으로 합격하고 32세에 大科에 급제하면서 校書館 權知副正字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농암의 생애 동안 일어난 네 차례의 士禍 戊午士禍는 농암이 32세로 登科하던 때, 甲子士禍는 38세로 春秋館記書官으로 있을 때, 乙卯士禍는 53세로 安東府使에 있을 때, 乙巳士禍는 79세 때였다.
가운데 특히 그의 신변에 영향을 끼쳤던 것은 甲子士禍라 할 수 있다. 1504년(연산군 10) 司諫院 正言으로 있었던 38세의 농암은 그 스스로 直筆한 史草가 연산군의 노여움을 사 안동 安奇縣으로 유배되었다. 이 무렵의 정치적 어려움이 혼탁한 정치현실로부터 벗어나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歸去來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가 풀려난 것은 중종반정(1506)이 일어난 40세 때였는데, 성균관 典籍으로 還朝했다가 2년 후 42세 때 어버이를 모시기 위해 外職을 청하여 永川郡守로 부임하게 되었다. 44세에 明農堂을 지어 歸去來圖를 걸어 두었고 46세에 聾巖 위에 愛日堂을 건립했다. 47세에 다시 內職으로 옮겼다가 이듬해에 다시 密陽府使가 되었으며, 52세에 安東府使로 있으면서 평생의 知音인 退溪 李滉을 만났다. 농암이 평생 가장 가까이 지낸 사람이 바로 퇴계와 孫壻인 黃仲擧였으니, 농암이 시를 주고받은 인물로는 松齋 李, 溫溪 李瀣, 慕齋 金安國, 訥齋 朴祥, 愼齋 周世鵬, 晦齋 李彦迪, 灌圃 魚得江, 暘谷 蘇世讓 등 당대의 명사들이 있었으며 특히 퇴계와 주고받은 시문이 많이 남아 있다.
이때의 만남은 그의 일생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농암은 그 이후로도 오랜 기간 동안 忠州牧使, 星州牧使, 平海郡守, 慶州府尹, 弘文館 副提學, 慶尙道觀察使, 戶曹參判 등 여러 벼슬을 두루 역임하다가 76세에 병을 이유로 귀향하여 89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고향 예안에서 지기들과 교류하며 유유자적한 생애를 보냈다. 농암 스스로 임종시에 “내 나이 90에 이르렀고,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며, 너희들이 모두 있어서 전혀 餘憾이 없으니 죽음 또한 영광스럽다” 李滉, 行狀, 聾巖先生文集, 卷之四, 附錄, “臨終諸者環侍泣 公顧謂曰 吾年至九十愛國厚恩 汝等皆在 百無餘憾 死亦榮矣”
는 말을 남겼다. 죽음에 임하여 생을 되돌아 보고 스스로 후회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았음을 말한 것이다. 또한 농암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근세 이름난 卿大夫 중에서 公은 복과 덕을 겸비하여 능히 晩年을 온전하게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정영문, 앞의 논문, 97쪽.
농암의 諡號는 孝節公이다.
3. 聾巖의 作品世界
3.1. <效歌>, <聾巖歌>, <生日歌>
아래 차례대로 제시하는 <효빈가>, <농암가>, <생일가>는 농암이 순수 창작한 시조 작품들로 聾巖文集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을 함께 ‘歸田錄’이라고도 한다. 농암 자신이 남긴 幷序에서 “늙은이의 나이가 이제 87세로 致仕하여 한가롭게 지낸 지 12년이 지났는데, 그 만면의 去就와 逸樂의 자취가 이 세 단가에 다 나타나 있기에 글로 써서 스스로 자랑하노라” “翁誌年今八十七歲 致仕投閒過一紀 其晩年去就逸樂行迹 盡于次三短歌 聯書以自誇云.”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세 편의 시조 작품이 그의 만년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效嚬歌>
歸去來 歸去來 말뿐이오 가리업
사림파의 개혁 추진이 체제 개혁과 사회적 분위기 쇄신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훈구파의 지배기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 끝에, 양자 간의 갈등은 士禍로 이어져 대부분의 사림파가 失勢하고 개혁정치도 원점으로 회귀하였다. 己卯士禍로 인해 사림파의 핵심 인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련 인물까지 중앙 정계에서 내몰리고 말았다. 이후의 정국은 사화의 장본인인 南袞, 沈貞, 洪景舟를 중심으로 훈구파에 의해 주도되었고, 사림파의 일부가 잔존해 있기는 했으나 일각에 고립-분산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권신들이 차례로 죽고 金安老마저 실각한 뒤 1544년(중종 32)에 이르러 김안국, 金正國, 曺繼商 등이 재서용되고 權撥, 李彦迪 등과 더불어 구심점을 형성하면서 사림파는 다시금 신장세를 보이게 되었다. 이들에 의해 기묘사화 당시 희생되었던 이들의 伸寃이 이루어졌고, 小學 교육이 장려되는 동시에 鄕約이 시행되는 등 과거의 개혁론이 다시 제기되었다. 중종말의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후대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중앙정부 내에서 사림파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었다.
明宗代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정치적 변란이 일어나 乙巳士禍 이후 대부분의 사림파가 정계에서 도태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림파는 향촌에서 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면서 차세대를 준비했고, 재지사림 세력 결집의 구심점으로 서원을 건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2.2. 농암의 생애
號를 농암, 字를 仲이라 하는 이현보는 1467년(세조 13) 7월 29일에 禮安 汾川里에서 태어났다. 家系를 살펴보면 본관은 永川이고 高祖부터 예안에 卜居하였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고조 軒은 奉善大夫로 軍器寺少尹, 曾祖 坡는 朝散大夫 義興縣監을 지냈고 祖父 孝孫은 宣敎郞으로 通禮門奉禮였다. 父 欽은 中訓大夫로 麟蹄縣監을 지냈다. (정재호, 李賢輔論,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편, 聾巖 李賢輔의 文學과 思想, 형설출판사, 1992, 38쪽)
전형적인 士大夫家로 농암 역시 마찬가지였다. 농암의 생을 세 단계로 구분하면 1467년(세조 13)부터 1497(연산군 3)까지의 成長修學期, 1498년(연산군 4)부터 1542(중종 37)까지의 出仕官僚期, 1543(중종 38년)부터 1555(명종 10년)까지의 致仕退休期로 나눌 수 있다. 정영문, 농암의 문학에 나타난 자연관, 온지논총2집, 온지학회, 1996, 85~86쪽.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농암은 태어나서부터 才智가 뛰어났다. 9세에 入學하였으나 초년에는 志氣가 호탕하여 학문에 전념하지 않다가 19세에 鄕校에 들어 비로소 정진하였고, 20세에는 洪貴達의 문하에서 수학하게 되었다.
29세에 生員試에서 二等으로 합격하고 32세에 大科에 급제하면서 校書館 權知副正字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농암의 생애 동안 일어난 네 차례의 士禍 戊午士禍는 농암이 32세로 登科하던 때, 甲子士禍는 38세로 春秋館記書官으로 있을 때, 乙卯士禍는 53세로 安東府使에 있을 때, 乙巳士禍는 79세 때였다.
가운데 특히 그의 신변에 영향을 끼쳤던 것은 甲子士禍라 할 수 있다. 1504년(연산군 10) 司諫院 正言으로 있었던 38세의 농암은 그 스스로 直筆한 史草가 연산군의 노여움을 사 안동 安奇縣으로 유배되었다. 이 무렵의 정치적 어려움이 혼탁한 정치현실로부터 벗어나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歸去來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가 풀려난 것은 중종반정(1506)이 일어난 40세 때였는데, 성균관 典籍으로 還朝했다가 2년 후 42세 때 어버이를 모시기 위해 外職을 청하여 永川郡守로 부임하게 되었다. 44세에 明農堂을 지어 歸去來圖를 걸어 두었고 46세에 聾巖 위에 愛日堂을 건립했다. 47세에 다시 內職으로 옮겼다가 이듬해에 다시 密陽府使가 되었으며, 52세에 安東府使로 있으면서 평생의 知音인 退溪 李滉을 만났다. 농암이 평생 가장 가까이 지낸 사람이 바로 퇴계와 孫壻인 黃仲擧였으니, 농암이 시를 주고받은 인물로는 松齋 李, 溫溪 李瀣, 慕齋 金安國, 訥齋 朴祥, 愼齋 周世鵬, 晦齋 李彦迪, 灌圃 魚得江, 暘谷 蘇世讓 등 당대의 명사들이 있었으며 특히 퇴계와 주고받은 시문이 많이 남아 있다.
이때의 만남은 그의 일생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농암은 그 이후로도 오랜 기간 동안 忠州牧使, 星州牧使, 平海郡守, 慶州府尹, 弘文館 副提學, 慶尙道觀察使, 戶曹參判 등 여러 벼슬을 두루 역임하다가 76세에 병을 이유로 귀향하여 89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고향 예안에서 지기들과 교류하며 유유자적한 생애를 보냈다. 농암 스스로 임종시에 “내 나이 90에 이르렀고,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며, 너희들이 모두 있어서 전혀 餘憾이 없으니 죽음 또한 영광스럽다” 李滉, 行狀, 聾巖先生文集, 卷之四, 附錄, “臨終諸者環侍泣 公顧謂曰 吾年至九十愛國厚恩 汝等皆在 百無餘憾 死亦榮矣”
는 말을 남겼다. 죽음에 임하여 생을 되돌아 보고 스스로 후회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았음을 말한 것이다. 또한 농암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근세 이름난 卿大夫 중에서 公은 복과 덕을 겸비하여 능히 晩年을 온전하게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정영문, 앞의 논문, 97쪽.
농암의 諡號는 孝節公이다.
3. 聾巖의 作品世界
3.1. <效歌>, <聾巖歌>, <生日歌>
아래 차례대로 제시하는 <효빈가>, <농암가>, <생일가>는 농암이 순수 창작한 시조 작품들로 聾巖文集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을 함께 ‘歸田錄’이라고도 한다. 농암 자신이 남긴 幷序에서 “늙은이의 나이가 이제 87세로 致仕하여 한가롭게 지낸 지 12년이 지났는데, 그 만면의 去就와 逸樂의 자취가 이 세 단가에 다 나타나 있기에 글로 써서 스스로 자랑하노라” “翁誌年今八十七歲 致仕投閒過一紀 其晩年去就逸樂行迹 盡于次三短歌 聯書以自誇云.”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세 편의 시조 작품이 그의 만년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效嚬歌>
歸去來 歸去來 말뿐이오 가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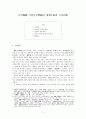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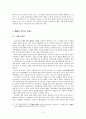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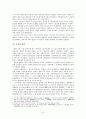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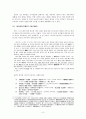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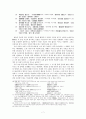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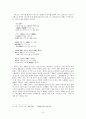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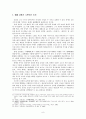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