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89:198)을 참고하면 ‘-기’ 구성은 ‘십상’과 ‘마련’에만 관련된다고 보겠다. 말하자면 ‘-기 때문이다’와 같은 의존명사 구성으로 본다는 것이다. 임홍빈(1989:198)에서 ‘-게 마련이다’에서 ‘-게’ 구성은 ‘마련이다’란 전체 서술어에 대한 부사적 성분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게 마련이다’의 ‘마련이다’는 보조용언으로 간주한다.
‘-기 쉽다’의 경우는 “철수가 파리를 잡기(가) 쉽다”와 같은 이른바 tough 구문에서는 어휘 의미가 본용언의 구체적인 ‘易’의 의미 그대로 쓰인다고 생각되므로 보조용언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만 “그가 집에 갔기 쉽다”에서의 ‘쉽다’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쉽다’의 경우 “이 시가 읽기 쉽다”라는 tough 구문과 “이 시가 쉽다”의 구문에서 ‘쉽다’의 의미는 동일하게 인식된다. 따라서 용이성을 나타내는 tough 구문에서의 ‘쉽다’는 보조용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철수는 쉽다, 파리를 잡기가.”와 같은 문장과 “철수는 파리를 잡기(가), 영수는 모기를 잡기(가) 쉽다.”와 같은 문장이 성립한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 이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쉽다’에 있어서도 마찬가로 적용된다. 임홍빈(1985)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적어도 두 어휘는 내포문의 성격이 정태적이냐 동태적이냐에 따라 유사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수는 집에 갔기가, 영희는 계속을 일을 했기가 쉽다.”라든가 “?철수는 쉽다, 집에 갔기가.”가 용인 가능한 것은 내포문에 통사론적으로 강하게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애초에 설정했던 (o)형은 보조용언 목록에서 제외된다.
(b)형의 ‘하다’와 (l)형의 경우 의미 추상화가 심하게 일어나 거의 자신의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이다. 즉 (52), (53)은 각각 ‘없으니, 가면, 없으니’의 의미가 강조된 정도로 이해된다.
(52)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 여기에 자리를 폅시다.
(53) 이 길로 가다(가) 보면 서울역이 나옵니다.
이들을 모두 보조용언으로 인정하느냐 후치사 혹은 보조사로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언어 기술상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즉 문법화의 연속 단계에 있는 것들을 어느 한 부류에 집어 넣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의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후치사 혹은 보조사로 처리하기로 한다. 어디까지나 보조용언은 서술성을 아직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지고, -다가’를 후치사 혹은 보조사로 이해한 것과 동일한 입장이다. 또 아래 (l)형과 동궤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54)와 (n)형인 (55)의 경우는 접속문이라고 판단되므로 역시 보조용언에서 제외한다. 표준어의 ‘-면’은 실제 발화에서는 ‘-믄’으로 실현된다. 그것의 축약형은 ‘-ㅁ’인데 (54)에서 “갔담”의 ‘-ㅁ’도 그와 동일한 요소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54) 그가 집에 갔담 봐라.
(55) 배가 고프다 못해 속이 쓰리다.
‘-곤 하다’의 경우 ‘-곤하’를 하나의 상 표시 기능 범주로 볼 수도 있겠으나(특히 국어에서 ‘-곤’이라는 연결어미가 다른 데에서는 쓰이지 않는 사실을 보아), 국어의 상 표시는 기능 범주에 의존하기보다는 보조용언에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보조용언으로 간주함으로써 체계적인 처리를 시도했다. 필자의 직관으로는 ‘-곤 하다’는 ‘-고는 하다’가 줄어서 된 형식으로 이해된다. 국어에서 ‘-고는’은 어떤 행위가 끝나고 다음 행위가 곧바로 시작될 때 그 두 행위를 연결하는 자리에 쓰이는데(“그는 밥을 먹고는 곧바로 잠을 잤다.”), 포괄동사 ‘하다’가 그대로 선행 동사를 ‘대용’(엄밀한 의미에서는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할 때, 같은 행위를 연속으로 함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반복상적 의미가 일정한 시간 틀 내에서 확대되어 쓰이면 습관상이 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중세국어 어형은 ‘-곰다’였다. 그 형식에 쓰인 ‘-ㅁ’도 반복을 나타내는 일종의 화석인데(예컨대 ‘니니’를 참조하라) 이 ‘-ㅁ’이 현대에 ‘-ㄴ’으로 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보한다. 적어도 공시적으로는 우리의 해석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 12)에서의 ‘-ㅁ직하다’도 마찬가지였음을 덧붙여 둔다.
따라서 이 절에서 논의한 바를 종합하면 보조용언의 목록은 다음과 같이 재정리될 수 있다. (i), (j), (l), (n), (o)형은 삭제되었다.
(a) -아/어 + {가다, 계시다, 나가다, 내다, 놓다, 대다, 두다, 드리다, 먹다, 버릇하다, 버리다, 보다, 빠지다, 쌓다, 오다, 있다, 주다, 지다, 치우다, 하다, 마땅하다, 마지아니하다(마지않다)}
(b) -고 + {계시다, 나다, 말다, 싶다, 앉다, 있다, 자빠지다}
(c) -지 + {아니하다(않다), 못하다, 말다}
(d) -게 + {생기다, 굴다, 마련이다}
(e) 종결어미 + {보다, 싶다, 하다}
(f) -기 + 보조사 + {하다}
(g) -어야 + {하다}
(h) -려(고)-고자 + {하다, 들다}
(k) 인용 보문소 + {하다, 치다}
(m) -면 + {하다, 싶다}
(p) -거니-려니 + {하다, 싶다}
(q) -곤 + {하다}
위에서 알 수 있는 바는 국어의 보조용언은 이른바 부사형 어미라고 하는 ‘-아/어, -고, -지, -게’와 통합하는 것과 종결어미와 통합하는 것이 대종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유형은 보조용언의 목록 속에 포함되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보조용언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의사(擬似) 보조용언이라고 할 수도 있는 ‘하다’가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도 자연히 (a)-(e)형에 집중될 것이다.
요컨대 우리의 보조용언 설정 기준은 최현배(1961)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존성’(dependency)으로 집약된다. 그러나 기존 논의에서는 보조용언의 의존성이 음운론적 의존성을 언급한 성격이 강한 데 반해 우리는 통사론적 의존성을 더 중요시한다. 그와 함께 부차적인 기준으로 의미적 추상화도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출처 http://kang.chungbuk.ac.kr/zbxe/7247
‘-기 쉽다’의 경우는 “철수가 파리를 잡기(가) 쉽다”와 같은 이른바 tough 구문에서는 어휘 의미가 본용언의 구체적인 ‘易’의 의미 그대로 쓰인다고 생각되므로 보조용언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만 “그가 집에 갔기 쉽다”에서의 ‘쉽다’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쉽다’의 경우 “이 시가 읽기 쉽다”라는 tough 구문과 “이 시가 쉽다”의 구문에서 ‘쉽다’의 의미는 동일하게 인식된다. 따라서 용이성을 나타내는 tough 구문에서의 ‘쉽다’는 보조용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철수는 쉽다, 파리를 잡기가.”와 같은 문장과 “철수는 파리를 잡기(가), 영수는 모기를 잡기(가) 쉽다.”와 같은 문장이 성립한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 이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쉽다’에 있어서도 마찬가로 적용된다. 임홍빈(1985)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적어도 두 어휘는 내포문의 성격이 정태적이냐 동태적이냐에 따라 유사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수는 집에 갔기가, 영희는 계속을 일을 했기가 쉽다.”라든가 “?철수는 쉽다, 집에 갔기가.”가 용인 가능한 것은 내포문에 통사론적으로 강하게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애초에 설정했던 (o)형은 보조용언 목록에서 제외된다.
(b)형의 ‘하다’와 (l)형의 경우 의미 추상화가 심하게 일어나 거의 자신의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이다. 즉 (52), (53)은 각각 ‘없으니, 가면, 없으니’의 의미가 강조된 정도로 이해된다.
(52)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 여기에 자리를 폅시다.
(53) 이 길로 가다(가) 보면 서울역이 나옵니다.
이들을 모두 보조용언으로 인정하느냐 후치사 혹은 보조사로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언어 기술상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즉 문법화의 연속 단계에 있는 것들을 어느 한 부류에 집어 넣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의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후치사 혹은 보조사로 처리하기로 한다. 어디까지나 보조용언은 서술성을 아직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지고, -다가’를 후치사 혹은 보조사로 이해한 것과 동일한 입장이다. 또 아래 (l)형과 동궤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54)와 (n)형인 (55)의 경우는 접속문이라고 판단되므로 역시 보조용언에서 제외한다. 표준어의 ‘-면’은 실제 발화에서는 ‘-믄’으로 실현된다. 그것의 축약형은 ‘-ㅁ’인데 (54)에서 “갔담”의 ‘-ㅁ’도 그와 동일한 요소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54) 그가 집에 갔담 봐라.
(55) 배가 고프다 못해 속이 쓰리다.
‘-곤 하다’의 경우 ‘-곤하’를 하나의 상 표시 기능 범주로 볼 수도 있겠으나(특히 국어에서 ‘-곤’이라는 연결어미가 다른 데에서는 쓰이지 않는 사실을 보아), 국어의 상 표시는 기능 범주에 의존하기보다는 보조용언에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보조용언으로 간주함으로써 체계적인 처리를 시도했다. 필자의 직관으로는 ‘-곤 하다’는 ‘-고는 하다’가 줄어서 된 형식으로 이해된다. 국어에서 ‘-고는’은 어떤 행위가 끝나고 다음 행위가 곧바로 시작될 때 그 두 행위를 연결하는 자리에 쓰이는데(“그는 밥을 먹고는 곧바로 잠을 잤다.”), 포괄동사 ‘하다’가 그대로 선행 동사를 ‘대용’(엄밀한 의미에서는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할 때, 같은 행위를 연속으로 함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반복상적 의미가 일정한 시간 틀 내에서 확대되어 쓰이면 습관상이 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중세국어 어형은 ‘-곰다’였다. 그 형식에 쓰인 ‘-ㅁ’도 반복을 나타내는 일종의 화석인데(예컨대 ‘니니’를 참조하라) 이 ‘-ㅁ’이 현대에 ‘-ㄴ’으로 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보한다. 적어도 공시적으로는 우리의 해석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 12)에서의 ‘-ㅁ직하다’도 마찬가지였음을 덧붙여 둔다.
따라서 이 절에서 논의한 바를 종합하면 보조용언의 목록은 다음과 같이 재정리될 수 있다. (i), (j), (l), (n), (o)형은 삭제되었다.
(a) -아/어 + {가다, 계시다, 나가다, 내다, 놓다, 대다, 두다, 드리다, 먹다, 버릇하다, 버리다, 보다, 빠지다, 쌓다, 오다, 있다, 주다, 지다, 치우다, 하다, 마땅하다, 마지아니하다(마지않다)}
(b) -고 + {계시다, 나다, 말다, 싶다, 앉다, 있다, 자빠지다}
(c) -지 + {아니하다(않다), 못하다, 말다}
(d) -게 + {생기다, 굴다, 마련이다}
(e) 종결어미 + {보다, 싶다, 하다}
(f) -기 + 보조사 + {하다}
(g) -어야 + {하다}
(h) -려(고)-고자 + {하다, 들다}
(k) 인용 보문소 + {하다, 치다}
(m) -면 + {하다, 싶다}
(p) -거니-려니 + {하다, 싶다}
(q) -곤 + {하다}
위에서 알 수 있는 바는 국어의 보조용언은 이른바 부사형 어미라고 하는 ‘-아/어, -고, -지, -게’와 통합하는 것과 종결어미와 통합하는 것이 대종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유형은 보조용언의 목록 속에 포함되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보조용언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의사(擬似) 보조용언이라고 할 수도 있는 ‘하다’가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도 자연히 (a)-(e)형에 집중될 것이다.
요컨대 우리의 보조용언 설정 기준은 최현배(1961)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존성’(dependency)으로 집약된다. 그러나 기존 논의에서는 보조용언의 의존성이 음운론적 의존성을 언급한 성격이 강한 데 반해 우리는 통사론적 의존성을 더 중요시한다. 그와 함께 부차적인 기준으로 의미적 추상화도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출처 http://kang.chungbuk.ac.kr/zbxe/7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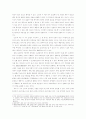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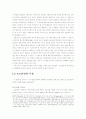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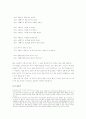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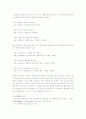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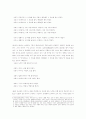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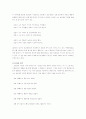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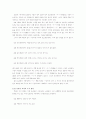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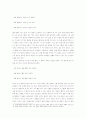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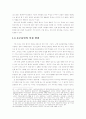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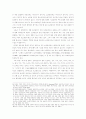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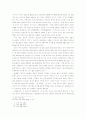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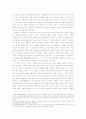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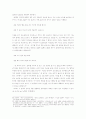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