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 일부 있다. 일단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지혜롭지 않은 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 후 신이 자신을 가장 지혜로운 이로 칭하자, 이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많은 이들을 만나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지함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의미에 대해 깨닫는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정의한 무지라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지혜가 있음에도 그것은 신이 아닌 인간의 지혜이기에 가치가 없다는 것인가? 전자의 정의가 맞다면, ‘무지를 아는 것’은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인정하는 자세’인 것이고, 후자의 정의가 맞다면, ‘지혜가 있음에도 그것의 무가치함을 아는 것’일 터이다. 무소유가 최상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소유의 무소유화가 최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의 문제인 듯 보인다. 결론적으로는 변론에서 두 가지의 정의 모두가 양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지혜에 대해서는 겸손할 줄 아는 자세, 그리고 신의 지혜가 절대적인 것이고, 인간의 지혜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이가 바로 ‘자신의 무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소크라테스에 제기되는 모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질문인 ‘어떻게 스스로 지혜롭지 않다고 하는 사람(소크라테스)이 다른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도 쉽게 답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지혜롭지 않은 자’란 지혜가 아주 없는 무지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자세와, 신이 아닌 인간의 지혜의 무가치함에 대한 깨달음을 동시에 갖춘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모두 갖춘 소크라테스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검토하고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셈이다. 역설적으로 결코 무지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3)지혜에 관한 소크라테스의 태도 짐작해보기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신의 지혜는 따라갈 수 없었기에 인간적인 지혜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은 쉬웠으나,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한 무지함은 계속해서 채워나간다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즉, 소크라테스가 자신, 혹은 더 나아가 인간의 무지함에 대해 깨달았다면, 왜 그 무지함을 ‘지(知)’로 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다녔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멜레토스에게
(2)소크라테스에 제기되는 모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질문인 ‘어떻게 스스로 지혜롭지 않다고 하는 사람(소크라테스)이 다른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도 쉽게 답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지혜롭지 않은 자’란 지혜가 아주 없는 무지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자세와, 신이 아닌 인간의 지혜의 무가치함에 대한 깨달음을 동시에 갖춘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모두 갖춘 소크라테스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검토하고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셈이다. 역설적으로 결코 무지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3)지혜에 관한 소크라테스의 태도 짐작해보기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신의 지혜는 따라갈 수 없었기에 인간적인 지혜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은 쉬웠으나,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한 무지함은 계속해서 채워나간다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즉, 소크라테스가 자신, 혹은 더 나아가 인간의 무지함에 대해 깨달았다면, 왜 그 무지함을 ‘지(知)’로 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다녔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멜레토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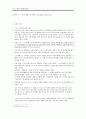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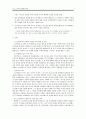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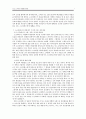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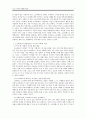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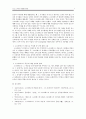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