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서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주희가 만든 학설로 받아 들일 뿐, 주희의 주장에 대해 반박해서 멸시받았던 조선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중국에서는 심원하고 난해한 학문 분파라고 칭했고 수입한 조선에서는 신진사대부들이 그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학은 여러 주제에 대해 실질적인 발전을 주장했지만 성리학 중심의 관료들은 천한 것으로 생각하기 일쑤였으며 그들이 논하는 것을 미루어 보면 알 수 있듯이 실학의 인간의 삶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는 악(惡)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렇게 성리학자들은 실학에 대해 반대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했던 반면 실학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오히려 성리학자들이 이론에만 치우쳐있고 특히 성리학의 본질이 우리나라가 아닌데 현실적인 성리학적 개혁을 요구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이치를 발현하는 것이 목표였다. 본디 성리학의 이상에도 중국 요순시대를 꿈꾸며 만들어진 학문이고 이 요순시대가 태평성대한 나라여서 이것을 유지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성리학이 변질되어 본질은 백성들을 살피어서 잘 살려는 것이었지만 백성 민생과는 동떨어진 인간은 어디서 오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율만 정하려고 하며 쓸데없는 당쟁에 이용하여 정치권을 잡으려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실학자들이 이 당쟁에서 밀려난 성리학자들이 대부분이라고는 하지만 민생에 가까운 학문이었다. 그 결과 실학자들이 더욱 정치에 끼어들 수 없기도 했고 이런 실학적인 사상 때문에 성리학이 주가 된 나라에서 중심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다. 박지원과 박제가와 같은 북학론으로 정치를 한 실학자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실학자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고민도 사실 정권을 잡아 실학을 좀 더 펼치는 것이 애국(愛國)이라고 고민했다.
<출처 및 참고문헌>
사단 칠정 논쟁의 재해석 : 이황 이론의 성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 reinterpretation Four budding - seven emotions debate
허원, 울산대학교,[2010] [국내석사]
17세기 율곡학파의 인심도심 논변 -이세필, 송시열, 윤증의 \"기용사(氣用事)\" 논변을 중심으로- = 17世紀谷學派的人心道心論辯 -以李世弼、宋時烈、尹拯的 \"氣用事\"論辯爲中心
이선열,(東洋哲學硏究, Vol.57 No.-,[2009])[KCI등재]
새로운 세상을 꿈꾼 조선의 실학자들 고진숙 글 | 유준재 그림 | 한겨레틴틴 | 2010.02.26.
<출처 및 참고문헌>
사단 칠정 논쟁의 재해석 : 이황 이론의 성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 reinterpretation Four budding - seven emotions debate
허원, 울산대학교,[2010] [국내석사]
17세기 율곡학파의 인심도심 논변 -이세필, 송시열, 윤증의 \"기용사(氣用事)\" 논변을 중심으로- = 17世紀谷學派的人心道心論辯 -以李世弼、宋時烈、尹拯的 \"氣用事\"論辯爲中心
이선열,(東洋哲學硏究, Vol.57 No.-,[2009])[KCI등재]
새로운 세상을 꿈꾼 조선의 실학자들 고진숙 글 | 유준재 그림 | 한겨레틴틴 | 2010.0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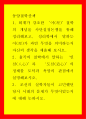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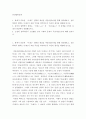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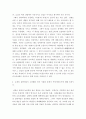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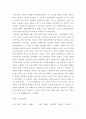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