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비평 및 영향
민수기에서는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보여줬던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보다는 대부분 저자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평안하게 글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글의 성격상 뚜렷한 하나님의 명령들로 많은 부분들이 이뤄져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5장에 나오는 부정한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을 위한 심리적 방법에 대한 해설은 뛰어났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많은 규례중의 하나로 치부해서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독특한 심리적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보다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 몇 명의 학자들의 의견을 더한 것도 해석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로 향하는 광야의 여정에서 불평으로 계속 나갔을 때 처음에 모세는 그들을 위한 중보자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다. 그러나 불평이 계속됨에 따라 모세도 백성들에 대해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원망의 전염성으로 풀이하고 있다. 모세가 불평하는 백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불편에 전염되어서 모세도 백성들에게 불평으로 대응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지나친 주관적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과 늘 대면하며 하나님의 전달자로써 백성들 속에 있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원망에 전염이 된다는 이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광됨, 전능하심에도 전염되어야 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흉내정도라도 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닌 하나님의 전달자로써 행동하고 움직였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원망으로 나갔다기보다는 모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내의 한계 또는 상황에 따라 금방 돌변하는 백성들에게 염증이 나서일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
발람의 이야기에서 이방인에 속했던 발람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결말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다른 종교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분의 진리를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교회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같은 주장이다. 그러나 다원주의나 종교적 관용의 근거로 삼고 신앙고백주의와 교조주의에 대한 공격의 토대로 삼기 전에 저자는 발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자고 했다.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발람의 흔적들과 신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방민족들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 등의 관찰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즉 발람의 한순간의 순종적인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관찰자적인 모습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자로서 글에 대한 자신의 논리와 사고를 가지고 사실에 접근했다고 본다. 그 결과 보다 가능성 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평 및 영향
민수기에서는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보여줬던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보다는 대부분 저자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평안하게 글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글의 성격상 뚜렷한 하나님의 명령들로 많은 부분들이 이뤄져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5장에 나오는 부정한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을 위한 심리적 방법에 대한 해설은 뛰어났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많은 규례중의 하나로 치부해서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독특한 심리적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보다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 몇 명의 학자들의 의견을 더한 것도 해석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로 향하는 광야의 여정에서 불평으로 계속 나갔을 때 처음에 모세는 그들을 위한 중보자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다. 그러나 불평이 계속됨에 따라 모세도 백성들에 대해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원망의 전염성으로 풀이하고 있다. 모세가 불평하는 백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불편에 전염되어서 모세도 백성들에게 불평으로 대응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지나친 주관적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과 늘 대면하며 하나님의 전달자로써 백성들 속에 있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원망에 전염이 된다는 이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광됨, 전능하심에도 전염되어야 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흉내정도라도 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닌 하나님의 전달자로써 행동하고 움직였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원망으로 나갔다기보다는 모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내의 한계 또는 상황에 따라 금방 돌변하는 백성들에게 염증이 나서일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
발람의 이야기에서 이방인에 속했던 발람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결말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다른 종교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분의 진리를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교회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같은 주장이다. 그러나 다원주의나 종교적 관용의 근거로 삼고 신앙고백주의와 교조주의에 대한 공격의 토대로 삼기 전에 저자는 발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자고 했다.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발람의 흔적들과 신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방민족들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 등의 관찰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즉 발람의 한순간의 순종적인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관찰자적인 모습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자로서 글에 대한 자신의 논리와 사고를 가지고 사실에 접근했다고 본다. 그 결과 보다 가능성 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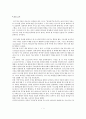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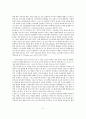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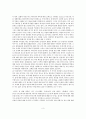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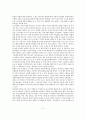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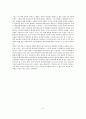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