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앞의 1~16장보다 훨씬 강한 어조의 거룩에 대한 행위와 생활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1~16장은 제한된 범위의 거룩에 대한 강조라면,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양식으로서의 거룩성을 요구한다. 즉 “일반화 현상”(laiciz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반복적인 부르심은 거룩한 삶으로의 초청인 셈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척도로 삼고 백성들의 거룩성을 유도하신다. 하나님은 레위기 이전까지 사로잡혀 살았던 이스라엘를 구원하시고 새 땅에 대한 언약을 하셨다. 이제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써의 삶의 형태를 그들 속에서 창조하기를 계획 하신다.
18장이 비합법적인 성관계에 대한 정언적 규례들에서 19장의 합법적인 거룩성에 대한 정언적 규례들로 이어진다. 그리고 20장은 금지하고 있는 규례들을 범하였을 때의 형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율법조항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또한 거룩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과 부모님을 경외하고 노인을 공경하며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진실을 말하며 불의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 등이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는 기근과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낙원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신다. 따라서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분인 것이다.
구조적인 면에서 1~16장과 17~26장의 내용의 강조점은 유사하다. 1~7장은 섬김의 행위인데 반해 23~25장은 섬김의 시간이다. 8~10장은 제사직분에 대해서이고 21~22장은 제사직분의 규례에 대해서이다. 11~15장은 정결한 삶의 내용이며 18~20과 26~27장은 거룩한 삶으로 상응하고 있다.
반면 다른 점은 1~16장은 부정함에 있어서 사람의 몸에 접촉되는 것들에 중점을 둔다. 17~26장은 사람의 몸이 행하는 것들에 무게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1~16장에서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는 부정함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신다. “~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17:10 등) 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18:21 등)이다.
다섯째, 맹세에 대한 율법들(27장)
레위기 마지막 장인 27장은 종교적인 서원에 대한 철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의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급된다. 뒤이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나오는 것은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인 거룩과 연관시켜 볼 때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거룩은 약속과 헌신으로 나타난다.
레위기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정결성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의 바울의 말씀(롬12:1)과 연결된다. 또한 레위기의 내용상의 맥락에서 육체적인 결함이 없는 동물은 신약의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 희생양이 될 종으로 옮겨갔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가르치신 하나님은 신약에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허락함으로써 온전한 희생의 모델을 직접 보여주셨다.
레위기의 규례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고 있음을 본문의 해석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도록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회복되는 거룩성은 구약의 시대뿐 아니라 신약 시대를 거쳐 계속해서 오늘날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안에서 거룩성으로 인하여 율법의 한계마저도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여 그 분을 찬송하는 선택된 자들로 온전히 세워져 가야 할 것이다.
비평 및 영향
레위기의 규례들을 단어 하나하나의 충실한 설명과 해석으로 분명하고도 명쾌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어렵게 읽혀졌던 본문의 내용들을 작게 구분 짓고 앞장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글을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자는 제의식들의 형식적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설명과 함께 다른 제사들과의 비교, 관찰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제사가 지닌 의미를 단순한 규범적인 의식을 넘어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포된 그분의 뜻과 사랑을 잘 드러나게 하였다.
제의식의 한 가지인 제단에 뿌려지는 피에 대한 해설(17:11)은 저자 자신의 해석보다 여러 명의 히브리어 학자들의 해석을 비교해서 나열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 본문에 대한 세밀한 접근과 객관적인 타당성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비교 분석의 방법은 말씀을 연구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어 사용에 대한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원어의 뜻을 밝혀 비교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속죄하다”의 히브리어 “카파르”는 단어의 문법적인 법칙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드러나지 않았던 신학적의미를 이끌어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점은 충분히 유익하다고 본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물을 먹지 않고 불에 태운 사건에 대해서 밀그롬(Milgrom)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저자는 밀그롬이 내린 결론이 아닌 다른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밀그롬의 해석을 보여주는 의도와 저자가 말하는 결론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난해함에 빠지게 된다. 한 가지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해석은 도움을 주지만,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들을 나열하면서 저자의 의도대로 글을 이끌어 간다. 그런데 간혹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의견들의 집합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아사셀에 대한 본문의 해석에서 저자는 희미하게 말끝을 흐리며 마지막 부분에서 두 개의 다른 의견을 늘어놓고만 있다. 이러한 점은 학자로써도 글을 쓰는 저자로써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18장이 비합법적인 성관계에 대한 정언적 규례들에서 19장의 합법적인 거룩성에 대한 정언적 규례들로 이어진다. 그리고 20장은 금지하고 있는 규례들을 범하였을 때의 형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율법조항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또한 거룩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과 부모님을 경외하고 노인을 공경하며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진실을 말하며 불의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 등이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는 기근과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낙원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신다. 따라서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분인 것이다.
구조적인 면에서 1~16장과 17~26장의 내용의 강조점은 유사하다. 1~7장은 섬김의 행위인데 반해 23~25장은 섬김의 시간이다. 8~10장은 제사직분에 대해서이고 21~22장은 제사직분의 규례에 대해서이다. 11~15장은 정결한 삶의 내용이며 18~20과 26~27장은 거룩한 삶으로 상응하고 있다.
반면 다른 점은 1~16장은 부정함에 있어서 사람의 몸에 접촉되는 것들에 중점을 둔다. 17~26장은 사람의 몸이 행하는 것들에 무게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1~16장에서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는 부정함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신다. “~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17:10 등) 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18:21 등)이다.
다섯째, 맹세에 대한 율법들(27장)
레위기 마지막 장인 27장은 종교적인 서원에 대한 철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의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급된다. 뒤이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나오는 것은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인 거룩과 연관시켜 볼 때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거룩은 약속과 헌신으로 나타난다.
레위기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정결성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의 바울의 말씀(롬12:1)과 연결된다. 또한 레위기의 내용상의 맥락에서 육체적인 결함이 없는 동물은 신약의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 희생양이 될 종으로 옮겨갔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가르치신 하나님은 신약에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허락함으로써 온전한 희생의 모델을 직접 보여주셨다.
레위기의 규례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고 있음을 본문의 해석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도록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회복되는 거룩성은 구약의 시대뿐 아니라 신약 시대를 거쳐 계속해서 오늘날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안에서 거룩성으로 인하여 율법의 한계마저도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여 그 분을 찬송하는 선택된 자들로 온전히 세워져 가야 할 것이다.
비평 및 영향
레위기의 규례들을 단어 하나하나의 충실한 설명과 해석으로 분명하고도 명쾌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어렵게 읽혀졌던 본문의 내용들을 작게 구분 짓고 앞장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글을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자는 제의식들의 형식적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설명과 함께 다른 제사들과의 비교, 관찰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제사가 지닌 의미를 단순한 규범적인 의식을 넘어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포된 그분의 뜻과 사랑을 잘 드러나게 하였다.
제의식의 한 가지인 제단에 뿌려지는 피에 대한 해설(17:11)은 저자 자신의 해석보다 여러 명의 히브리어 학자들의 해석을 비교해서 나열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 본문에 대한 세밀한 접근과 객관적인 타당성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비교 분석의 방법은 말씀을 연구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어 사용에 대한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원어의 뜻을 밝혀 비교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속죄하다”의 히브리어 “카파르”는 단어의 문법적인 법칙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드러나지 않았던 신학적의미를 이끌어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점은 충분히 유익하다고 본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물을 먹지 않고 불에 태운 사건에 대해서 밀그롬(Milgrom)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저자는 밀그롬이 내린 결론이 아닌 다른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밀그롬의 해석을 보여주는 의도와 저자가 말하는 결론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난해함에 빠지게 된다. 한 가지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해석은 도움을 주지만,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들을 나열하면서 저자의 의도대로 글을 이끌어 간다. 그런데 간혹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의견들의 집합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아사셀에 대한 본문의 해석에서 저자는 희미하게 말끝을 흐리며 마지막 부분에서 두 개의 다른 의견을 늘어놓고만 있다. 이러한 점은 학자로써도 글을 쓰는 저자로써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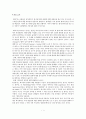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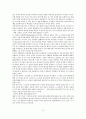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