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무력 앞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그 장면을 보고 있는 해방 직후의 관객들에게 ‘비애와 분노’라는 감정을 주며 공동체로 결속시켰다. 이러한 공동체로 관객들이 들어감으로써 각자는 직·간접적으로 3·1 운동에 관계되었기 때문에 분노와 슬픔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즉, 수많은 목숨을 가져간 일제에 대한 분노, 그들에 의하여 죽음을 얻게 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 식민지로 살아간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 등의 감정들이 희곡을 통하여 다시 환기되는 것이다. 반면, <조국>은 이를 영웅적인 결단으로 이야기한다. 개인적인 고민은 따로 없고, 충-효, 그리고 전체와 개인을 통합하는 영웅적인 주인공이 적을 이기고 시위를 주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통쾌함을 보여줄 수 있었다. 비록 친구가 사망하는 등의 희생은 존재하였지만, 주인공이 군중을 이끌며 끝나는 내용을 통하여 사람들은 현재까지 이러한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 헌병을 조롱하는 장면을 통하여 그들은 ‘승리를 하였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이는 해방된 현재를 긍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조국>은 일본이 패전했다는 것, 그리고 조선이 해방했다는 것만을 생각하며 그 이후의 시선으로 3·1 운동을 바라보게 하였다.
3. 결론
세 가지의 희곡을 비교하였을 때 좌파에 속하는 김남천의 <3·1 운동>과 함세덕의 <기미년 3월 1일>은 3·1 운동 시기의 시선을 가지고 해방된 조선을 보고자 하였다면, 우파에 속하는 유치진의 <조국>은 해방된 조선의 시선으로 3·1 운동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3·1 운동>과 <기미년 3월 1일>이 3·1 운동의 시선을 전달하고자 했더라고 이는 사건을 기억하는 정확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적군과 아군의 구분을 통하여 민족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해방 이후의 정치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운동이 좌절된 장소와 시기에서 그 좌절의 의미를 다시 물어보는 것, 그리고 이를 현재와의 관계에서도 물어보는 것은 적어도 과거로부터 현재를 비판할 수 있는 의식을 표현할 수는 있다. 또한, 그 시기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현재화시킴에 따라서 3·1 운동의 기억을 환기할 수 있는데, 이는 해방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투영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해방 이후의 시선으로 3·1 운동을 보고 있는 <조국>은 해방의 기쁨을 과거의 사건에 투시하고 있다. 따라서 3·1 운동은 미래의 승리를 보여주거나, 결국은 해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죽어간 사람들은 해방 이후의 조선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을 이용하여 극을 전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끝냄으로써 트라우마를 봉인시키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차승기, (2009). 기미와 삼일 해방직후 역사적 기억의 전승-. 한국현대문학회, pp.309~334.
곽병창, (1995). 세 편의 3·1절 기년 희곡에 대한 비교 고찰, 현대문학이론학회
3. 결론
세 가지의 희곡을 비교하였을 때 좌파에 속하는 김남천의 <3·1 운동>과 함세덕의 <기미년 3월 1일>은 3·1 운동 시기의 시선을 가지고 해방된 조선을 보고자 하였다면, 우파에 속하는 유치진의 <조국>은 해방된 조선의 시선으로 3·1 운동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3·1 운동>과 <기미년 3월 1일>이 3·1 운동의 시선을 전달하고자 했더라고 이는 사건을 기억하는 정확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적군과 아군의 구분을 통하여 민족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해방 이후의 정치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운동이 좌절된 장소와 시기에서 그 좌절의 의미를 다시 물어보는 것, 그리고 이를 현재와의 관계에서도 물어보는 것은 적어도 과거로부터 현재를 비판할 수 있는 의식을 표현할 수는 있다. 또한, 그 시기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현재화시킴에 따라서 3·1 운동의 기억을 환기할 수 있는데, 이는 해방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투영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해방 이후의 시선으로 3·1 운동을 보고 있는 <조국>은 해방의 기쁨을 과거의 사건에 투시하고 있다. 따라서 3·1 운동은 미래의 승리를 보여주거나, 결국은 해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죽어간 사람들은 해방 이후의 조선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을 이용하여 극을 전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끝냄으로써 트라우마를 봉인시키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차승기, (2009). 기미와 삼일 해방직후 역사적 기억의 전승-. 한국현대문학회, pp.309~334.
곽병창, (1995). 세 편의 3·1절 기년 희곡에 대한 비교 고찰, 현대문학이론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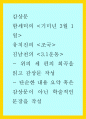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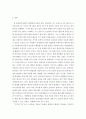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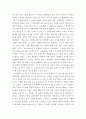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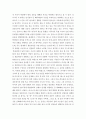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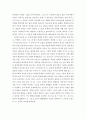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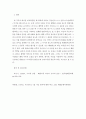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