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윤동주의 생애
짧은 생명 긴 예술의 불꽃
윤동주의 시 세계
기독교적 세계관
윤리적 단면 -- 부끄러움의 미학
식민지 시대의 역사 의식
윤동주 연보
짧은 생명 긴 예술의 불꽃
윤동주의 시 세계
기독교적 세계관
윤리적 단면 -- 부끄러움의 미학
식민지 시대의 역사 의식
윤동주 연보
본문내용
람\'으로 상징된 바와 같이 \'비극적인 행동인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윤동주의 민족 현실에 대한 실천은 \'비극적인 행동인의 이상\'을 보여 줌은 물론 \'영웅적인 지도자보다는 비장한 수난자\'로서의 순수한 저항적 공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윤동주의 내면적 공간에서 보여 주는 실존의 의미는 진지하게 자아와 대결하는 자세로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역사 상황에 대한 저항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윤동주의 비극적 저항 의식은 점차 시대상황의 현실 속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다음의 시에서 보여 주고 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最後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慰安으로 잡는 最初의 握手
---- <쉽게 씌어진 詩>] 중에서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길> 중에서
위의 <쉽게 씌어진 詩>에서 인용된 구절에서는 시대 현실에대해 역사적 실천이 암시되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실천의 암시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등불을 밝혀 드는 행위로써 나타난다. 그리하여 \'아침\'을 기다리는 역사적 자아로서 민족의 수난을 겪어내는 준엄한 삶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삶의 준엄성에는 \'눈물과 慰安\'의 수난당한 모습에서도 형상되어진 바와 같이 내면적 신념으로 일관된 저항적 자세를 띄고 있다. 윤동주의 저항의 자세에서 보인 신념은 \'잃은 것\'을 찾기 위한 정신적 저항이었다. 그것은 \'길\'에서 분명하게 도출되는 것처럼 \'풀 한포기 없는\' 비참한 현실을 사는 궁극적인 목표는 \'담 저쪽에 남어있는\' 새 시대의 현실을 살기 위함이고 이러한 어두운 현실을 살고 있는 궁극적인 생의 지점도 \'잃은 것\'을 찾기 위함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윤동주의 식민지 체제 하에서의 역사 의식은 민족의 현실과 연계된 내면 공간을 구축하고, 그러한 현실적 내면 공간에서 비판 의식과 수난자로서의 신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민족적 신념과 자세는 곧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한 저항의 의미로까지 확대되어 나타났다. 그러므로 윤동주의 역사 의식은 항일 정신으로까지 발전되어 나타난 것이다.
윤동주 연보
1917 : 12월 30일, 중화민국 길림성 화룡현 명동촌에서 부친 윤영석(尹永錫, 1895-1962)과 모친 김용(金龍, 1891-19 8) 사이의 맏아들로 태어남. 본관은 파평, 아명은 해환(海煥). 조부 윤하현(尹夏鉉, 1875-1948)은 부유한 농부로서 기독교 장로, 부친은 명동학교 교원이었음.
1918 : 1년 늦게 출생 신고를 함.
1924 : 12월, 누이 혜원(惠媛, 아명 귀녀) 태어남.
1925 : 4월, 명동소학교 입학. 같은 학년에 고종 사촌 송몽규와 문익환 및 당숙 윤영선, 외사촌 김정우 등이 있었음.
1927 : 12월, 동생 일주(一柱, 아명 달환) 태어남.
1928 : 급우들과 <<새명동>>이란 등사판 잡지를 만듦.
1931 : 3월 20일, 명동소학교 졸업. 송몽규, 김정우 외 1명과 함께 명동에서 10리 남쪽에 있는 중국인 소학교 6학년에 편입하여 1년 간 수학. 늦가을 용정으로 이사.
1932 : 4월, 용정 미션계 교육 기관인 은진(恩眞)중학교에 송몽규, 문익환과 함께 입학. 부친 인쇄소를 차림.
1934 : 12월 24일, 오늘날 찾을 수 있는 최초의 작품인 시 세 편 (<초 한 대>, <삶과 죽음>, <내일은 없다>)을 제작 기일 명기하여 보관 시작.
1935 : 9월 1일, 은진중학교 학생회 학우지인 <<숭실활천>> 제 15 호에서 <공상> 게재, 최초로 작품이 활자화 됨.
1936 : 3월, 숭실중학교에 대한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에 항의하여 자퇴. 문익환과 함께 용정으로 돌아옴. 용정 광명학원 중학부 4학년에, 문익환은 5학년에 편입.
1937 : 8월, 백석 시집 <<사슴>>을 베껴 필사본을 만들어 가짐. 이 무렵 광명중학교 농구 선수로 활약. 상급 학교 진학 문제를 놓고 부친과 심하게 대립, 결국 본인이 원하는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진학하기로 결정됨.
1938 : 2월 17일, 광명중학교 5학년을 졸업. 4월 9일, 서울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 학교 기숙사 3층 지붕 밑 방에서 송몽규, 강처중과 함께 3인이 한 방을 사용.
1939 : 기숙사를 나와서 북아현동, 서소문 등지에서 하숙 생활. <<조선일보>> 학생란에 산문 <달을 쏘다>, 시 <유언>, <아우의 인상화>를 윤동주란 이름으로 발표.
1940 : 다시 기숙사로 돌아옴. 고향 후배인 장덕순, 하동 출신 정병욱과 깊이 사귐.
1941 : 5월에 정병욱과 함께 기숙사를 나와 소설가 김송씨 집에서 하숙 생활 시작. 9월, 북아현동으로 하숙집 옮김. 12월 27일, 전시 학제 단축으로 3개월 앞당겨 연희전문학교 4년을 졸업함. 졸업 기념으로 열아홉 편의 시를 묶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란 제목으로 시집을 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음.
1942 : 부친 일본 유학 권함. 도일 수속을 위해 연희전문학교에 \'平沼東柱\'라고 창씨한 이름을 제출함. 1월 24일에 쓴 시 <참회록>이 고국에서의 마지막 작품이 됨. 3월에 일본에 건너가서 4월 2일에 동경 입교대학 문학부 영문과에 입학. 10월 1일 동지사대학 영문학과에 전입함.
1943 : 1월, 겨울 방학에 귀성하지 않고 경도에 남음. 7월 14일 특고 경찰에 의해 독립 운동 혐의로 검거됨.
1944 : 3월 31일, 경도지방재판소 제 2형사부는 \'징역 2년(미결 구류 120일 산입)\' 선고(출감예정일 : 1945.11.30.). 판결 확정 뒤에 복강형무소로 이송되어 복역 시작. 매달 일어로 쓴 엽서 한 장씩만 허락됨.
1945 : 2월 16일 오전 3시 36분, 복강형무소 안에서 외마디 비명을 높이 지르고 운명. 2월 18일, 북간도의 고향집에 사망 통지 전보 도착하여 부친 윤영석과 당숙 윤영춘이 시신을 가져오려고 도일. 3월 6일, 북간도 용정동산의 중앙교회 묘지에 윤동주 유해 안장. 봄이 되자 윤동주가에서 \'詩人尹東柱之墓\'란 비석을 세움.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조국이 해방됨.
그러므로 윤동주의 내면적 공간에서 보여 주는 실존의 의미는 진지하게 자아와 대결하는 자세로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역사 상황에 대한 저항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윤동주의 비극적 저항 의식은 점차 시대상황의 현실 속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다음의 시에서 보여 주고 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最後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慰安으로 잡는 最初의 握手
---- <쉽게 씌어진 詩>] 중에서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길> 중에서
위의 <쉽게 씌어진 詩>에서 인용된 구절에서는 시대 현실에대해 역사적 실천이 암시되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실천의 암시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등불을 밝혀 드는 행위로써 나타난다. 그리하여 \'아침\'을 기다리는 역사적 자아로서 민족의 수난을 겪어내는 준엄한 삶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삶의 준엄성에는 \'눈물과 慰安\'의 수난당한 모습에서도 형상되어진 바와 같이 내면적 신념으로 일관된 저항적 자세를 띄고 있다. 윤동주의 저항의 자세에서 보인 신념은 \'잃은 것\'을 찾기 위한 정신적 저항이었다. 그것은 \'길\'에서 분명하게 도출되는 것처럼 \'풀 한포기 없는\' 비참한 현실을 사는 궁극적인 목표는 \'담 저쪽에 남어있는\' 새 시대의 현실을 살기 위함이고 이러한 어두운 현실을 살고 있는 궁극적인 생의 지점도 \'잃은 것\'을 찾기 위함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윤동주의 식민지 체제 하에서의 역사 의식은 민족의 현실과 연계된 내면 공간을 구축하고, 그러한 현실적 내면 공간에서 비판 의식과 수난자로서의 신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민족적 신념과 자세는 곧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한 저항의 의미로까지 확대되어 나타났다. 그러므로 윤동주의 역사 의식은 항일 정신으로까지 발전되어 나타난 것이다.
윤동주 연보
1917 : 12월 30일, 중화민국 길림성 화룡현 명동촌에서 부친 윤영석(尹永錫, 1895-1962)과 모친 김용(金龍, 1891-19 8) 사이의 맏아들로 태어남. 본관은 파평, 아명은 해환(海煥). 조부 윤하현(尹夏鉉, 1875-1948)은 부유한 농부로서 기독교 장로, 부친은 명동학교 교원이었음.
1918 : 1년 늦게 출생 신고를 함.
1924 : 12월, 누이 혜원(惠媛, 아명 귀녀) 태어남.
1925 : 4월, 명동소학교 입학. 같은 학년에 고종 사촌 송몽규와 문익환 및 당숙 윤영선, 외사촌 김정우 등이 있었음.
1927 : 12월, 동생 일주(一柱, 아명 달환) 태어남.
1928 : 급우들과 <<새명동>>이란 등사판 잡지를 만듦.
1931 : 3월 20일, 명동소학교 졸업. 송몽규, 김정우 외 1명과 함께 명동에서 10리 남쪽에 있는 중국인 소학교 6학년에 편입하여 1년 간 수학. 늦가을 용정으로 이사.
1932 : 4월, 용정 미션계 교육 기관인 은진(恩眞)중학교에 송몽규, 문익환과 함께 입학. 부친 인쇄소를 차림.
1934 : 12월 24일, 오늘날 찾을 수 있는 최초의 작품인 시 세 편 (<초 한 대>, <삶과 죽음>, <내일은 없다>)을 제작 기일 명기하여 보관 시작.
1935 : 9월 1일, 은진중학교 학생회 학우지인 <<숭실활천>> 제 15 호에서 <공상> 게재, 최초로 작품이 활자화 됨.
1936 : 3월, 숭실중학교에 대한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에 항의하여 자퇴. 문익환과 함께 용정으로 돌아옴. 용정 광명학원 중학부 4학년에, 문익환은 5학년에 편입.
1937 : 8월, 백석 시집 <<사슴>>을 베껴 필사본을 만들어 가짐. 이 무렵 광명중학교 농구 선수로 활약. 상급 학교 진학 문제를 놓고 부친과 심하게 대립, 결국 본인이 원하는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진학하기로 결정됨.
1938 : 2월 17일, 광명중학교 5학년을 졸업. 4월 9일, 서울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 학교 기숙사 3층 지붕 밑 방에서 송몽규, 강처중과 함께 3인이 한 방을 사용.
1939 : 기숙사를 나와서 북아현동, 서소문 등지에서 하숙 생활. <<조선일보>> 학생란에 산문 <달을 쏘다>, 시 <유언>, <아우의 인상화>를 윤동주란 이름으로 발표.
1940 : 다시 기숙사로 돌아옴. 고향 후배인 장덕순, 하동 출신 정병욱과 깊이 사귐.
1941 : 5월에 정병욱과 함께 기숙사를 나와 소설가 김송씨 집에서 하숙 생활 시작. 9월, 북아현동으로 하숙집 옮김. 12월 27일, 전시 학제 단축으로 3개월 앞당겨 연희전문학교 4년을 졸업함. 졸업 기념으로 열아홉 편의 시를 묶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란 제목으로 시집을 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음.
1942 : 부친 일본 유학 권함. 도일 수속을 위해 연희전문학교에 \'平沼東柱\'라고 창씨한 이름을 제출함. 1월 24일에 쓴 시 <참회록>이 고국에서의 마지막 작품이 됨. 3월에 일본에 건너가서 4월 2일에 동경 입교대학 문학부 영문과에 입학. 10월 1일 동지사대학 영문학과에 전입함.
1943 : 1월, 겨울 방학에 귀성하지 않고 경도에 남음. 7월 14일 특고 경찰에 의해 독립 운동 혐의로 검거됨.
1944 : 3월 31일, 경도지방재판소 제 2형사부는 \'징역 2년(미결 구류 120일 산입)\' 선고(출감예정일 : 1945.11.30.). 판결 확정 뒤에 복강형무소로 이송되어 복역 시작. 매달 일어로 쓴 엽서 한 장씩만 허락됨.
1945 : 2월 16일 오전 3시 36분, 복강형무소 안에서 외마디 비명을 높이 지르고 운명. 2월 18일, 북간도의 고향집에 사망 통지 전보 도착하여 부친 윤영석과 당숙 윤영춘이 시신을 가져오려고 도일. 3월 6일, 북간도 용정동산의 중앙교회 묘지에 윤동주 유해 안장. 봄이 되자 윤동주가에서 \'詩人尹東柱之墓\'란 비석을 세움.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조국이 해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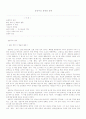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