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본이다.
의무(도덕규칙)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으로, 오직 의무로부터 말미암은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 행위. 모든 도덕행위의 근본.
의무란 공리의 원리를 근간으로 형성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부수적인 규칙들. 도덕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공리의 원리
처벌과 사형에 대하여(처벌관)
응보주의
평형의 원리(비례원칙,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 때문에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 정당
예방주의
처벌도 사회적 유용성 증진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함. (결과론적 처벌관)
행복
행복 자체만을 추구해서는 안 됨.
행복은 완성된 도덕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깃드는 것. (행복은 인간의 간접적 의무 정도에 그침)
인간이 지향해야 할 최고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직접적 의무)
도덕적 행위란
인간의 실천이성의 작용을 통해 형성된 선의지에 따라, 의무로부터 행위한 것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행위
결과에 대한 고려를 통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나타낸 것.
[칸트의 공리주의 비판]
①쾌락주의 비판 : 쾌락은 도덕 의무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도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 쾌락의 감정은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필연적 인과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사실의 인과적 연쇄를 발생시킴으로써 인간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없게 만든다. 당위와 명령을 본질로 하는 도덕적 의무가 개입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다. 달리 말해 이 과정은 사실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도덕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쾌락은 도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②행복주의 비판 : 행복을 위한 도덕의 수단화. 또한 행복주의는 보편성과 필연성이 없다 : 칸트는 행복의 추구가 보편적 최상의 도덕원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행복이든지 그것의 본질은 쾌락에 있다. 쾌락은 감정이기 때문에 변화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행복의 내용도 달라진다. 어떤 행위의 원칙이 도덕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만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시공간의 특이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필연성을 가져야 하는데, 행복을 추구하라는 요구는 보편성과 필연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③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 : 좋은 결과를 위해 악한 동기를 용납해도 되는 것인가? 결과에 대한 고려만으로는 도덕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어렵다.
[칸트 vs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덕(정신적 재능, 기질상의 성질들)은 나쁜 곳에 쓰일 수 있다. 따라서 덕은 언제나 선한 선의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
덕은 나쁜 곳에 쓰일 수 없다.
도덕적인 사람은, 경향성에 흔들리더라도 그것을 뿌리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덕스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의무로부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덕스러운 사람은 이미 ‘습관화된 사람’으로 경향성에 의해 흔들리고 그것을 떨쳐낼 필요가 없는 사람.
칸트의 생각처럼, 경향성을 떨쳐내고 의무를 따르는 것이 진짜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점.
[공리주의 vs 듀이]
공리주의
듀이
목적
하나의 목적. 즉 결과로서의 쾌락, 전체로서의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추구
고정된 목적이란 없다. 목적은 유익한 결과를 산출하려는 의도에 그침.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성장’이라는 것.
공통점
도덕은 유용성을 추구해야 함. 유익한 결과 산출.
[셸러 vs 듀이]
셸러
듀이
가치의 독립성
가치는 가치 담지자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독립적, 선험적으로 존재. 인간의 인식 주관에 의해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가치는 인간의 인식 주관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 가치는 인간의 인식 주관의 필요와 평가에 따라 달라짐.
[셸러 vs 칸트]
칸트
셸러
실질적 내용
모든 실질적 내용을 갖는 것은 경험적인 것으로, 이를 도덕판단에서 배제해야 한다.
실질적 내용을 가지면서도 선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치이다.
인식론적/존재론적
실천이성을 통해 도덕의 형식을 찾아 도덕의 보편화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인식론적)
인간 평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선험적 존재가 있다(존재론적)
쾌락
쾌락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배제
쾌락은 배제할 이유가 없다. 쾌락가치도 여러 가치 중 하나이다.
인격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이성을 가지고 도덕법칙을 준수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인간의 인식 평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격가치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 인격가치가 선악가치를 판단.
행위 동기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선의지. 실천이성의 원칙인 의무에 의해서만 규정된 의지.
인격 전형 혹은 인격 모범이 도덕 행위의 동기. 인격은 도덕적 가치의 담지자이자 도덕적 가치를 세계에 실현하는 작용자.
공통점
-윤리학은 선험적인 것이어야 한다(경험주의 : 결과주의, 행복주의 반대)
-쾌락주의에 반대 : 칸트는 도덕의 수단화, 셸러는 더 상위의 가치가 있음을 이유로 들어 각각 반대
[에이어 vs 스티븐슨]
에이어 (극단적 이모티비즘)
스티븐슨 (온건한 이모티비즘)
도덕 판단
도덕판단에는 참, 거짓을 알 수 있는 서술적 의미가 없고 단순히 정의적 의미만 있다. 도덕판단 오로지 발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므로 판단불가
도덕판단에는 참, 거짓을 알 수 있는 서술적 의미가 있음을 인정. 기술적 의미가 있으나 정의적 의미가 기술적 의미를 압도하기 때문에(설득 정의) 역시 판단 불가
공통점
이모티비즘(정서주의) = 도덕판단은 개인의 감정표현에 지나지 않으므로, 도덕판단의 참 거짓을 알 수 없다
[무어의 밀 비판]
밀은 공리의 원리에 대한 증명, 즉 쾌락의 증가가 왜 선이며 도덕원리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증명을 시도했는데, 이것은 무어가 보기에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져있다.
밀은 ‘바란다’는 사실 개념과 ‘바람직하다’는 가치개념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의 혼돈으로 인해 밀은 사실판단으로부터 가치판단을 이끌어 낸다. 전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결코 결론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밀의 주장은 명백한 오류이다. 밀은 정의 내려질 수 없는 선에 대해 정의를 시도하는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진다.
의무(도덕규칙)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으로, 오직 의무로부터 말미암은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 행위. 모든 도덕행위의 근본.
의무란 공리의 원리를 근간으로 형성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부수적인 규칙들. 도덕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공리의 원리
처벌과 사형에 대하여(처벌관)
응보주의
평형의 원리(비례원칙,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 때문에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 정당
예방주의
처벌도 사회적 유용성 증진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함. (결과론적 처벌관)
행복
행복 자체만을 추구해서는 안 됨.
행복은 완성된 도덕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깃드는 것. (행복은 인간의 간접적 의무 정도에 그침)
인간이 지향해야 할 최고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직접적 의무)
도덕적 행위란
인간의 실천이성의 작용을 통해 형성된 선의지에 따라, 의무로부터 행위한 것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행위
결과에 대한 고려를 통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나타낸 것.
[칸트의 공리주의 비판]
①쾌락주의 비판 : 쾌락은 도덕 의무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도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 쾌락의 감정은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필연적 인과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사실의 인과적 연쇄를 발생시킴으로써 인간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없게 만든다. 당위와 명령을 본질로 하는 도덕적 의무가 개입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다. 달리 말해 이 과정은 사실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도덕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쾌락은 도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②행복주의 비판 : 행복을 위한 도덕의 수단화. 또한 행복주의는 보편성과 필연성이 없다 : 칸트는 행복의 추구가 보편적 최상의 도덕원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행복이든지 그것의 본질은 쾌락에 있다. 쾌락은 감정이기 때문에 변화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행복의 내용도 달라진다. 어떤 행위의 원칙이 도덕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만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시공간의 특이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필연성을 가져야 하는데, 행복을 추구하라는 요구는 보편성과 필연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③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 : 좋은 결과를 위해 악한 동기를 용납해도 되는 것인가? 결과에 대한 고려만으로는 도덕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어렵다.
[칸트 vs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덕(정신적 재능, 기질상의 성질들)은 나쁜 곳에 쓰일 수 있다. 따라서 덕은 언제나 선한 선의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
덕은 나쁜 곳에 쓰일 수 없다.
도덕적인 사람은, 경향성에 흔들리더라도 그것을 뿌리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덕스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의무로부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덕스러운 사람은 이미 ‘습관화된 사람’으로 경향성에 의해 흔들리고 그것을 떨쳐낼 필요가 없는 사람.
칸트의 생각처럼, 경향성을 떨쳐내고 의무를 따르는 것이 진짜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점.
[공리주의 vs 듀이]
공리주의
듀이
목적
하나의 목적. 즉 결과로서의 쾌락, 전체로서의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추구
고정된 목적이란 없다. 목적은 유익한 결과를 산출하려는 의도에 그침.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성장’이라는 것.
공통점
도덕은 유용성을 추구해야 함. 유익한 결과 산출.
[셸러 vs 듀이]
셸러
듀이
가치의 독립성
가치는 가치 담지자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독립적, 선험적으로 존재. 인간의 인식 주관에 의해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가치는 인간의 인식 주관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 가치는 인간의 인식 주관의 필요와 평가에 따라 달라짐.
[셸러 vs 칸트]
칸트
셸러
실질적 내용
모든 실질적 내용을 갖는 것은 경험적인 것으로, 이를 도덕판단에서 배제해야 한다.
실질적 내용을 가지면서도 선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치이다.
인식론적/존재론적
실천이성을 통해 도덕의 형식을 찾아 도덕의 보편화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인식론적)
인간 평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선험적 존재가 있다(존재론적)
쾌락
쾌락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배제
쾌락은 배제할 이유가 없다. 쾌락가치도 여러 가치 중 하나이다.
인격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이성을 가지고 도덕법칙을 준수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인간의 인식 평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격가치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 인격가치가 선악가치를 판단.
행위 동기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선의지. 실천이성의 원칙인 의무에 의해서만 규정된 의지.
인격 전형 혹은 인격 모범이 도덕 행위의 동기. 인격은 도덕적 가치의 담지자이자 도덕적 가치를 세계에 실현하는 작용자.
공통점
-윤리학은 선험적인 것이어야 한다(경험주의 : 결과주의, 행복주의 반대)
-쾌락주의에 반대 : 칸트는 도덕의 수단화, 셸러는 더 상위의 가치가 있음을 이유로 들어 각각 반대
[에이어 vs 스티븐슨]
에이어 (극단적 이모티비즘)
스티븐슨 (온건한 이모티비즘)
도덕 판단
도덕판단에는 참, 거짓을 알 수 있는 서술적 의미가 없고 단순히 정의적 의미만 있다. 도덕판단 오로지 발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므로 판단불가
도덕판단에는 참, 거짓을 알 수 있는 서술적 의미가 있음을 인정. 기술적 의미가 있으나 정의적 의미가 기술적 의미를 압도하기 때문에(설득 정의) 역시 판단 불가
공통점
이모티비즘(정서주의) = 도덕판단은 개인의 감정표현에 지나지 않으므로, 도덕판단의 참 거짓을 알 수 없다
[무어의 밀 비판]
밀은 공리의 원리에 대한 증명, 즉 쾌락의 증가가 왜 선이며 도덕원리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증명을 시도했는데, 이것은 무어가 보기에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져있다.
밀은 ‘바란다’는 사실 개념과 ‘바람직하다’는 가치개념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의 혼돈으로 인해 밀은 사실판단으로부터 가치판단을 이끌어 낸다. 전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결코 결론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밀의 주장은 명백한 오류이다. 밀은 정의 내려질 수 없는 선에 대해 정의를 시도하는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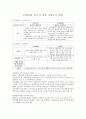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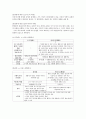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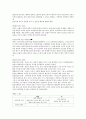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