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요약
2, 감상
참고문헌
1, 요약
“지금은 전자장치로 대출을 하니까 카드에 이름 쓸 일 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책을 빌릴 때는 카드에 이름과 날짜를 기입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두꺼운 원서의 대출 카드에는 'P'라는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신기하고 놀라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머리말 중에서 - 그 P'라는 이름은 당시 필자가 재학
1, 요약
2, 감상
참고문헌
1, 요약
“지금은 전자장치로 대출을 하니까 카드에 이름 쓸 일 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책을 빌릴 때는 카드에 이름과 날짜를 기입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두꺼운 원서의 대출 카드에는 'P'라는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신기하고 놀라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머리말 중에서 - 그 P'라는 이름은 당시 필자가 재학
본문내용
러나 그 화살 끝에 깃을 달고, 화살촉을 잘 갈아서 쓰면 더욱 깊이 박히지 않느냐?”이 말에 자로가 절을 하며 “가르침을 공경히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였다(공자가어 , 자로초견).
그 후 자로는 위나라의 대부(장관)로 있다가 부자(父子)지간의 내란에 휩쓸려 죽음을 맞이하였다. 자로의 죽음을 접한 공자는 집안의 모든 젓갈을 엎어버릴 정도로 비통해 했다고 한다(예기 , 단궁). 염유(기원전522~?)는 성은 이고, 이름은 求, 자는 子有이다. 그는 춘추 말기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보다 29세 연하였다. 염유는 공자와 함께 천하를 주유하다가 노나라의 실권자였던 계강자의 부름을 받고 먼저 노나라로 귀국하여 계씨의 가신이 되었다. 기원전 484년, 그는 제나라의 침입을 물리친 공로를 모두 공자에 게 돌림으로서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사기 , 중니제자열전). 공자는 염유의 재능은 인정했으나 인간됨이 유약하다고 평가했다.
논어에서 공자가 염유를 꾸짖는 장면은, 염유가 품었던 호학과 치인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염구가 말하였다. “저는 부자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나 힘이 부족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힘이 부족한 자는 중도에 그만두니, 지금 너는 스스로 한계를 긋는 것이다. ”(求曰 非不說子之道 力不足也 子曰 力不足者 中道而廢 今女 畵, 논어 , 옹야 공자는 안회만이 진정한 호학의 자세를 갖추었다고 인정한다. 이 말을 들고 염유는 자신을 변명하고자 했다. 이 대화에서 염유의 말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겸양의 뜻으로 보이지만, 실지로는 공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담고 있다. ‘힘이 부족한 자’는 배우려고 해도 능력이 부족해 배우지 못하는 자이고, ‘한계를 긋는 자’는 능력과 상관없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이다. 염유는 한계를 긋는 자로서 배움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자였다. 진심으로 공자의 도를 배우고자 했다면, 염유는 충분히 배움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염유는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적당한 배움에 만족하여 점점 뒤처지게 되었다. 즉 염유는 재능에만 국한되어, 난세 속에서 일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안일한 삶의 자세를 가졌던 것이다.
현대 중국과 한국의 많은 학자들은 《논어》가 증삼과 그의 문하생들이 편찬했다는 걸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증삼은 이 책에 몇 번 출현했을까? 총 6편밖에 출현하지 않았다. 특이하게도, 증삼이 5번이나 출현하는 〈태백〉편의 경우에 다른 제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증삼과 그의 제자들이 편찬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논어》 전체가 아니라, 〈태백〉편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으로 《논어》에 접근하다 보니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있다. 〈선진〉편에는 독특하게도 이 책에 등장하는 공자의 제자 29명 가운데 20명이 넘는 인물이 등장한다. 달리 말하면 〈선진〉편은 ‘공자의 제자 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논어,학자들의 수다 사람을 읽다』, 김시천, 더퀘스트
그 후 자로는 위나라의 대부(장관)로 있다가 부자(父子)지간의 내란에 휩쓸려 죽음을 맞이하였다. 자로의 죽음을 접한 공자는 집안의 모든 젓갈을 엎어버릴 정도로 비통해 했다고 한다(예기 , 단궁). 염유(기원전522~?)는 성은 이고, 이름은 求, 자는 子有이다. 그는 춘추 말기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보다 29세 연하였다. 염유는 공자와 함께 천하를 주유하다가 노나라의 실권자였던 계강자의 부름을 받고 먼저 노나라로 귀국하여 계씨의 가신이 되었다. 기원전 484년, 그는 제나라의 침입을 물리친 공로를 모두 공자에 게 돌림으로서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사기 , 중니제자열전). 공자는 염유의 재능은 인정했으나 인간됨이 유약하다고 평가했다.
논어에서 공자가 염유를 꾸짖는 장면은, 염유가 품었던 호학과 치인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염구가 말하였다. “저는 부자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나 힘이 부족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힘이 부족한 자는 중도에 그만두니, 지금 너는 스스로 한계를 긋는 것이다. ”(求曰 非不說子之道 力不足也 子曰 力不足者 中道而廢 今女 畵, 논어 , 옹야 공자는 안회만이 진정한 호학의 자세를 갖추었다고 인정한다. 이 말을 들고 염유는 자신을 변명하고자 했다. 이 대화에서 염유의 말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겸양의 뜻으로 보이지만, 실지로는 공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담고 있다. ‘힘이 부족한 자’는 배우려고 해도 능력이 부족해 배우지 못하는 자이고, ‘한계를 긋는 자’는 능력과 상관없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이다. 염유는 한계를 긋는 자로서 배움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자였다. 진심으로 공자의 도를 배우고자 했다면, 염유는 충분히 배움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염유는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적당한 배움에 만족하여 점점 뒤처지게 되었다. 즉 염유는 재능에만 국한되어, 난세 속에서 일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안일한 삶의 자세를 가졌던 것이다.
현대 중국과 한국의 많은 학자들은 《논어》가 증삼과 그의 문하생들이 편찬했다는 걸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증삼은 이 책에 몇 번 출현했을까? 총 6편밖에 출현하지 않았다. 특이하게도, 증삼이 5번이나 출현하는 〈태백〉편의 경우에 다른 제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증삼과 그의 제자들이 편찬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논어》 전체가 아니라, 〈태백〉편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으로 《논어》에 접근하다 보니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있다. 〈선진〉편에는 독특하게도 이 책에 등장하는 공자의 제자 29명 가운데 20명이 넘는 인물이 등장한다. 달리 말하면 〈선진〉편은 ‘공자의 제자 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논어,학자들의 수다 사람을 읽다』, 김시천, 더퀘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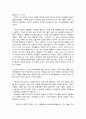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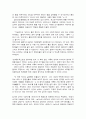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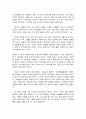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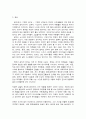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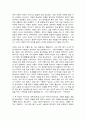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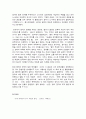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