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2) 글로벌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
3) 개인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서론
2.
본론
1)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2) 글로벌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
3) 개인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결론
본 레포트에서는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글로벌 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를 서술하였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기업은 점차 성장하였고, 경제활동이 지역사회나 국가에 국한되었던 초기 자본주의 기업들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무역을 통해 다른 지역이나 국가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 무역은 현대사회 이전부터 바다와 육지를 통해 이뤄졌지만 금융과 자본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렇게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기업과 개인의 갈등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 사례는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내에서 가습기 스프레이 액체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수 많은 사람들이 폐질환, 전신질환 등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질환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사회재난특별조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0년 7월 17일 기준 환경부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6,817명이고, 이 중 1,553명이 사망했다. 신원 미상의 사망자는 1만4000명으로 추산되며, 건강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67만명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알려졌으며, 임산부나 영아가 폐에 이상이 생겨 폐 이식을 받았다. 이렇듯 21세기 이후 국내 최악의 환경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던 사람들의 폐에 섬유증을 유발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망한 한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재해의 피해자는 대부분 산모와 유아였다. 소독제 사용자 수는 약 800만 명으로 추산돼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넓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이 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기업이 유해한 성분을 민간에 유통하려는 시도를 못하게 해야 할 것이며, 피해금액만 보상하는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예측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와 처벌 성격의 \'손해 부과\'를 금지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태선. (2010).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민사법학, 235-274.
2. 송강직. (2014).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동아법학, (64), 87-114.
3. 결론
본 레포트에서는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글로벌 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를 서술하였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기업은 점차 성장하였고, 경제활동이 지역사회나 국가에 국한되었던 초기 자본주의 기업들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무역을 통해 다른 지역이나 국가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 무역은 현대사회 이전부터 바다와 육지를 통해 이뤄졌지만 금융과 자본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렇게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기업과 개인의 갈등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 사례는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내에서 가습기 스프레이 액체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수 많은 사람들이 폐질환, 전신질환 등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질환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사회재난특별조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0년 7월 17일 기준 환경부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6,817명이고, 이 중 1,553명이 사망했다. 신원 미상의 사망자는 1만4000명으로 추산되며, 건강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67만명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알려졌으며, 임산부나 영아가 폐에 이상이 생겨 폐 이식을 받았다. 이렇듯 21세기 이후 국내 최악의 환경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던 사람들의 폐에 섬유증을 유발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망한 한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재해의 피해자는 대부분 산모와 유아였다. 소독제 사용자 수는 약 800만 명으로 추산돼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넓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이 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기업이 유해한 성분을 민간에 유통하려는 시도를 못하게 해야 할 것이며, 피해금액만 보상하는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예측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와 처벌 성격의 \'손해 부과\'를 금지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태선. (2010).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민사법학, 235-274.
2. 송강직. (2014).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동아법학, (64), 87-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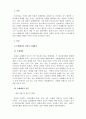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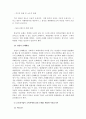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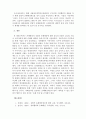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