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무예 신체 사상에 나타난 역사적 의의와 가치
(2) 중국 무술의 신체 사상에 나타난 역사적 의의와 가치
(3) 일본 무도의 신체 사상에 나타난 역사적 의의와 가치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Ⅱ. 본론
(1) 한국 무예 신체 사상에 나타난 역사적 의의와 가치
(2) 중국 무술의 신체 사상에 나타난 역사적 의의와 가치
(3) 일본 무도의 신체 사상에 나타난 역사적 의의와 가치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시켜서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태권도의 사례를 통해 무술, 무도 무예에 관한 견해를 피력해 보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태권도는 무예인가? 무술인가? 무도인가? 정답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무예일 수도, 무술일 수도, 무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을 통해 올바른 용어 정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래 태권도계는 태권도가 한국 고유의 독특한 기예로 법제화되었음에 도취돼 있다. 태권도는 더 이상 우리만의 점유물이 아니라 지구촌 전 국가에 보급되어 함께 공유 중이다. 태권 종주국으로서 한국은 소명 의식을 고취해서 과거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 일환으로 ‘태권도 명칭 바로 세우기’가 필요하다.
태권도 역사를 포함해 무예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격투술의 출발점은 각자 민족의 기원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 인간이 있는 장소에 생활이 있고 생활 속에서 육체 활동이 반드시 따라왔으며 이런 육체 활동은 점진적으로 격투술에서 체육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동양권에서는 무예, 무술, 무도의 용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서양에서는 Martial Arts라는 단어로 통용되었다. 더 나아가 체육 활동으로, 그리고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영어의 Martial Arts는 무예, 무술, 무도를 두루 하나로 퉁쳐서 표현하는데, 태권도인들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은 술이나 법이라고 해서 검술, 검법, 창술, 창법, 권술, 권법 등을 무술로 총칭하고, 일본에서는 무도라고 해서 유도, 검도, 합기도, 궁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 중국과 달리 한국에선 조선 중기 무예도보통지 등에 근거해 유추해 볼 때, 예전부터 무예란 명칭을 사용해왔다. 이와 같은 한국 무예사적 전통의 계승 취지에서 우리는 무도나 무술 대신에 무예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태권도가 무도라는 명칭과 겉모습에 안주하려는 사고방식이 계속되면 가라테의 아류 항목임과 동시에 종속 문화라는 오명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도 태권도의 이념적 논리는 일본 무도 공수도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태권도는 택견의 정신을 이어받은 점이 없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예 태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본다. 한국은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진 국가라는 점을 보면 무예 태권이나 태권 무예로 씀으로써 고유성과 자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 태권의 정체성을 확실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명칭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Ⅳ. 참고 문헌
- 무술, 무도, 무예의 용어 정립을 위한 과제 DBPia 김창룡, 양진방, 허건식 2001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제12집 제1호
- 한·중·일 무예·무술·무도 인식에 관한 연구 DBPia 진중의, 김종길, 임재구, 2011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지 제22권 제2호
- https://mookas.com/news/18040 기자 이름 : 강원식 기자, 기사명 : [강원식 칼럼] 무도 태권도에서 ‘무예 태권’으로 돼야! 신문사 : 무카스미디어 날짜 : 2021-06-24
Ⅲ. 결론
태권도의 사례를 통해 무술, 무도 무예에 관한 견해를 피력해 보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태권도는 무예인가? 무술인가? 무도인가? 정답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무예일 수도, 무술일 수도, 무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을 통해 올바른 용어 정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래 태권도계는 태권도가 한국 고유의 독특한 기예로 법제화되었음에 도취돼 있다. 태권도는 더 이상 우리만의 점유물이 아니라 지구촌 전 국가에 보급되어 함께 공유 중이다. 태권 종주국으로서 한국은 소명 의식을 고취해서 과거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 일환으로 ‘태권도 명칭 바로 세우기’가 필요하다.
태권도 역사를 포함해 무예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격투술의 출발점은 각자 민족의 기원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 인간이 있는 장소에 생활이 있고 생활 속에서 육체 활동이 반드시 따라왔으며 이런 육체 활동은 점진적으로 격투술에서 체육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동양권에서는 무예, 무술, 무도의 용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서양에서는 Martial Arts라는 단어로 통용되었다. 더 나아가 체육 활동으로, 그리고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영어의 Martial Arts는 무예, 무술, 무도를 두루 하나로 퉁쳐서 표현하는데, 태권도인들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은 술이나 법이라고 해서 검술, 검법, 창술, 창법, 권술, 권법 등을 무술로 총칭하고, 일본에서는 무도라고 해서 유도, 검도, 합기도, 궁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 중국과 달리 한국에선 조선 중기 무예도보통지 등에 근거해 유추해 볼 때, 예전부터 무예란 명칭을 사용해왔다. 이와 같은 한국 무예사적 전통의 계승 취지에서 우리는 무도나 무술 대신에 무예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태권도가 무도라는 명칭과 겉모습에 안주하려는 사고방식이 계속되면 가라테의 아류 항목임과 동시에 종속 문화라는 오명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도 태권도의 이념적 논리는 일본 무도 공수도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태권도는 택견의 정신을 이어받은 점이 없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예 태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본다. 한국은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진 국가라는 점을 보면 무예 태권이나 태권 무예로 씀으로써 고유성과 자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 태권의 정체성을 확실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명칭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Ⅳ. 참고 문헌
- 무술, 무도, 무예의 용어 정립을 위한 과제 DBPia 김창룡, 양진방, 허건식 2001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제12집 제1호
- 한·중·일 무예·무술·무도 인식에 관한 연구 DBPia 진중의, 김종길, 임재구, 2011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지 제22권 제2호
- https://mookas.com/news/18040 기자 이름 : 강원식 기자, 기사명 : [강원식 칼럼] 무도 태권도에서 ‘무예 태권’으로 돼야! 신문사 : 무카스미디어 날짜 : 2021-0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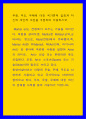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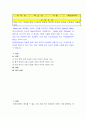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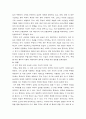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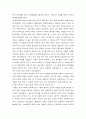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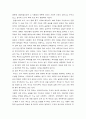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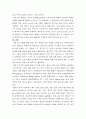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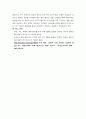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