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목차
Ⅰ. 당진·서선·태안 개관
Ⅱ. 서산마애삼존불
Ⅲ. 해미읍성
Ⅳ. 보원사터
Ⅴ. 태안마애삼존불
Ⅱ. 서산마애삼존불
Ⅲ. 해미읍성
Ⅳ. 보원사터
Ⅴ. 태안마애삼존불
본문내용
那, 전게서, 1993, pp.130
으로 본다면 미륵보살보다는 관음보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좌우불상의 명칭이다. 먼저 좌불상의 경우 왼손바닥 위에 그릇을 얹고 엄지로 누르고 있는 모양으로 藥器印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수영 선생과 강우방 선생은 그릇을 들고 있는 수인을 통해 그 불상을 藥師佛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문명대 선생은 『藥師琉璃光如來念誦儀軌』에서 약사불은 약기인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된 점을 들어 약사불상의 약기인 수인은 8세기 전반기에 비로소 출현한다고 보고 그릇 혹은 보주를 들고 있는 6세기 내기 7세기 전반기 불상을 약사불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중국의 북주 대상 2년명 석가불입상과 인도 사르나트 박물관 소장 팔상도 부조상 중 원후왕봉밀도를 예로 들어 석가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불상의 경우 시무외인의 수인을 짓고 있는데 이는 어느 불상이나 지을 수 있는 통인으로 수인을 통한 도상해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황수영 선생과 강우방 선생은 각각 석가불과 아미타불이라는 추정을 하였고, 문명대 선생은 두 불상이 병립한 점과 좌불상이 석가불로 보는 점 등을 통해 이불병좌상과 연관지어 우불상을 다보불로 추정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도상 중 두 불상이 나란히 나타나는 도상은 『妙法蓮華經』「見寶塔品」에 나타나는 이불병좌상의 석가불과 다보불 밖에는 없다. 그러한 점에서 태안 마애삼존불의 두 불상을 이불병좌상의 석가불과 다보불로 보고자 하는 문명대 선생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중앙보살은 기존의 학설과 같이 관음보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묘법연화경』「견보탑품」에 나타나는 이불병좌상의 도상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이불병좌라는 명칭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 존상이 모두 좌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도상을 그대로 본다면 태안의 입상과는 도상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불병좌상과의 연관성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또한 중국의 開皇 20年名 雙佛立像 등 쌍불입상의 예가 얼마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마저도 중앙에 보살이 없는 도상이며, 명문에는 명칭을 밝히고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문명대, 전게서, 2003, pp.289-308
그렇다면「견보탑품」의 이불병좌상만으로 태안 마애삼존불의 두 불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즉 모두 입상인 석가불로 추정하는 좌불상과 시무외인을 결하고 있는 우불상인 다보불을 도상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필자는 『묘법연화경』「觀世音菩薩普門品」의 내용이 석가불과 다보불 그리고 중앙보살로 추정하는 관세음보살을 한 도상에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세음보살보문품」의 다음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진의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공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목에 걸었던 백천 냥이나 되는 보배 구슬과 영락을 끌러 받들어 올리며 또 여쭈었다. “어지신이여, 법으로써 드리는 이 보배 구슬과 영락을 받아 주옵소서.”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를 받지 않거늘, 무진의는 다시 관세음보살께 여쭈었다. “어진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 주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이 무진의보살과 사대부중과 하늘·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듯한 것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곧 관세음보살이 사대부중과 하늘·용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어 그 영락을 받더니, 둘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불게 바치고, 남은 한 몫은 다보불탑에 바쳤다.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스러운 신통력을 가지고 사바세계에 노니느니라.”
위에서 보았다시피 이 내용은 무진의보살에게 寶珠와 瓔珞의 공양을 받은 관음보살이 이를 석가불과 다보불탑에 바쳤다는 내용이다. 물론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도상으로 옮김에 있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나 태안 마애삼존불의 도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태안 마애삼존불은 관음보살이 무진의보살에게 받은 보주와 영락을 둘로 나누어 석가불과 다보불탑에 받치는 모습을 도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다보불의 경우 여래의 형상이 아닌 탑의 형상으로 경전 내용에 나타나지만 이를 조성 당시 여래의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묘법연화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는「견보탑품」에서 다보불이 여래의 형상으로 나타남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또한 석가불과 다보불이 여래의 형상으로 함께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이 뒷받침 해주고 있기 때문다. 이처럼 태안 마애삼존불은 『묘법연화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석가불·다보불·관음보살을 독창적 배치함으로써 전후한 시기에 없는 새로운 도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授記品」의 사상을 도상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서산 마애삼존불 『묘법연화경』과 관련하여 서산 마애삼존불에 대한 도상해석은 文明大,「泰安 百濟磨崖三尊石佛의 新硏究」,『佛敎美術硏究』2, 동국대학교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1995에서 언급한 내용을 수용하였다.
과 함께 『묘법연화경』사상에 대한 당시 백제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백제 불상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태안 마애삼존불을 종래의 설과는 달리 좌 석가불, 우 다보불, 중앙 관음보살로 보고자하며, 당시 백제『묘법연화경』사상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써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보여 진다.
3. 맺음말
지금까지 태안 마애삼존불에 대해 종래의 설과는 다른 해석을 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연구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태안 마애삼존불의 형식과 양식적 특징 이를 바탕으로 불상의 편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6세기 말에 해당하는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독특한 구도로 조성된 삼존불의 명칭에 대해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과 「견보탑품」과 관련 있는 석가·다보불과 중앙의 관음보살의 삼존불이라는 사실을 제시해보았다. 다만 아직 도상과 비교사적 고증에 있어서의 부족함과 억측이 많음을 실감한다.
으로 본다면 미륵보살보다는 관음보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좌우불상의 명칭이다. 먼저 좌불상의 경우 왼손바닥 위에 그릇을 얹고 엄지로 누르고 있는 모양으로 藥器印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수영 선생과 강우방 선생은 그릇을 들고 있는 수인을 통해 그 불상을 藥師佛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문명대 선생은 『藥師琉璃光如來念誦儀軌』에서 약사불은 약기인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된 점을 들어 약사불상의 약기인 수인은 8세기 전반기에 비로소 출현한다고 보고 그릇 혹은 보주를 들고 있는 6세기 내기 7세기 전반기 불상을 약사불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중국의 북주 대상 2년명 석가불입상과 인도 사르나트 박물관 소장 팔상도 부조상 중 원후왕봉밀도를 예로 들어 석가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불상의 경우 시무외인의 수인을 짓고 있는데 이는 어느 불상이나 지을 수 있는 통인으로 수인을 통한 도상해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황수영 선생과 강우방 선생은 각각 석가불과 아미타불이라는 추정을 하였고, 문명대 선생은 두 불상이 병립한 점과 좌불상이 석가불로 보는 점 등을 통해 이불병좌상과 연관지어 우불상을 다보불로 추정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도상 중 두 불상이 나란히 나타나는 도상은 『妙法蓮華經』「見寶塔品」에 나타나는 이불병좌상의 석가불과 다보불 밖에는 없다. 그러한 점에서 태안 마애삼존불의 두 불상을 이불병좌상의 석가불과 다보불로 보고자 하는 문명대 선생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중앙보살은 기존의 학설과 같이 관음보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묘법연화경』「견보탑품」에 나타나는 이불병좌상의 도상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이불병좌라는 명칭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 존상이 모두 좌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도상을 그대로 본다면 태안의 입상과는 도상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불병좌상과의 연관성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또한 중국의 開皇 20年名 雙佛立像 등 쌍불입상의 예가 얼마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마저도 중앙에 보살이 없는 도상이며, 명문에는 명칭을 밝히고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문명대, 전게서, 2003, pp.289-308
그렇다면「견보탑품」의 이불병좌상만으로 태안 마애삼존불의 두 불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즉 모두 입상인 석가불로 추정하는 좌불상과 시무외인을 결하고 있는 우불상인 다보불을 도상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필자는 『묘법연화경』「觀世音菩薩普門品」의 내용이 석가불과 다보불 그리고 중앙보살로 추정하는 관세음보살을 한 도상에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세음보살보문품」의 다음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진의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공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목에 걸었던 백천 냥이나 되는 보배 구슬과 영락을 끌러 받들어 올리며 또 여쭈었다. “어지신이여, 법으로써 드리는 이 보배 구슬과 영락을 받아 주옵소서.”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를 받지 않거늘, 무진의는 다시 관세음보살께 여쭈었다. “어진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 주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이 무진의보살과 사대부중과 하늘·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듯한 것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곧 관세음보살이 사대부중과 하늘·용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어 그 영락을 받더니, 둘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불게 바치고, 남은 한 몫은 다보불탑에 바쳤다.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스러운 신통력을 가지고 사바세계에 노니느니라.”
위에서 보았다시피 이 내용은 무진의보살에게 寶珠와 瓔珞의 공양을 받은 관음보살이 이를 석가불과 다보불탑에 바쳤다는 내용이다. 물론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도상으로 옮김에 있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나 태안 마애삼존불의 도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태안 마애삼존불은 관음보살이 무진의보살에게 받은 보주와 영락을 둘로 나누어 석가불과 다보불탑에 받치는 모습을 도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다보불의 경우 여래의 형상이 아닌 탑의 형상으로 경전 내용에 나타나지만 이를 조성 당시 여래의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묘법연화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는「견보탑품」에서 다보불이 여래의 형상으로 나타남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또한 석가불과 다보불이 여래의 형상으로 함께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이 뒷받침 해주고 있기 때문다. 이처럼 태안 마애삼존불은 『묘법연화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석가불·다보불·관음보살을 독창적 배치함으로써 전후한 시기에 없는 새로운 도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授記品」의 사상을 도상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서산 마애삼존불 『묘법연화경』과 관련하여 서산 마애삼존불에 대한 도상해석은 文明大,「泰安 百濟磨崖三尊石佛의 新硏究」,『佛敎美術硏究』2, 동국대학교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1995에서 언급한 내용을 수용하였다.
과 함께 『묘법연화경』사상에 대한 당시 백제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백제 불상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태안 마애삼존불을 종래의 설과는 달리 좌 석가불, 우 다보불, 중앙 관음보살로 보고자하며, 당시 백제『묘법연화경』사상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써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보여 진다.
3. 맺음말
지금까지 태안 마애삼존불에 대해 종래의 설과는 다른 해석을 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연구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태안 마애삼존불의 형식과 양식적 특징 이를 바탕으로 불상의 편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6세기 말에 해당하는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독특한 구도로 조성된 삼존불의 명칭에 대해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과 「견보탑품」과 관련 있는 석가·다보불과 중앙의 관음보살의 삼존불이라는 사실을 제시해보았다. 다만 아직 도상과 비교사적 고증에 있어서의 부족함과 억측이 많음을 실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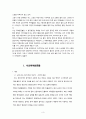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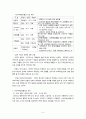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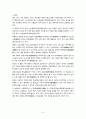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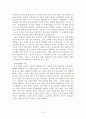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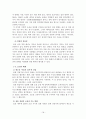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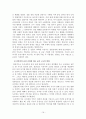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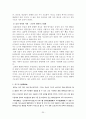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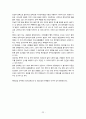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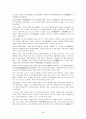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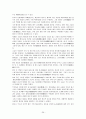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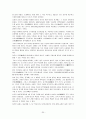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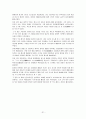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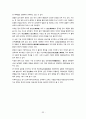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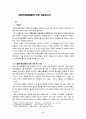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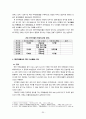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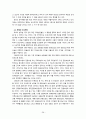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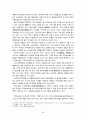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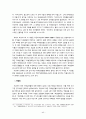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