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목차
Ⅰ. 국장생 석표
Ⅱ. 용화사 석조여래좌상
Ⅲ. 범어사(梵魚寺)
Ⅳ. 금정산성
Ⅴ. 복천동 고분군
Ⅵ. 만덕사지(萬德寺址)
Ⅱ. 용화사 석조여래좌상
Ⅲ. 범어사(梵魚寺)
Ⅳ. 금정산성
Ⅴ. 복천동 고분군
Ⅵ. 만덕사지(萬德寺址)
본문내용
서 발견된 지름 2.4m에 달하는 팔각지대석에서 상상할 수 있는 대형불상, 거대한 바윗돌로 쌓아올린 석축, 석축에서 남쪽으로 19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높이 3.5m의 당간지주(부산시지정유형문화재 14호)와 만덕사거리에 위치해 절의 경계를 표시했던 국장생표, 비록 절반만 나왔지만 동양 최대 규모라는 황룡사지 치미와 맞먹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치미, 금당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에는 암자 석축이 파손된 채 곳곳에 남아있고 기와조각은 발에 차일 정도로 흔했다는 절터 등 이처럼 여러 곳에서 만덕사지(萬德寺址)가 한때 잘 나가던 상당한 규모의 절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만덕사지는 지난 90년 10월과 96년 9월 두 차례에 걸친 발굴로 사찰 창건연대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인 사실이 확인됐다. 축조연대가 통일신라 말기로 추정되는 팔각지대석, 금당의 바닥에 깔았던 기와, 암막새, 수막새 등 유물이 출토됐다. 또 금당지의 석축도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기 때 지어진 것으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양식으로 밝혀졌다. 당간지주는 석주 2주 중 1주 만 남아있다. 높이 3.5m로 기단부는 파손되었으며 당간을 설치하던 간대(竿臺)는 석주 아래에 놓여 있다. 당간지주가 금당터에서 약 190m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만덕1동 일대 대부분이 만덕사 경내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5년 6월에는 산신지위(山神之位)라고 새겨진 돌이 발굴되었으며, 인근에 흐르는 덕천천 너머 산등성이에서는 거대한 암석을 타원형으로 파낸 돌절구가 조사되었다. 이 대형 돌절구를 부근 마을에서는 예로부터 ‘만덕사떡구시’라고 불러왔다고 한다.
* 만덕사지에 대한 논란
만덕사에 대해서는 고려의 개국공신 노강필(盧康弼)과 이엄(李嚴)이 927년(고려 태조 10)에 창건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따르면, 1352년(고려 공민왕 1)에 충혜왕의 서자 석기(釋器)가 이 절에 유폐된 것으로 나타난다.
향토사학자들은 이 한 줄의 기록과 연관시켜 이를 고려사의 미스터리와 관계 짓는다. 하지만 만덕사란 절은 부산 외에도 충남 서천, 경기 개성, 전남 강진, 전북 금산 등 여러 곳에 있는데도 문헌에선 어디 있는 절인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이 없다. 내력이나 위치를 밝히지 않고 그냥 만덕사라고 적혀있는 이 기록이 지금은 수십 년에 걸친 논란의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 만덕사 주지와 향토사학자 등 지역민들은 부산의 만덕사지가 바로 석기왕자와 관련된 절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음모에 만덕사가 희생됐다며 어마어마한 고려시대 골육상쟁의 비화를 그리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배원정책을 폈던 공민왕이 조카인 석기왕자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부원파(附元派)들의 음모를 눈치 채고 관련자 10여 명 중 일부는 참형에 처하고 만덕사에 유폐했던 석기를 불러올려 제주도로 보내는 길에 자객을 시켜 석기왕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추대음모사건에 연루됐던 찬성사 강윤충에게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동래현령으로 내려가서 석기왕자가 있던 만덕사의 흔적을 없애라는 밀명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어명을 받은 강윤충은 만덕사를 폐사시키고 피비린내 나는 왕족 간 골육상쟁의 비밀을 깡그리 역사에서 지웠으며 강윤충은 어느 날 갑자기 원인모를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대강의 이야기다.
만덕사지 안에 남아있는 지주석들이 조각나 깨져 발견된 것도 정치보복을 상징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덕사의 비밀을 푸는 것은 잃어버린 고려사의 일부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하지만 학계에서는 문헌이나 유물 어느 것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검증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우선 90년과 96년 부산시립박물관의 두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기비사(祇毗寺)라는 글자가 씌어진 기와가 출토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비록 기비사란 절 이름 역시 만덕사와 마찬가지로 어느 문헌에도 나오지 않지만 발굴결과로만 보면 아직 이 절터가 기비사이지 만덕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절터의 이름도 만덕동사지로 불러야 옳다는 주장이다(일부에서는 기비사 역시 글자를 뜯어보면 ‘가사 입은 왕자 비구의 절’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며 석기왕자와 관련짓고 있다).
2. 만덕사지의 유물
2-1. 만덕사지 당간지주(부산시 지방유형문화재 제14호)
만덕터널의 동쪽 진입로 아래에 위치하며 2개의 석주 중 1기만 남아 있다. 기단부는 파손되었으며 간대로 보이는 석재가 석주의 안쪽 하단에 놓여 있다. 석주의 규모는 가로 40cm, 세로 60cm에 높이 350cm이다. 범어사 당간지주에 비하여 치석(治石)이 훨씬 잘된 편이며 장치수법도 뛰어난 작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주의 외측면(外側面) 중앙에는 상하로 융기된 선대를 나타내어 조각하였으며 기둥의 꼭대기 부분은 외각을 깎아 호선(弧線)을 그리면서 2단의 굴곡을 두어 공간의 미를 나타내었다. 돌기둥 상단내면에는 장방형의 간구(杆溝)를 두었으며 간공(杆孔)은 없다.
2-2. 만덕사 삼층석탑(三層石塔)
1979년 2월 만덕사지 주변에 흩어져 있는 석조 유물을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수습하여, 그 중에서 삼층석탑 1기를 완전 복원하여 박물관 정원에 재건하였다. 이 석탑은 하층 기단을 생략한 단층 기단의 신라 일반형 3층 석탑인데 기단지대석 1개, 기단면석 2개, 2층 옥신석, 3층 옥신석 및 옥개석, 노반을 보충하여 높이 3.35m로 복원 건립하였다.
지대석은 너비 78.5Cm, 길이 156Cm,두께 31Cm의 장방형 석재 두 장을 깔고 그 윗면에 1단의 괴임을 깎아 기단면석을 받게 하였다. 기단은 좌우에 우주를 새긴 두 장의 판석을 세우고 그 사이에 두 장의 평판석을 끼운 간략한 짜임새로 꾸몄으며, 부연과 2단의 탑신괴임을 아래 위에 깎아낸 2장의 갑석으로 덮었다. 탑신은 각층의 옥신과 옥개를, 별석으로 조성하였는데, 옥신석에는 우주를 옥개석에는 옥개받침 3단과 1단의 탑신괴임을 깎아냈다. 상륜부는 완전히 없어진 것을 노반만 복원하였다. 이 탑은 기단부가 단층으로 간소화되었으나 탑신의 각층이 적당한 비례로 줄어져서 균형이 아름답고 안정감도 충분한 아담한 석탑이라 할 수 있다.
만덕사지는 지난 90년 10월과 96년 9월 두 차례에 걸친 발굴로 사찰 창건연대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인 사실이 확인됐다. 축조연대가 통일신라 말기로 추정되는 팔각지대석, 금당의 바닥에 깔았던 기와, 암막새, 수막새 등 유물이 출토됐다. 또 금당지의 석축도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기 때 지어진 것으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양식으로 밝혀졌다. 당간지주는 석주 2주 중 1주 만 남아있다. 높이 3.5m로 기단부는 파손되었으며 당간을 설치하던 간대(竿臺)는 석주 아래에 놓여 있다. 당간지주가 금당터에서 약 190m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만덕1동 일대 대부분이 만덕사 경내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5년 6월에는 산신지위(山神之位)라고 새겨진 돌이 발굴되었으며, 인근에 흐르는 덕천천 너머 산등성이에서는 거대한 암석을 타원형으로 파낸 돌절구가 조사되었다. 이 대형 돌절구를 부근 마을에서는 예로부터 ‘만덕사떡구시’라고 불러왔다고 한다.
* 만덕사지에 대한 논란
만덕사에 대해서는 고려의 개국공신 노강필(盧康弼)과 이엄(李嚴)이 927년(고려 태조 10)에 창건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따르면, 1352년(고려 공민왕 1)에 충혜왕의 서자 석기(釋器)가 이 절에 유폐된 것으로 나타난다.
향토사학자들은 이 한 줄의 기록과 연관시켜 이를 고려사의 미스터리와 관계 짓는다. 하지만 만덕사란 절은 부산 외에도 충남 서천, 경기 개성, 전남 강진, 전북 금산 등 여러 곳에 있는데도 문헌에선 어디 있는 절인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이 없다. 내력이나 위치를 밝히지 않고 그냥 만덕사라고 적혀있는 이 기록이 지금은 수십 년에 걸친 논란의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 만덕사 주지와 향토사학자 등 지역민들은 부산의 만덕사지가 바로 석기왕자와 관련된 절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음모에 만덕사가 희생됐다며 어마어마한 고려시대 골육상쟁의 비화를 그리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배원정책을 폈던 공민왕이 조카인 석기왕자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부원파(附元派)들의 음모를 눈치 채고 관련자 10여 명 중 일부는 참형에 처하고 만덕사에 유폐했던 석기를 불러올려 제주도로 보내는 길에 자객을 시켜 석기왕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추대음모사건에 연루됐던 찬성사 강윤충에게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동래현령으로 내려가서 석기왕자가 있던 만덕사의 흔적을 없애라는 밀명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어명을 받은 강윤충은 만덕사를 폐사시키고 피비린내 나는 왕족 간 골육상쟁의 비밀을 깡그리 역사에서 지웠으며 강윤충은 어느 날 갑자기 원인모를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대강의 이야기다.
만덕사지 안에 남아있는 지주석들이 조각나 깨져 발견된 것도 정치보복을 상징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덕사의 비밀을 푸는 것은 잃어버린 고려사의 일부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하지만 학계에서는 문헌이나 유물 어느 것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검증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우선 90년과 96년 부산시립박물관의 두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기비사(祇毗寺)라는 글자가 씌어진 기와가 출토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비록 기비사란 절 이름 역시 만덕사와 마찬가지로 어느 문헌에도 나오지 않지만 발굴결과로만 보면 아직 이 절터가 기비사이지 만덕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절터의 이름도 만덕동사지로 불러야 옳다는 주장이다(일부에서는 기비사 역시 글자를 뜯어보면 ‘가사 입은 왕자 비구의 절’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며 석기왕자와 관련짓고 있다).
2. 만덕사지의 유물
2-1. 만덕사지 당간지주(부산시 지방유형문화재 제14호)
만덕터널의 동쪽 진입로 아래에 위치하며 2개의 석주 중 1기만 남아 있다. 기단부는 파손되었으며 간대로 보이는 석재가 석주의 안쪽 하단에 놓여 있다. 석주의 규모는 가로 40cm, 세로 60cm에 높이 350cm이다. 범어사 당간지주에 비하여 치석(治石)이 훨씬 잘된 편이며 장치수법도 뛰어난 작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주의 외측면(外側面) 중앙에는 상하로 융기된 선대를 나타내어 조각하였으며 기둥의 꼭대기 부분은 외각을 깎아 호선(弧線)을 그리면서 2단의 굴곡을 두어 공간의 미를 나타내었다. 돌기둥 상단내면에는 장방형의 간구(杆溝)를 두었으며 간공(杆孔)은 없다.
2-2. 만덕사 삼층석탑(三層石塔)
1979년 2월 만덕사지 주변에 흩어져 있는 석조 유물을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수습하여, 그 중에서 삼층석탑 1기를 완전 복원하여 박물관 정원에 재건하였다. 이 석탑은 하층 기단을 생략한 단층 기단의 신라 일반형 3층 석탑인데 기단지대석 1개, 기단면석 2개, 2층 옥신석, 3층 옥신석 및 옥개석, 노반을 보충하여 높이 3.35m로 복원 건립하였다.
지대석은 너비 78.5Cm, 길이 156Cm,두께 31Cm의 장방형 석재 두 장을 깔고 그 윗면에 1단의 괴임을 깎아 기단면석을 받게 하였다. 기단은 좌우에 우주를 새긴 두 장의 판석을 세우고 그 사이에 두 장의 평판석을 끼운 간략한 짜임새로 꾸몄으며, 부연과 2단의 탑신괴임을 아래 위에 깎아낸 2장의 갑석으로 덮었다. 탑신은 각층의 옥신과 옥개를, 별석으로 조성하였는데, 옥신석에는 우주를 옥개석에는 옥개받침 3단과 1단의 탑신괴임을 깎아냈다. 상륜부는 완전히 없어진 것을 노반만 복원하였다. 이 탑은 기단부가 단층으로 간소화되었으나 탑신의 각층이 적당한 비례로 줄어져서 균형이 아름답고 안정감도 충분한 아담한 석탑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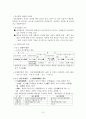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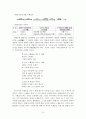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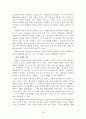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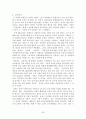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