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목차
Ⅰ. 대마도 지리와 역사, 조선의 대마도 정벌
1. 대마도의 지리와 산업
2. 대마도의 역사
3. 조선의 대마도 정벌
4. 조선통신사와 대마도
Ⅱ. 대마도 답사일정
1. 답사일정
2. 대마도 역사 · 관광지도
Ⅲ. ,
1. 이즈하라 시
2. 수선사(슈젠지)와 최익현 순국비
* 슈센지의 납골당을 통해 본 일본의 장례문화
3. 대마역사박물관 : 조선통신사 관련 답사
4. 덕혜옹주비
임나일본부에 관하여
5. 하찌만궁[八幡宮]
6. 니카라이 기념관
Ⅳ. 아소만 지역 관광 및 유적
1. 와타즈미 신사
2. 에보시다케 전망대와 만제키바시
Ⅴ. 상대마도(上對馬島) 지역 유적
1. 박제상 순국비
2. 왕인박사 현창비
1. 대마도의 지리와 산업
2. 대마도의 역사
3. 조선의 대마도 정벌
4. 조선통신사와 대마도
Ⅱ. 대마도 답사일정
1. 답사일정
2. 대마도 역사 · 관광지도
Ⅲ. ,
1. 이즈하라 시
2. 수선사(슈젠지)와 최익현 순국비
* 슈센지의 납골당을 통해 본 일본의 장례문화
3. 대마역사박물관 : 조선통신사 관련 답사
4. 덕혜옹주비
임나일본부에 관하여
5. 하찌만궁[八幡宮]
6. 니카라이 기념관
Ⅳ. 아소만 지역 관광 및 유적
1. 와타즈미 신사
2. 에보시다케 전망대와 만제키바시
Ⅴ. 상대마도(上對馬島) 지역 유적
1. 박제상 순국비
2. 왕인박사 현창비
본문내용
고 신라의 사자 3명을 나무우리 에 넣고 불태워 죽임
355~356
내물왕 즉위(치세 46년)
내물왕 즉위
-
우선 인질로 보낸 시기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5세기 전후이나 『일본서기』의 기록은 200년이 빠른 A.D.201년인 것으로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본 학자들도 우리의 기록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서기』의 연대는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기록
박제상의 왕제 귀환에 관해 두 사서의 내용이 틀린 것은 두 부분이다. 첫 번째는 인질을 보낸 시기이다. 『삼국유사』는 내물왕 때 미해를 일본으로, 눌지왕 때 보해를 고구려로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삼국사기』는 두 명 모두 실성왕 때라고 기록하였다. 그 당시 신라의 국내외 사정으로 볼 때 실성왕 때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일연은 『삼국사기』의 기록을 검토한 후 작성된 『삼국유사』에서 다르게 쓰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적 견제나 보복을 목적으로 볼모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왕의 아들과 동생의 희생을 강조하기 위해 윤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고구려로 인질로 간 보해의 귀환방법이다. 『삼국유사』에서는 박제상이 변복하여 고구려에 들어가 야음을 틈타 함께 도주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는 박제상이 고구려의 장수왕을 설득하여 외교적 절차를 통해서 귀환했다고 기록하였다. 이는 일연이 신라의 힘이 미약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2> 박제상의 왕제 귀환에 관한 사서(史書)기록 비교
연도(서력)
『삼 국 유 사』
『삼 국 사 기』
『일본서기』
390
내물왕 즉위 36년에 미해(미토희) 왜로 보냄
-
-
392
-
고구려가 강성하여 내물왕 37년 실성을 고구려에 인질로 보냄
-
401
-
내물왕 즉위 46년 실성 귀환
-
402
실성왕 즉위
실성왕 즉위(치세 16년)
왜국과 강화조건으로 미사흔 인질
-
412
-
실성왕 11년에 미사흔의 형 복호를
고구려에 인질로 보냄
-
416~417
눌지왕 즉위
눌지왕 즉위
418
-
박제상(별칭 : 毛末)의 신분
- 혁거세의 후손인 파사이사금의 5대손
- 관직 : 삽랑주간(良州干)
박제상의 눌지왕 동생들 귀환 추진
- 복호 귀환 : 고구려 장수왕 설득
- 미사흔 귀환 : 계략으로 귀환 추진
신라왕이 제상과 미사흔의 가족을 가두 었다하여 박제상이 왜로 망명
왜왕은 제상과 미사흔을 장수 및 향도 로 신라 침략→해중 산도로 진출
제상이 미사흔 도주시킴
왜왕이 제상을 목도 유배 후 죽임.
눌지왕의 후속 조치 : 박제상 대아찬 추 증, 그의 딸을 미사흔의 처로 삼음.
-
419
장수왕 요청으로 보해와 김무알을 고구려로 보냄
-
-
425
박제상의 신분 : 삽라 군 태수
박제상의 눌지왕 동생 귀환 추진
- 보해 귀환 : 제상과 함께 야반 도주
- 미해 귀환 : 계략으로 귀환, 제상 일본 잔류
박제상 처형
- 잔혹한 방법으로 회유
- 거부로 목도에서 화형
눌지왕의 후속 조치
- 제상의 처→국대부인
- 제상의 딸→미해공의 처
제상의 처→치술령에 서 통곡한 후 죽어 치술신모가 됨
-
-
1-2. 박제상 순국비
박제상 순국비는 한국전망대에서 약 30분 거리의 작은 포구에 홀로 서 있다. 이 비가 여기 서있는 이유는 박제상이 죽었던 장소인 목도가 대마도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일본서기에 대마도의 사우미 미나토라고 상세히 그 장소를 밝히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순국비가 서있는 곳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비는 대마도의 향토사학자인 히사에씨와 황수영교수의 노력으로 1988년에 세운 것이다.
2. 왕인박사 현창비
2-1. 왕인박사에 관한 사서기록
왕인에 대한 기술은 일본의 역사서인 고사기, 일본서기, 속일본기(續日本紀)에 나타난다. 각각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1) 고사기
고사기에 따르면 왕인은 백제에서 건너온 현자로 여겨진다.
「백제의 조고왕(照古王)이 아지길사(阿知吉師)를 시켜 말 암 · 수 1필씩을 바쳤으며, 현명한 사람이 있으면 보내라 하니 화이길사(和邇吉師)를 보내 《논어(論語)》 10권과 《천자문(千字文)》 1권 등 모두 11권을 바쳤다. 화이길사는 후미노오비토[文首] 등의 조상이다.」
2) 일본서기
「오진[應神]천황 15년 가을 8월에 백제왕이 아직기(阿直岐)를 보내 좋은 말 2필을 바치니 아직기에게 말을 돌보게 하였는데, 아직기가 경전을 잘 읽었으므로 태자인 우지노와키이라츠코[兎道稚郎子]의 스승으로 삼았다. 이에 천황이 아직기에게 \'그대보다 나은 박사가 또 있는가\'하고 물으니, 아직기가 \'왕인이라는 사람이 뛰어납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래서 백제에 사신을 보내 왕인을 불렀으며, 오진천황 16년 봄 2월에 왕인이 오자 태자의 스승으로 삼고 여러 경전과 서적을 배웠는데 막힘이 없었다. 왕인은 후미노오비토[書首] 등의 시조이다.」
왕인은 백제의 학자 아직기(阿直岐, 아치키)의 추천을 받아 오진 덴노의 초대를 받아 일본에 건너와 훗날 야마토에 귀화한 학자이다. 왕인이 논어와 천자문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와 일본에 유교와 한자가 전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일본의 학자 중에는 천자문의 성립 연대가 왕인의 일본 방문보다 후대임을 들어 왕인의 실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또는 일본서기를 편찬했을 때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귀화했던 여려 명의 도래인 학자를 상징적으로 정리한 인물이라는 설도 있다.
3) 속일본기
속일본기에는 왕인의 자손인 좌대사 · 정륙위상의 후미노이미키(文忌寸), 모오토(最弟) 등이 그들의 선조 왕인이 한족으로 항우(項羽)의 후예라고 간무 천황(桓武天皇)에게 언급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술에 따르면 왕인은 낙랑군 멸망 후 백제에 망명한 낙랑 왕씨의 일원이며 한족(漢族)으로서, 한고제의 후예가 된다.
2-2. 왕인박사 현창비
왕인박사의 현창비가 있는 곳의 마을 이름이 와니우라인데, 와니는 왕인을 와니라 부르고 우라는 우리말로 항구를 나타내는 말이다. 즉, 왕인박사가 다녀갔던 항구란 뜻이 되리라.
이곳은 묘가 아니고, 현창비로서 왕인박사가 문화적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2007년 5월에 건립하였다.
355~356
내물왕 즉위(치세 46년)
내물왕 즉위
-
우선 인질로 보낸 시기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5세기 전후이나 『일본서기』의 기록은 200년이 빠른 A.D.201년인 것으로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본 학자들도 우리의 기록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서기』의 연대는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기록
박제상의 왕제 귀환에 관해 두 사서의 내용이 틀린 것은 두 부분이다. 첫 번째는 인질을 보낸 시기이다. 『삼국유사』는 내물왕 때 미해를 일본으로, 눌지왕 때 보해를 고구려로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삼국사기』는 두 명 모두 실성왕 때라고 기록하였다. 그 당시 신라의 국내외 사정으로 볼 때 실성왕 때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일연은 『삼국사기』의 기록을 검토한 후 작성된 『삼국유사』에서 다르게 쓰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적 견제나 보복을 목적으로 볼모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왕의 아들과 동생의 희생을 강조하기 위해 윤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고구려로 인질로 간 보해의 귀환방법이다. 『삼국유사』에서는 박제상이 변복하여 고구려에 들어가 야음을 틈타 함께 도주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는 박제상이 고구려의 장수왕을 설득하여 외교적 절차를 통해서 귀환했다고 기록하였다. 이는 일연이 신라의 힘이 미약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2> 박제상의 왕제 귀환에 관한 사서(史書)기록 비교
연도(서력)
『삼 국 유 사』
『삼 국 사 기』
『일본서기』
390
내물왕 즉위 36년에 미해(미토희) 왜로 보냄
-
-
392
-
고구려가 강성하여 내물왕 37년 실성을 고구려에 인질로 보냄
-
401
-
내물왕 즉위 46년 실성 귀환
-
402
실성왕 즉위
실성왕 즉위(치세 16년)
왜국과 강화조건으로 미사흔 인질
-
412
-
실성왕 11년에 미사흔의 형 복호를
고구려에 인질로 보냄
-
416~417
눌지왕 즉위
눌지왕 즉위
418
-
박제상(별칭 : 毛末)의 신분
- 혁거세의 후손인 파사이사금의 5대손
- 관직 : 삽랑주간(良州干)
박제상의 눌지왕 동생들 귀환 추진
- 복호 귀환 : 고구려 장수왕 설득
- 미사흔 귀환 : 계략으로 귀환 추진
신라왕이 제상과 미사흔의 가족을 가두 었다하여 박제상이 왜로 망명
왜왕은 제상과 미사흔을 장수 및 향도 로 신라 침략→해중 산도로 진출
제상이 미사흔 도주시킴
왜왕이 제상을 목도 유배 후 죽임.
눌지왕의 후속 조치 : 박제상 대아찬 추 증, 그의 딸을 미사흔의 처로 삼음.
-
419
장수왕 요청으로 보해와 김무알을 고구려로 보냄
-
-
425
박제상의 신분 : 삽라 군 태수
박제상의 눌지왕 동생 귀환 추진
- 보해 귀환 : 제상과 함께 야반 도주
- 미해 귀환 : 계략으로 귀환, 제상 일본 잔류
박제상 처형
- 잔혹한 방법으로 회유
- 거부로 목도에서 화형
눌지왕의 후속 조치
- 제상의 처→국대부인
- 제상의 딸→미해공의 처
제상의 처→치술령에 서 통곡한 후 죽어 치술신모가 됨
-
-
1-2. 박제상 순국비
박제상 순국비는 한국전망대에서 약 30분 거리의 작은 포구에 홀로 서 있다. 이 비가 여기 서있는 이유는 박제상이 죽었던 장소인 목도가 대마도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일본서기에 대마도의 사우미 미나토라고 상세히 그 장소를 밝히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순국비가 서있는 곳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비는 대마도의 향토사학자인 히사에씨와 황수영교수의 노력으로 1988년에 세운 것이다.
2. 왕인박사 현창비
2-1. 왕인박사에 관한 사서기록
왕인에 대한 기술은 일본의 역사서인 고사기, 일본서기, 속일본기(續日本紀)에 나타난다. 각각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1) 고사기
고사기에 따르면 왕인은 백제에서 건너온 현자로 여겨진다.
「백제의 조고왕(照古王)이 아지길사(阿知吉師)를 시켜 말 암 · 수 1필씩을 바쳤으며, 현명한 사람이 있으면 보내라 하니 화이길사(和邇吉師)를 보내 《논어(論語)》 10권과 《천자문(千字文)》 1권 등 모두 11권을 바쳤다. 화이길사는 후미노오비토[文首] 등의 조상이다.」
2) 일본서기
「오진[應神]천황 15년 가을 8월에 백제왕이 아직기(阿直岐)를 보내 좋은 말 2필을 바치니 아직기에게 말을 돌보게 하였는데, 아직기가 경전을 잘 읽었으므로 태자인 우지노와키이라츠코[兎道稚郎子]의 스승으로 삼았다. 이에 천황이 아직기에게 \'그대보다 나은 박사가 또 있는가\'하고 물으니, 아직기가 \'왕인이라는 사람이 뛰어납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래서 백제에 사신을 보내 왕인을 불렀으며, 오진천황 16년 봄 2월에 왕인이 오자 태자의 스승으로 삼고 여러 경전과 서적을 배웠는데 막힘이 없었다. 왕인은 후미노오비토[書首] 등의 시조이다.」
왕인은 백제의 학자 아직기(阿直岐, 아치키)의 추천을 받아 오진 덴노의 초대를 받아 일본에 건너와 훗날 야마토에 귀화한 학자이다. 왕인이 논어와 천자문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와 일본에 유교와 한자가 전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일본의 학자 중에는 천자문의 성립 연대가 왕인의 일본 방문보다 후대임을 들어 왕인의 실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또는 일본서기를 편찬했을 때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귀화했던 여려 명의 도래인 학자를 상징적으로 정리한 인물이라는 설도 있다.
3) 속일본기
속일본기에는 왕인의 자손인 좌대사 · 정륙위상의 후미노이미키(文忌寸), 모오토(最弟) 등이 그들의 선조 왕인이 한족으로 항우(項羽)의 후예라고 간무 천황(桓武天皇)에게 언급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술에 따르면 왕인은 낙랑군 멸망 후 백제에 망명한 낙랑 왕씨의 일원이며 한족(漢族)으로서, 한고제의 후예가 된다.
2-2. 왕인박사 현창비
왕인박사의 현창비가 있는 곳의 마을 이름이 와니우라인데, 와니는 왕인을 와니라 부르고 우라는 우리말로 항구를 나타내는 말이다. 즉, 왕인박사가 다녀갔던 항구란 뜻이 되리라.
이곳은 묘가 아니고, 현창비로서 왕인박사가 문화적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2007년 5월에 건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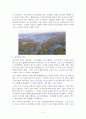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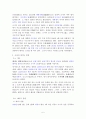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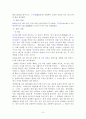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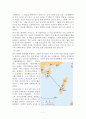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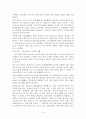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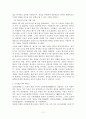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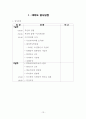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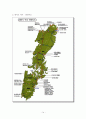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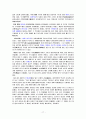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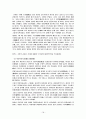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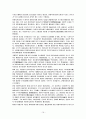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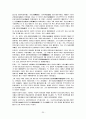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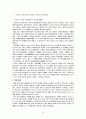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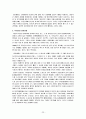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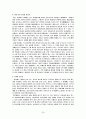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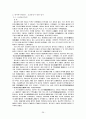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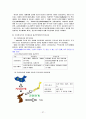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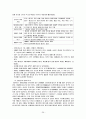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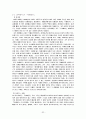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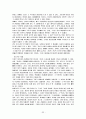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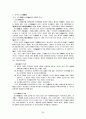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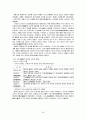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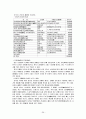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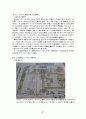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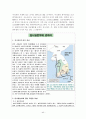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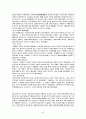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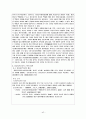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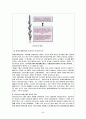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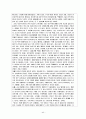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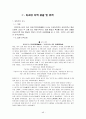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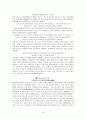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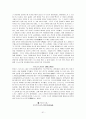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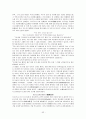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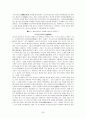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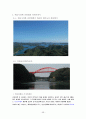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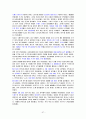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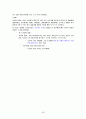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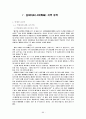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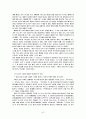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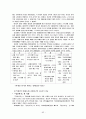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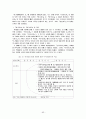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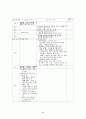







소개글